[DBR 인사이트]빈집,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
정희선 유자베이스 애널리스트 , 정리=김윤진 기자
입력 2024-06-13 23:00 수정 2024-06-14 16:41

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낡고 오래된 집을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집을 해체하는 데도 최소 200만 엔(약 1800만 원)이 들어 방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나 지자체만이 아니라 부동산 회사와 벤처기업들도 빈집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빈집 관련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빈집 주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빈집매매 중개 서비스’가 있다. 이런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본 스타트업 ‘아키야 가쓰요 주식회사’는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료로 정보를 판매하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자체에 등록된 빈집 외에도 미등록되고 공식 경로로 유통되지 않는 빈집을 직접 조사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회사 소속 조사관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대도시권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거나 우편함, 전기 계량기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유추하면서 빈집을 등록하며 최고경영자까지 회사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면서 빈집의 매입자나 임차인을 모집한다. 아키야 가쓰요는 매물 정보는 물론이고 빈집이 위치한 마을의 정보,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팁, 빈집 임대 및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정보들을 부동산 업체에 유료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빈집 매매 중개 플랫폼으로는 ‘모두의 0엔 물건’이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의 빈집들이 모두 무료, 즉 0엔에 판매된다. 누구든지 빈집을 등록할 수 있으며 만약 구매자가 직접 주인과 교섭하고 등기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스스로 진행한다면 플랫폼에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회사로부터 빈집 매매 관련 프로세스를 지원받고 싶다면 유료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체 빈집 구매자의 70%가 이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을 통해 구매에 성공한 이들은 양도 받은 빈집을 음식점, 셰어하우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개조해 사용한다.
이처럼 과거 일본에서는 빈집이 유지 비용만 잡아먹고 보유할수록 손해가 나는 부동산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빈집의 새로운 용도에 눈을 뜨고 있다. 부동산 기업 차원에서 빈집을 구매해 개조, 운영하기도 한다. 일본의 ‘젝트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빈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일정 기간 빌린 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게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회사가 개조 비용은 전액 부담하며 개조 후 가치를 높여 더 비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한 예로 젝트원은 도쿄 도심의 이타바시구에 위치한 80년 된 신발가게 겸 주거지를 공유 주방인 ‘가메야 키친’으로 개조했다. 도쿄 오타구의 인적 드문 곳에 있던 빈집은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로 바꿨다. 이 밖에도 아무 편의 시설도 없고 접근이 힘든 지방의 단점을 자연 친화적이라는 장점으로 살려 빈집을 별장으로 바꾼 부동산 회사가 있을 정도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빈집의 변신을 꾀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빈집 한 채만 개조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개발하겠다며 빈집에 관심을 보이는 스타트업도 있다. 철도 회사인 JR동일본이 출자한 스타트업 ‘연선 마루고토’는 지방의 무인 역과 빈집을 개조한 뒤 숙박시설로 만들어 마을 전체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스타트업은 JR동일본이 보유한 역사를 로비로 만들고 마을의 빈집을 객실로 개조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텔을 운영한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보는 셈이다. 이런 시도는 지역 주민과 협력해 마을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도 띤다.
이렇듯 빈집 문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사례는 저출산, 고령화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한국에서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국내 기업들도 더 늦기 전에 빈집이 양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393호(5월 2호) ‘특별법이 끌고, 빈집 은행 플랫폼이 밀고’ 원고를요약한 것입니다.
정희선 유자베이스 애널리스트 hsjung3000@gmail.com
정리=김윤진 기자 truth311@donga.com
비즈N 탑기사
 “헌혈은 나와의 약속”…빈혈에도 피 나누는 사람들
“헌혈은 나와의 약속”…빈혈에도 피 나누는 사람들 배달 치킨 먹으려다가 깜짝…“똥파리가 같이 튀겨졌어요”
배달 치킨 먹으려다가 깜짝…“똥파리가 같이 튀겨졌어요” ‘말벌 개체 증가’ 쏘임 사고 잇따라…올해 광주·전남 13건
‘말벌 개체 증가’ 쏘임 사고 잇따라…올해 광주·전남 13건 “칭챙총”…박명수, 인도여행 중 인종차별 당했다
“칭챙총”…박명수, 인도여행 중 인종차별 당했다 ‘콧수염 기른 69세 김구’ 사진 첫 공개
‘콧수염 기른 69세 김구’ 사진 첫 공개-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춤추며 북한 놀린 방글라 유튜버
- 폐차장서 번호판 ‘슬쩍’…중고 외제차에 붙여 판매한 불법체류자들
- 유치원 앞 “담배 연기 싫어요” 바닥엔 꽁초 가득…타버린 ‘동심’
- 강남 한복판에 “벗고 노는 셔츠룸” “여대생 250명 출근”
- 국민 10명 중 9명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직면”
 청약통장 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쪼그라든 주택기금 확충”
청약통장 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쪼그라든 주택기금 확충” 돼지고기 가격 하락세인데…고깃집 삼겹살 2만원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세인데…고깃집 삼겹살 2만원 이유는 서울 아파트매매 3년만에 최다… 마포-동작-성동 껑충
서울 아파트매매 3년만에 최다… 마포-동작-성동 껑충 “금리인하 늦어진대”…정기예적금에 10조원 몰렸다
“금리인하 늦어진대”…정기예적금에 10조원 몰렸다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美 빅테크 CEO들 만난 이재용 “삼성답게 미래 개척”
- 강남·명동 광역버스 29일부터 일부 조정…“도심 출·퇴근 혼잡 개선”
- 中 스마트폰 업체 아너, 폴더블폰 출시…삼성에 도전장
- 삼성전자 “통합 AI 솔루션으로 질적 1위 목표”
- [DBR 인사이트]빈집,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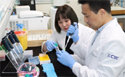



![[단독]정부도 깜짝 놀란 AI發 반도체 호황… 올해 수출 목표 1300억달러로 높여[세종팀의 정책워치] [단독]정부도 깜짝 놀란 AI發 반도체 호황… 올해 수출 목표 1300억달러로 높여[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5475736.10.thumb.jpg)


![[머니 컨설팅] 상속-증여세, 부자 아니면 몰라도 된다? [머니 컨설팅] 상속-증여세, 부자 아니면 몰라도 된다?](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5478890.3.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