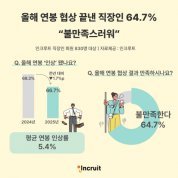‘부동산 싱크홀’에 빠진 ‘박 과장’ 구하기 [오늘과 내일/박용]
박용 경제부장
입력 2021-08-18 03:00 수정 2021-08-18 11:23
내 집 마련을 재난처럼 만든 부동산 실정
‘집값 추락’ 협박 말고 연착륙 대책 내놔야
 박용 경제부장
박용 경제부장
때론 영화가 현실의 아픈 지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주 개봉해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은 재난코미디 영화 ‘싱크홀’(지반 환경에 변화가 생겨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은 어렵게 장만한 집이 500m 깊은 땅속으로 꺼진다는 ‘웃픈’ 상상력으로 눈길을 끈다. 영화는 고생 끝에 서울 마포에 신축 빌라를 장만한 ‘박 과장’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무주택자 캐릭터는 너무 흔하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3%이니 거리에서 만난 가장 둘 중 하나는 무주택자다.
박 과장이 11년 만에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는 설정도 현실과 부합한다. 치솟는 집값으로 수도권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수는 2016년 6.7배에서 지난해 8.0배로 높아졌다. 박 과장이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한다는 얘긴데, 월 소득의 18.6%가 매월 임차료로 들어가는 수도권의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겐 ‘재난’ 같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과장의 선택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다. 집을 얻는 대신 빚쟁이가 되는 또 다른 ‘재난’을 선택한 것이다. 현실도 그렇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 원으로 한 달 만에 9조7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73%를 차지한다.
상품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하지만 과시적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명품이나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더 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요가 따라붙는다. 실제로 집값이 치솟는데도,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2019년 84.1%에서 지난해 87.7%로 높아졌다. 공급 제한과 집값 상승 신호가 깜빡거리면 언제라도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된 ‘부동산시장의 예비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생산량이 제한된 한정판을 만들거나 가격 인상설을 흘리고 무례하게 고객을 줄 세우는 상술을 부리는 건 이런 시장에서 공급을 통제하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집값이 하염없이 오른 뒤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공급의 어려움을 뒤늦게 실토한 정부에 집값 급등의 근본 책임이 있다. 정부가 만든 부동산 싱크홀에 빠져 음악이 흘러나오면 시장의 힘에 떠밀려 무대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에게 정부 당국자가 집값 고점 운운하며 겁을 주는 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해법 역시 시장에 있다. 시장의 힘을 역이용해 시장이 원하는 곳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린다는 일관된 신호를 줘야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누그러질 것이다.
집 때문에 생긴 박 과장의 재난은 이제 시작이다. 영화에선 그 귀한 집이 집들이 날 장대비 속에서 생긴 싱크홀 때문에 땅속으로 추락한다. 집값 급락이야말로 영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동산시장의 싱크홀이다. 3월 말 현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34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2%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곧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대출 부실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집값을 잡고 시장도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싱크홀’에 빠진 박 과장들을 협박하고 훈계할 처지가 아니다.
박용 경제부장 parky@donga.com
‘집값 추락’ 협박 말고 연착륙 대책 내놔야
 박용 경제부장
박용 경제부장때론 영화가 현실의 아픈 지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주 개봉해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은 재난코미디 영화 ‘싱크홀’(지반 환경에 변화가 생겨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은 어렵게 장만한 집이 500m 깊은 땅속으로 꺼진다는 ‘웃픈’ 상상력으로 눈길을 끈다. 영화는 고생 끝에 서울 마포에 신축 빌라를 장만한 ‘박 과장’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무주택자 캐릭터는 너무 흔하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3%이니 거리에서 만난 가장 둘 중 하나는 무주택자다.
박 과장이 11년 만에 서울에 집을 마련한다는 설정도 현실과 부합한다. 치솟는 집값으로 수도권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수는 2016년 6.7배에서 지난해 8.0배로 높아졌다. 박 과장이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한다는 얘긴데, 월 소득의 18.6%가 매월 임차료로 들어가는 수도권의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겐 ‘재난’ 같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과장의 선택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다. 집을 얻는 대신 빚쟁이가 되는 또 다른 ‘재난’을 선택한 것이다. 현실도 그렇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 원으로 한 달 만에 9조7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73%를 차지한다.
상품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하지만 과시적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명품이나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더 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요가 따라붙는다. 실제로 집값이 치솟는데도,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2019년 84.1%에서 지난해 87.7%로 높아졌다. 공급 제한과 집값 상승 신호가 깜빡거리면 언제라도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된 ‘부동산시장의 예비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생산량이 제한된 한정판을 만들거나 가격 인상설을 흘리고 무례하게 고객을 줄 세우는 상술을 부리는 건 이런 시장에서 공급을 통제하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집값이 하염없이 오른 뒤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공급의 어려움을 뒤늦게 실토한 정부에 집값 급등의 근본 책임이 있다. 정부가 만든 부동산 싱크홀에 빠져 음악이 흘러나오면 시장의 힘에 떠밀려 무대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에게 정부 당국자가 집값 고점 운운하며 겁을 주는 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해법 역시 시장에 있다. 시장의 힘을 역이용해 시장이 원하는 곳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린다는 일관된 신호를 줘야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누그러질 것이다.
집 때문에 생긴 박 과장의 재난은 이제 시작이다. 영화에선 그 귀한 집이 집들이 날 장대비 속에서 생긴 싱크홀 때문에 땅속으로 추락한다. 집값 급락이야말로 영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동산시장의 싱크홀이다. 3월 말 현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34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2% 증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곧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대출 부실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집값을 잡고 시장도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싱크홀’에 빠진 박 과장들을 협박하고 훈계할 처지가 아니다.
박용 경제부장 parky@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4대그룹 총수에 ‘한한령 직격탄’ 게임-엔터기업들 李방중 동행
4대그룹 총수에 ‘한한령 직격탄’ 게임-엔터기업들 李방중 동행 “올 환율도 1400원 웃돌것”… 저가 매수-정부 개입-美연준 변수
“올 환율도 1400원 웃돌것”… 저가 매수-정부 개입-美연준 변수 송파 21%, 강북 0.99% 상승… 서울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
송파 21%, 강북 0.99% 상승… 서울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 작년 수출 7097억 달러… 올핸 ‘반도체 맑음-조선 흐림’ 소폭 줄 듯
작년 수출 7097억 달러… 올핸 ‘반도체 맑음-조선 흐림’ 소폭 줄 듯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민간 우주시장 ‘빅뱅’ 예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민간 우주시장 ‘빅뱅’ 예고- 말띠 스타들 “부상-슬럼프 털어내고, 적토마처럼 질주”
- ‘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 “기름 넣기 무섭네”…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1% 급등
- 연말 환율 1439원 ‘역대 3위’… 기업 “외화빚 늘고 환차손 큰 부담”
- 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