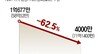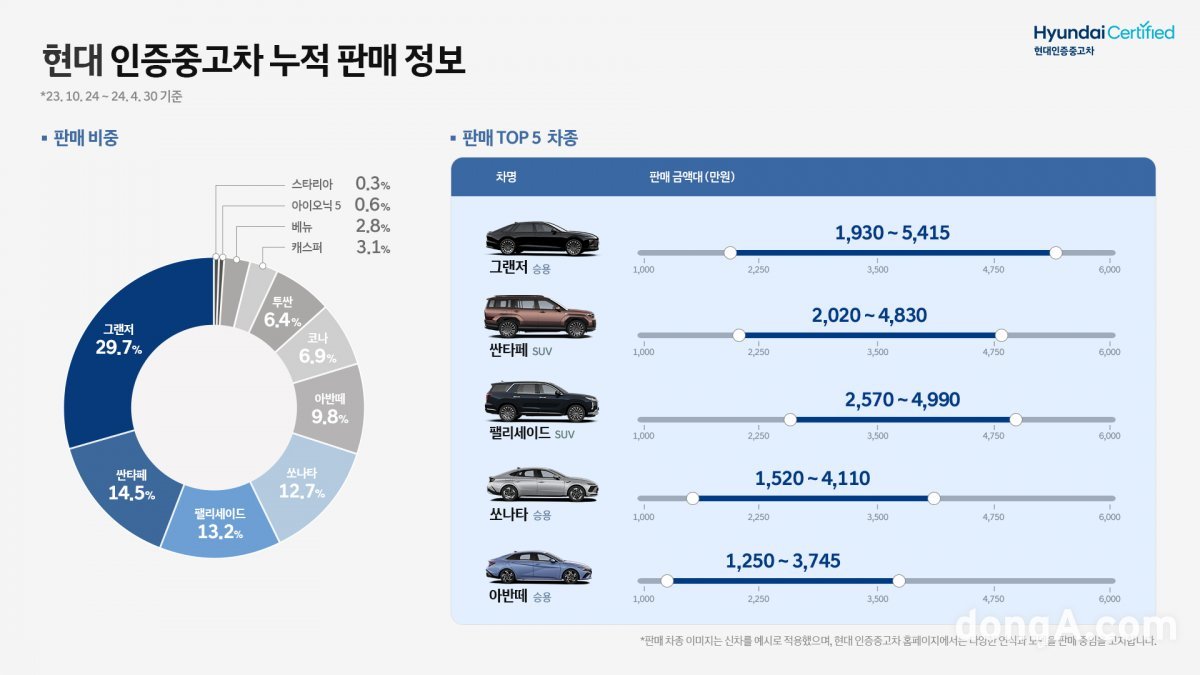마에스트로 김동률! 관현악단과 밴드의 앙상블 장르 넘나든 다채로운 편곡
임희윤 기자
입력 2019-12-02 03:00 수정 2019-12-02 10:47
데뷔 25년 싱어송라이터 시리즈 공연 ‘오래된 노래’
 이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한 가수 김동률.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곡 ‘아이처럼’도 그냥 두지 않았다. 도입부를 콘트라베이스 독주로 파격한 뒤 재즈로 진행하다 탱고로 매듭지어 버렸다. 뮤직팜 제공“자, 다 같이!”도 “모두 일어나세요!”도 없었지만 객석의 기립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마법처럼 일어났다. 150분짜리 공연의 폐막. 1층부터 3층까지 전석이 약속한 듯 봉곳이 솟았다. 한동안 이어진 기립박수.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풍경이다.
이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한 가수 김동률.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곡 ‘아이처럼’도 그냥 두지 않았다. 도입부를 콘트라베이스 독주로 파격한 뒤 재즈로 진행하다 탱고로 매듭지어 버렸다. 뮤직팜 제공“자, 다 같이!”도 “모두 일어나세요!”도 없었지만 객석의 기립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마법처럼 일어났다. 150분짜리 공연의 폐막. 1층부터 3층까지 전석이 약속한 듯 봉곳이 솟았다. 한동안 이어진 기립박수.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풍경이다.
 가수 김동률(45·사진)이 1일 마친 대규모 시리즈 공연 ‘오래된 노래’는 치밀한 완벽주의자가 대중음악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담한 무대였다.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8회 공연의 좌석은 총 2만4000여 석. 예매 개시 단 3분 만에 전석이 동난 터다.
가수 김동률(45·사진)이 1일 마친 대규모 시리즈 공연 ‘오래된 노래’는 치밀한 완벽주의자가 대중음악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담한 무대였다.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8회 공연의 좌석은 총 2만4000여 석. 예매 개시 단 3분 만에 전석이 동난 터다.
김동률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를 넓게 썼다. 20여 명의 관현악단과 밴드 멤버를 무대에 올렸다. ‘마에스트로 김동률’의 갈라 콘서트 같았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싶기도 했다. “셋리스트(선곡 목록)가 좀 많이 불친절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 공언했듯, 2시간 반 동안 20곡을 소화했지만 ‘기억의 습작’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거위의 꿈’(이적과 듀오 ‘카니발’로 발표)은 없었다.
데뷔 25년 차의 김동률은 길게는 20년 된 선율들을 초견곡이라도 부르듯 조심스럽게, 정성껏 훑어 내려갔다. 편곡에서는 탱고, 재즈, 클래식을 오가며 템포를 쥐락펴락하면서 유려한 건축미를 과시했다. 드럼이 팝의 기본 리듬을 연주한 곡이 고작 두세 개에 그쳤을 정도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음악과 조명의 힘만으로 밀어붙인 점도 돋보였다. 그 때문인지 일부 과도한 조명 연출만은 옥에 티였다.
미국 버클리음대 재학시절 ‘재즈병’에 걸려 만들었다는 ‘편지’(2000년 2집)는 원곡의 양식미를 높였다. 뮤티드 트럼펫(트럼펫 앞부분을 막아 내는 소리)이 곡을 이끌며 여러 대의 기타와 피아노, 관악기와 콘트라베이스가 입체적 재즈 연주를 보여줬다.
“각 연주자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데도 고심했다”는 김동률의 말처럼 곡에 따라 악기도 주인공 자리를 넘봤다. 이를테면 ‘고백’(2014년 6집)에서 중반부에는 부드러운 트롬본 솔로를, 말미에는 깔깔한 펜더 텔레케스터 모델 전기기타의 음색이 돋보이는 솔로를 배치했다. 원곡의 필름에서 잘려나간 스펙트럼을 보여준 ‘디렉터스 컷’ 같았다.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무대로 올린 대목은 김동률이 대중음악가의 한계를 깨부수려 함을 더욱 방증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김정원의 반주에 맞춰 슈만의 연가곡처럼 살랑대던 그는, 이어진 ‘청원’에서 20인조 관현악단을 배경으로 특유의 비탄 어린 절창을 뿜었다. 김정원은 내친 김에 독주로 멘델스존의 ‘무언가’, 쇼팽의 ‘야상곡’, 슈만의 ‘헌정’까지 들려줬다.
김동률은 친숙한 곡 ‘아이처럼’을 재즈와 탱고로 새로이 비벼냈고, ‘취중진담’은 두 명의 기타리스트에게 충분한 공간을 줘 블루스의 맛을 증폭했다. 김동률은 “23세에 발표한 곡인데 딱 그만큼(23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이제야 어덜트 버전인 셈”이라 눙쳤다.
김동률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적 크루너(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남자 가수)로서 자신의 역량은 물론이고 스스로 스탠더드 곡을 쓰고 유연하게 재해석하는 편곡자로서 능력까지 고루 입증했다. 그는 아직 부족하기에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한 가수 김동률.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곡 ‘아이처럼’도 그냥 두지 않았다. 도입부를 콘트라베이스 독주로 파격한 뒤 재즈로 진행하다 탱고로 매듭지어 버렸다. 뮤직팜 제공
이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한 가수 김동률.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곡 ‘아이처럼’도 그냥 두지 않았다. 도입부를 콘트라베이스 독주로 파격한 뒤 재즈로 진행하다 탱고로 매듭지어 버렸다. 뮤직팜 제공
김동률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를 넓게 썼다. 20여 명의 관현악단과 밴드 멤버를 무대에 올렸다. ‘마에스트로 김동률’의 갈라 콘서트 같았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싶기도 했다. “셋리스트(선곡 목록)가 좀 많이 불친절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 공언했듯, 2시간 반 동안 20곡을 소화했지만 ‘기억의 습작’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거위의 꿈’(이적과 듀오 ‘카니발’로 발표)은 없었다.
데뷔 25년 차의 김동률은 길게는 20년 된 선율들을 초견곡이라도 부르듯 조심스럽게, 정성껏 훑어 내려갔다. 편곡에서는 탱고, 재즈, 클래식을 오가며 템포를 쥐락펴락하면서 유려한 건축미를 과시했다. 드럼이 팝의 기본 리듬을 연주한 곡이 고작 두세 개에 그쳤을 정도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음악과 조명의 힘만으로 밀어붙인 점도 돋보였다. 그 때문인지 일부 과도한 조명 연출만은 옥에 티였다.
미국 버클리음대 재학시절 ‘재즈병’에 걸려 만들었다는 ‘편지’(2000년 2집)는 원곡의 양식미를 높였다. 뮤티드 트럼펫(트럼펫 앞부분을 막아 내는 소리)이 곡을 이끌며 여러 대의 기타와 피아노, 관악기와 콘트라베이스가 입체적 재즈 연주를 보여줬다.
“각 연주자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데도 고심했다”는 김동률의 말처럼 곡에 따라 악기도 주인공 자리를 넘봤다. 이를테면 ‘고백’(2014년 6집)에서 중반부에는 부드러운 트롬본 솔로를, 말미에는 깔깔한 펜더 텔레케스터 모델 전기기타의 음색이 돋보이는 솔로를 배치했다. 원곡의 필름에서 잘려나간 스펙트럼을 보여준 ‘디렉터스 컷’ 같았다.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무대로 올린 대목은 김동률이 대중음악가의 한계를 깨부수려 함을 더욱 방증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김정원의 반주에 맞춰 슈만의 연가곡처럼 살랑대던 그는, 이어진 ‘청원’에서 20인조 관현악단을 배경으로 특유의 비탄 어린 절창을 뿜었다. 김정원은 내친 김에 독주로 멘델스존의 ‘무언가’, 쇼팽의 ‘야상곡’, 슈만의 ‘헌정’까지 들려줬다.
김동률은 친숙한 곡 ‘아이처럼’을 재즈와 탱고로 새로이 비벼냈고, ‘취중진담’은 두 명의 기타리스트에게 충분한 공간을 줘 블루스의 맛을 증폭했다. 김동률은 “23세에 발표한 곡인데 딱 그만큼(23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이제야 어덜트 버전인 셈”이라 눙쳤다.
김동률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의 대표적 크루너(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남자 가수)로서 자신의 역량은 물론이고 스스로 스탠더드 곡을 쓰고 유연하게 재해석하는 편곡자로서 능력까지 고루 입증했다. 그는 아직 부족하기에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꽤 오래 해왔는데도 공연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게 또 원동력이 돼요. 아마 저는 백발이 돼도 무대에선 늘 떨릴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음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비즈N 탑기사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부모님 부양만도 벅찬데 아이 어떻게”…결혼·출산 주저하는 3040
“부모님 부양만도 벅찬데 아이 어떻게”…결혼·출산 주저하는 3040 “수입김 한시적 관세 면제”…김값 안정화 위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김 한시적 관세 면제”…김값 안정화 위해 ‘할당관세’ 적용 “서울 6억 미만 아파트 어디 없나요”…강북 중소형도 9억원 훌쩍
“서울 6억 미만 아파트 어디 없나요”…강북 중소형도 9억원 훌쩍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쿠팡, ‘알-테-쉬’ 공세 맞대응 부담… 영업익 62.5% 줄어
쿠팡, ‘알-테-쉬’ 공세 맞대응 부담… 영업익 62.5% 줄어- 韓 낮은 약값에… 글로벌 제약사들, ‘韓 패싱’ 中-日부터 신약 출시
- 동남아에 눈돌리는 반도체 기업들 “韓-대만 의존 탈피”
- 자영업자, 5대銀 대출연체… 1년새 37% 급증 1조 넘어
- 금리 인상에 ‘영끌’ 포기…韓 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 사과·오렌지 값 올라도 물가 누르는 정부…“주스 판매 중단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