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대체 왜?
구특교기자
입력 2018-07-26 16:37 수정 2018-07-26 16:40

24일 오후 3시 반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설명회를 찾은 김모 씨(40). 그는 14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 편의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이 참석자들을 ‘경영주님’이라고 부르며 설명을 시작했다. 15분 간 해당 편의점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직원은 ‘약 2000만 원만 있으면 곧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다. 그는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카페를 여는데 필요한 초기 비용은 1억 원이 넘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편의점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고 저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편의점 창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되며 편의점 업계는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전국에 수십 개의 지역 영업소를 두고 매일 창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19~25일 열린 편의점 창업설명회에 참가한 ‘예비 창업주’들은 만나보니 대부분 “힘든 건 알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된 창업설명회장을 찾았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하려고 아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A 씨는 “인건비 때문에 걱정이 크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어 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참석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 계약을 맺는다”는 본사 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다음주 일대일 상담을 약속했다. 이후 다른 편의점 설명회에 가본다며 자리를 떴다.
직장인 정모 씨(30)는 20일 일을 하다 잠시 짬을 내 설명회장을 찾았다. 정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 일보다 혼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게 쉽다고 생각한다. 정 씨는 “어차피 퇴직하고 시작할 텐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 ‘편의점 공화국’…“악순환 끊어야”
반면 편의점을 운영 중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B 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개업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B 씨는 “작은 돈을 꾸준히 벌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한다.
지난해 개업한 점주 윤모 씨(40)도 마찬가지다. 그만두고 싶어도 인테리어비 등 5000만 원 이상 위약금이 예상돼 4년을 더 버텨야 한다. 윤 씨는 “편의점만큼 쉬워 보이는 게 없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며 “4년을 어떻게 더 버틸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점포 수는 4만 개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진단한다. 손쉽게,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이 ‘편의점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편의점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가 버는 돈에서 일정 몫을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가맹점을 많이 유치할수록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이윤태 인턴기자 연세대 사학과 4학년
비즈N 탑기사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머니 컨설팅]금리 인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주목해야
[머니 컨설팅]금리 인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주목해야 금값, 올들어 33% 치솟아… 내년 3000달러 넘을 수도
금값, 올들어 33% 치솟아… 내년 3000달러 넘을 수도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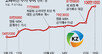 주도주 없는 증시, ‘경영권 분쟁’이 테마주로… 급등락 주의보
주도주 없는 증시, ‘경영권 분쟁’이 테마주로… 급등락 주의보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청력 손실, 치매 외 파킨슨병과도 밀접…보청기 착용하면 위험 ‘뚝’
- “오후 5시 영업팀 회의실 예약해줘”…카카오, 사내 AI 비서 ‘버디’ 공개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일상생활 마비 손목 증후군, 당일 수술로 잡는다!
-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후 소멸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꼼꼼히 살펴야



















![[단독]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18곳 중 16곳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단독]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18곳 중 16곳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3032601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