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라이프] ‘스마트 팩토리’ 워라밸 대안 될까
포항=김현수 기자
입력 2018-03-20 17:15 수정 2018-03-20 17:27
 포스코 포항제철소. 동아일보 DB
포스코 포항제철소. 동아일보 DB1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 초봄, 여전한 찬 기운 속으로 고로(高爐)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는 높이가 100m로 높아서 고로로 불린다.
네모난 구멍으로 쇳물이 나오는 출선구를 들여다보자 1500℃ 온도의 쇳물이 펄펄 끓어다. 품질이 높은 철을 생산하려면 불길의 온도를 잘 맞춰야 한다. 보통 제철소에서는 두 시간에 한 번씩 직원이 직접 기다란 온도계를 출선구에 넣어 온도를 잰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는 직원이 직접 불 속에 온도계를 넣을 필요가 없다. 각종 정보를 모으는 센서 덕분이다.
“2016년 7월부터 센서가 온도를 재고 데이터를 모아요. 담당자는 여름에도 시원한 상황실에서 연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손기완 제선부 팀장의 말이다. 손 팀장은 제2고로를 ‘스마트 고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현장 실무 팀장이다. 제2고로는 굴뚝 공장이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만나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팩토리(공장) 실험실이었다.
●스마트팩토리, 똑똑한 워라밸 실험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 혁신의 상징으로 꼽힌다. 포스코를 비롯해 두산중공업, LS산전,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이 제조 현장에 접목하는 중이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고향인 독일에서도 짧은 법정근로시간, 높은 인건비,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외 이전 없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 속에 도입됐다.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 7월부터다. 알파고가 승승장구하며 AI가 화제가 되던 시기다. 생산성 혁명을 기대하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다. 제2고로에서는 철광석 품질검사도 센서와 AI가 대신한다. 예전에는 사람이 임의로 광물을 추출해 직접 눈으로 체크해야 했다. 연소 상태 역시 고로 내부 센터가 각각의 발화 상태를 찍고, 각각의 발화 수준을 판단해 데이터로 축적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미래의 생산 현황을 예측하는 데 쓰인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해 제2고로 철 생산량은 5%가량 늘었다. 다른 스마트 공장 실험까지 더하면 연간 600억 원 이상 비용을 절감했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지난해 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중소기업 2800 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뚜렷했다. 도입 전보다 생산시간은 16% 줄고, 생산성은 30% 가량 올랐다.
포스코의 경우 잔업이나 고된 일을 AI와 센서가 맡아 주니 직원들은 여유를 갖게 됐다. 포스코 제선부 엔지니어들은 과거 매일 오전 7시 직전 24시간 동안 현장 작업 정보가 나오면 이를 취합해 각종 그래프를 넣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오전 업무 시간을 여기에 쏟았다. 문제가 있으면 생산 현장에 직접 가봐야 했다. 지금은 다르다. 출근하면 이미 데이터가 분석돼 있다. 현장 방문 횟수도 줄었다.
김영현 포스코 제선부 대리는 “단순 업무는 AI가 하고 엔지니어는 기술개발 같은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연히 연장 근무 시간도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논란은 여전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면 결국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포스코의 스마트 실험은 어땠을까. 심민석 포스코 정보기획실 상무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와 스마트화는 다르다. 이미 자동화를 통해 공장 내 일자리 수는 최적화 했다고 본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반복 업무는 줄이고, 창의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센서와 AI가 늘어도 데이터를 관리할 사람은 필요하다. 지난해 포항에서 진도 5.5 지진이 나자 고로 내 센서 위치가 흔들렸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수동으로 필요한 업무를 이어나간 것은 사람이었다.
일자리의 성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단순작업 근무 인력은 줄고, 데이터 관리자는 늘어나 고용 총량은 늘더라도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인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일부 제조업에서 노사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쉬운 것만도 아니다. AI가 제 역할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구축에만 1년여가 걸린다. AI나 빅데이터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도 계열 정보통신사, GE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손을 잡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달 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해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상생모델을 활용하면 구축 비용을 정부(30%), 대기업(30%), 중소기업(40%)이 각각 나눠 지불하게 된다.
▼근무시간 줄이는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전략▼
“하루 8시간 근무, 안전한 공장, 아동 노동 금지. 한 때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노동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노동은 다르다. 호숫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창의적인 지식노동자,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음주 원하는 근무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일 것이다.”
지난해 독일 노동부가 발간한 백서 ‘노동 4.0’에 실린 내용이다. ‘좋은 노동’을 위해 인간과 로봇이 잘 협동하고 유연한 근무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독일은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선두주자로 불린다. 201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멘스의 독일 암베르크 공장은 스마트팩토리 교본으로 꼽힌다. 10년 전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들이 소통하며 순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20여 년 전과 종업원 수는 변함없지만 생산성은 8배 이상 증가했다. 이곳 직원들은 평균 주 35시간 일한다.
독일은 정부가 주체가 돼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기술 협의체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지멘스, 보쉬, SAP 등 글로벌 기업과 독일 내 중소 중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기계와 장비 간 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높여주는 기술 표준화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 독일 모델을 따라 정부, 학계,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소기업끼리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초 ‘스마트공장 확산센터’를 출범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송지효 씨제스와 결별, 백창주 대표와는 2년 전 이미 결별…‘앞으로의 활동은?’
송지효 씨제스와 결별, 백창주 대표와는 2년 전 이미 결별…‘앞으로의 활동은?’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순풍 탄 K반도체… 삼성-SK ‘영업익 200조’ 연다
순풍 탄 K반도체… 삼성-SK ‘영업익 200조’ 연다 ‘美금리인하-산타 랠리’ 기대감에… 증시 ‘빚투’ 27조 역대 최고
‘美금리인하-산타 랠리’ 기대감에… 증시 ‘빚투’ 27조 역대 최고-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일자리 밖 2030’ 159만명
-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 은값 폭등에 60% 수익 낸 개미, 익절 때 왔나…“○○ 해소 땐 급락 위험”
- ‘위고비’ 맞자 술·담배 지출 줄었다…비만약, 생활습관 개선 효과
- 영유아 위협하는 ‘RSV’ 입원환자 증가…증상 세심히 살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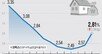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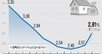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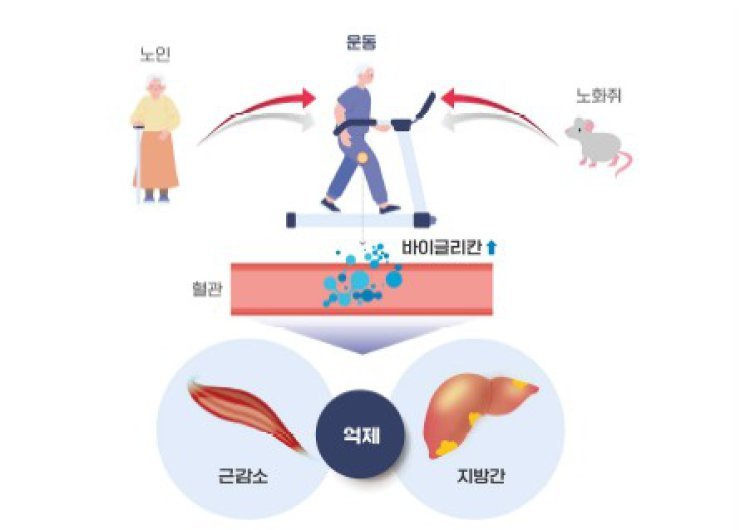

![[시승기] 제주에서 느끼는 드라이빙의 즐거움…‘포르쉐 올레 드라이브’ [시승기] 제주에서 느끼는 드라이빙의 즐거움…‘포르쉐 올레 드라이브’](https://dimg.donga.com/wps/ECONOMY/FEED/BIZN_FEED_EVLOUNGE/13270391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