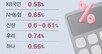무지개다리 건너기 전 주인 손 꼭 잡아준 강아지.."고마워요"
노트펫
입력 2019-10-11 18:07 수정 2019-10-11 18:07







[노트펫]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에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반려동물 역시 마음이 쓰여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별은 다가오기에 반려동물들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떠나기 전 눈빛과 행동으로 신호를 보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전 주인의 손을 꼭 잡아준 강아지의 사연이 올라왔다.
올해로 15살이 된 강아지 밤비의 보호자 평안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요새 들어 부쩍 기력이 떨어진 밤비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때 평안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나갈 때와 똑같아 보이는 양의 물과 밥.
걱정되는 마음에 밤비를 어르고 달래며 손으로 직접 주려고 했지만 녀석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숨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거칠었다.
그 모습을 본 평안 씨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밤비를 안고 이런저런 말을 다했다.
마음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털어놓고 밤비를 내려놓으니 녀석은 빤히 쳐다보더니 자신의 발을 평안 씨의 손 위에 얹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밤비의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평안 씨.
다음 날 새벽 밤비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평안 씨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던 녀석은 행여나 자신의 모습을 본 엄마가 슬퍼할까봐 걱정됐는지 힘든 와중에도 거실까지 나와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살면서 크게 아프지도 않고 집 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줬던 밤비.
그런 아이었기에 평안 씨는 "살면서 이런 강아지를 또 만날 순 없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다.
밤비는 2004년 겨울, 비가 주적주적 내리던 날 밤 가족들의 품에 왔다. 밤에 비를 맞으며 데려왔다고 하여 이름이 밤비가 됐단다.
온순한 성격에 산책과 공놀이를 좋아하던 밤비는 존재만으로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다. 밤비 역시 가족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언젠가 평안 씨의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밤비의 오줌을 밟고 넘어져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그 때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자던 밤비를 거실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녀석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지 눈치를 보며 미안해했단다.
이처럼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몸보다 컸던 밤비. 평안 씨는 "밤비를 생각하면 못 해줬던 것들이 떠올라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화장을 하고 원래 몸집보다 더 가볍고 작아져 버린 밤비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려 했다는 평안 씨네 가족.
평안 씨는 "밤비야. 15년 동안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가족으로 만나서 행복하고 기뻤어"라며 "그동안 수고 많았고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라고 못 다한 말을 전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한국에 ‘조선업 SOS’ 친 美… 항공정비-반도체 지원도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