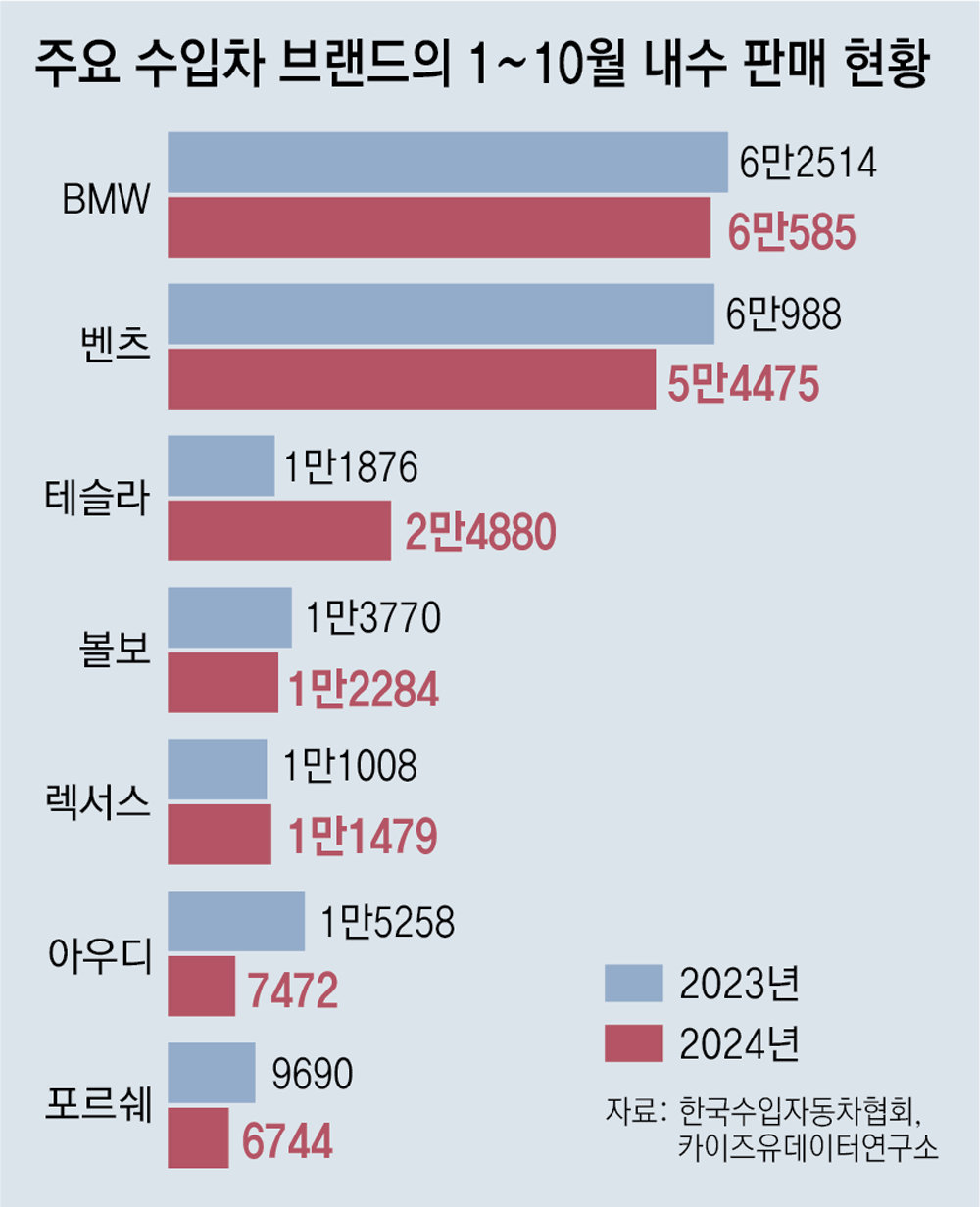주민번호-계좌만 불러주면 자동이체 ‘통과’
동아일보
입력 2014-02-03 03:00 수정 2014-02-03 03:00
[대한민국 온갖 정보 다 샌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자동이체 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대리운전기사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계좌 주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빼 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자동이체 서비스(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대리운전기사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계좌 주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빼 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최경원 씨(36)는 지난달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을 대리점에 맡겼다. 업무로 바빠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매장 직원은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대신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최 씨는 “내가 동의한 일이긴 해도 매달 10만 원 가까이 돈을 빼 가는 자동이체 신청을 이렇게 쉽게 대신 할 수 있다는 데 놀랐다”라고 말했다.
자동이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가 고객 동의하에 통장에서 이용대금을 자동으로 빼 가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이체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는 연간 516조 원에 이른다.
대리기사 앱을 통해 이뤄진 자동이체 사건은 이렇게 금융결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이체 동의서를 쓰거나 직접 전화로 신청해야 하지만, 제3자가 대신 서명하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상당수 업체는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불러 주면 자동이체를 받아 준다. 금융결제원이나 해당 은행이 자동이체를 본인이 직접 신청했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해당 업체가 작정하고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고객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해도 고객 스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부당 인출 사실이 드러나기 힘든 구조다.
자동이체 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다.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업체 상당수가 우유 대리점, 정수기 관리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라 일일이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자동이체 서비스 운영 과정을 점검해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결제 편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부분의 금융보안이 다소 소홀히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고객 동의를 확실하게 받게 하는 등 자동이체의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돈이 입금된 소프트웨어업체 H사 김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또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합동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관석 기자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경기 성남시에 사는 최경원 씨(36)는 지난달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을 대리점에 맡겼다. 업무로 바빠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매장 직원은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대신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최 씨는 “내가 동의한 일이긴 해도 매달 10만 원 가까이 돈을 빼 가는 자동이체 신청을 이렇게 쉽게 대신 할 수 있다는 데 놀랐다”라고 말했다.
자동이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가 고객 동의하에 통장에서 이용대금을 자동으로 빼 가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이체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는 연간 516조 원에 이른다.
대리기사 앱을 통해 이뤄진 자동이체 사건은 이렇게 금융결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과정이 허술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이체 동의서를 쓰거나 직접 전화로 신청해야 하지만, 제3자가 대신 서명하거나 전화로 신청해도 상당수 업체는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만 불러 주면 자동이체를 받아 준다. 금융결제원이나 해당 은행이 자동이체를 본인이 직접 신청했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해당 업체가 작정하고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고객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해도 고객 스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부당 인출 사실이 드러나기 힘든 구조다.
자동이체 업체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다.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업체 상당수가 우유 대리점, 정수기 관리업체 등 영세 자영업자라 일일이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자동이체 서비스 운영 과정을 점검해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결제 편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부분의 금융보안이 다소 소홀히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고객 동의를 확실하게 받게 하는 등 자동이체의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돈이 입금된 소프트웨어업체 H사 김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또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합동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관석 기자
비즈N 탑기사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