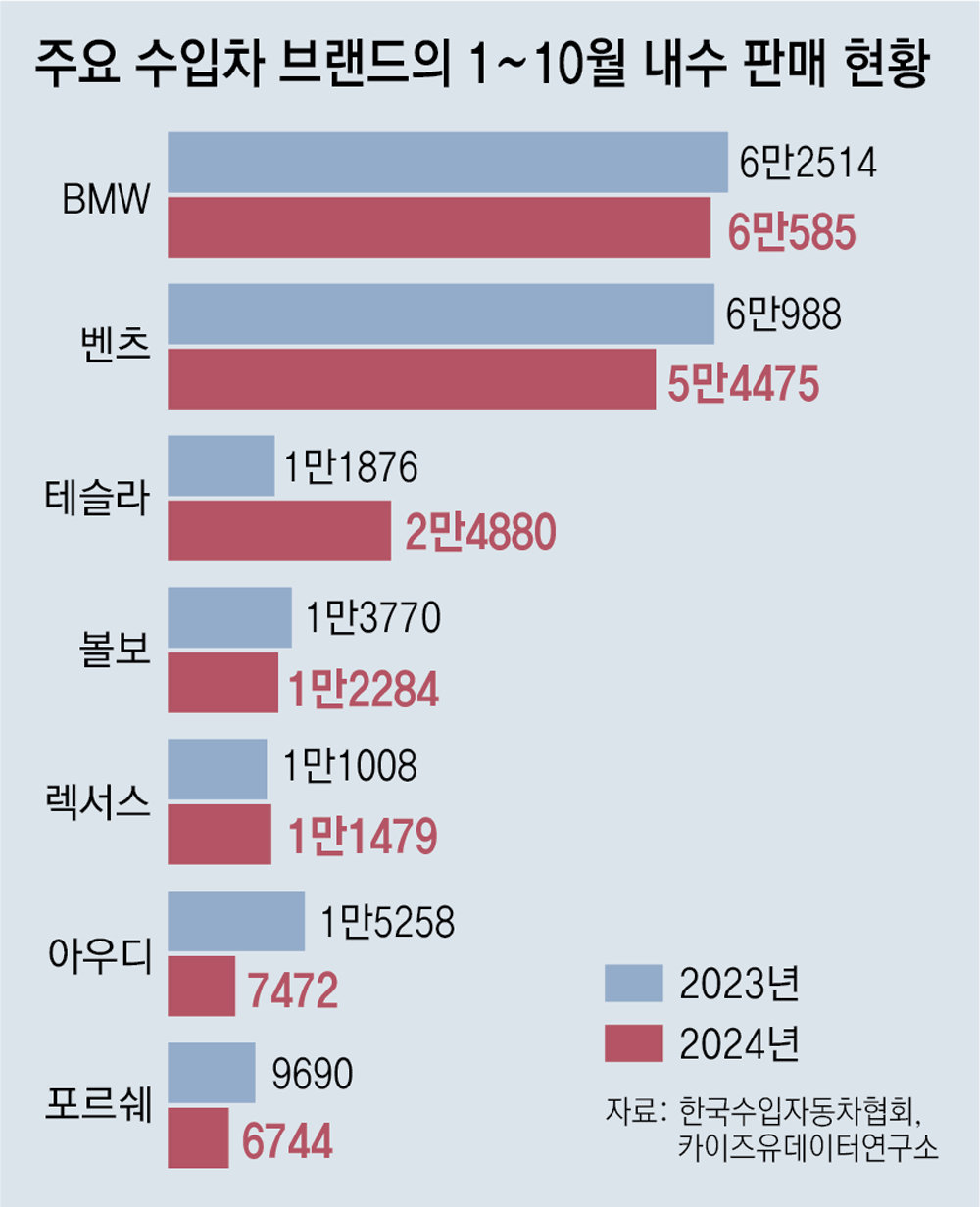[Close Up]“연비 개선!”… 자동차社 ‘범퍼 다이어트’ 경쟁
동아일보
입력 2013-04-19 03:00 수정 2013-04-19 08:45

전문가들은 “최근 완성차업계에서는 안전하면서도 가볍고, 친환경적인 ‘슈퍼 범퍼’를 원한다”며 “부품업계나 소재산업 부문에서도 자동차 범퍼와 관련한 디자인 및 신소재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자동차 범퍼는 1897년 체코의 임페리얼 네셀도르트 자동차회사가 만든 ‘프레지던트’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자동차 범퍼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19년 한 미국인이 자동차 앞뒤에 쇠막대기형 구조물을 달아 팔면서부터라고 전해진다. 미국 허드슨자동차가 1920년대 중반 스프링식 범퍼를 내놨고, 1974년 스웨덴 볼보가 충격흡수 범퍼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범퍼의 재질은 주로 철이었다. 자동차 앞뒤로 강력한 철을 붙여 놓아야 어디를 가든 차량 본체는 물론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1970년대 독일 폴크스바겐이 내놓은 ‘골프’였다. 이 차에 적용된 우레탄폼 플라스틱 범퍼는 ‘플라스틱 범퍼 시대’를 열었다.
범퍼 커버의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급격히 옮아가게 된 것은 ‘보행자 보호’ 이슈 때문이었다. 2000년대 들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보행자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차량은 저속 충돌시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했다. 철 소재로 만들어진 범퍼는 당연히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들은 범퍼를 플라스틱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보행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이웃나라 일본은 2005년부터,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철 범퍼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차량 안전을 다시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범퍼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됐다. 가장 바깥의 범퍼 커버와 충격완화장치(에너지 옵서버), 내부 지지대(백 빔) 등으로 이뤄졌다.
범퍼 커버는 저속 충돌 시에도 범퍼 자체가 깨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무재질을 첨가한 복합소재를 이용한다. 충격 흡수를 위한 ‘에너지 옵서버’는 폴리프로필렌(PP) 발포제품이 주로 활용된다. 그리고 차체 보호를 위한 구원투수로 투입된 구조물이 ‘백 빔’이다.
최근 완성차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차량 경량화’다. 고유가시대가 지속되면서 연료소비효율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자동차 무게를 약 10% 줄이면 연비는 3∼8%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량화 물결이 거세지면서 범퍼 소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커버에 플라스틱 소재를 써서 과거보다는 가벼워졌지만 충격흡수장치 등에 여전히 철 소재가 가미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제품 대부분의 범퍼 백 빔에는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MT)’이라는 소재가 쓰이고 있다. 이는 PP 수지에 유리섬유를 섞어 만든 플라스틱 복합소재로 강도는 철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무게가 20∼25% 덜 나간다. 국내 소재회사인 한화 L&C가 이 제품을 만들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뒤쪽 범퍼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 GMT보다 강성을 강화한 ‘스틸 하이브리드 GMT 프런트 빔’ 개발에 성공했다. 뒤쪽 범퍼보다는 충격흡수 효과가 높아야 하는 앞쪽 범퍼에 이 제품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비즈N 탑기사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