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김상수]터널에 갇힌 르노삼성차
동아일보
입력 2012-06-26 03:00 수정 2012-06-26 06:33
 김상수 산업부 차장
김상수 산업부 차장르노삼성차의 최근 실적은 암울하다. 지난해 214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이 회사는 올해 5월 내수 판매량이 466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8% 줄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이은 3위 자리를 지켰으나 올해 5월 시장 점유율은 3.8%로 4위다. 5위인 쌍용자동차(3.4%)에도 쫓기는 신세가 됐다.
부진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소비자에게 내놓는 제품군(라인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세단인 SM3, SM5, SM7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QM5의 4개가 라인업의 전부다. 국내에서 수입차가 폭발적으로 팔리는 것은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신차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르노삼성차는 라인업이 단순해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디자인도 평범하다. 이미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세계 최상급이다. 자동차 브랜드 글로벌 톱5로 도약한 현대·기아차그룹이 최근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도 바로 디자인이다. 기아차는 폴크스바겐 수석 디자이너 출신인 피터 슈라이어를 2006년 디자인총괄책임자(CDO)로 영입한 뒤 스포츠세단 같은 느낌을 주는 ‘호랑이 코 그릴’의 패밀리룩(통일된 디자인)으로 히트를 쳤다. 반면 르노삼성차는 디자인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젊은층은 외면하고 이미 SM시리즈를 경험한 고객들은 다른 차로 갈아탔다.
모기업인 르노닛산얼라이언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르노삼성차는 기술력은 프랑스 르노에, 부품은 일본 닛산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르노삼성차가 기술 및 디자인에서 밀리는 것은 본사인 르노닛산얼라이언스에서 연구개발(R&D) 및 디자인을 총괄하기 때문에 한국 법인의 개입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한국 고객층의 기호를 제때 못 맞춘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차가 수렁에 빠지면서 초일류를 지향하는 삼성그룹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르노삼성차는 현재 삼성 계열사는 아니지만 삼성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르노삼성의 모태인 삼성자동차를 탄생시켰다. 현재는 자동차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르노삼성차 지분의 19.9%를 삼성카드가 갖고 있다.
또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쓰게 하는 대가로 르노삼성차로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매출의 0.8%를 브랜드 사용료로 받게 돼 있다.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다. 2008년에는 이 금액이 2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적자가 나는 바람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르노삼성차가 추락하면서 삼성 이미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터널에 갇힌 르노삼성차에 ‘비상구’는 있을까.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R&D를 강화하고 디자인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그룹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 부회장이 27일 한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방한에서 그가 본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상수 산업부 차장 ssoo@donga.com
비즈N 탑기사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 ‘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너무 생소해서? 한강 ‘한국어 호명’ 막판 무산된 까닭
- “수업 대신 탄핵 집회” 학생 메일에…“용기 내어 전진하길” 교수 답장
 ‘2030 청년층’ 평균소득 2950만원…‘4050 중장년층’ 4259만원
‘2030 청년층’ 평균소득 2950만원…‘4050 중장년층’ 4259만원 내년 입주물량 22% 줄어 23만7582가구…2021년 이후 최저
내년 입주물량 22% 줄어 23만7582가구…2021년 이후 최저 ‘김장비용 뛴 이유 있었네’…배추·무 생산량 6.3%·21%↓
‘김장비용 뛴 이유 있었네’…배추·무 생산량 6.3%·21%↓ 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 “두 달 새 2억 하락”…서울 대장 아파트값도 ‘주춤’
- 부자들 부동산 자산 10% 늘어… “주식-금·보석-주택 順 투자 유망”
- 작년 北 경제성장률 4년만에 반등했지만…남북 GDP 격차 60배
- 작년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서울 ‘2937만원’ 8년째 1위
- “외국인도 내년부터 네이버지도서 국내 식당-공연 예약 OK”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30422667.2.thumb.png)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30691665.4.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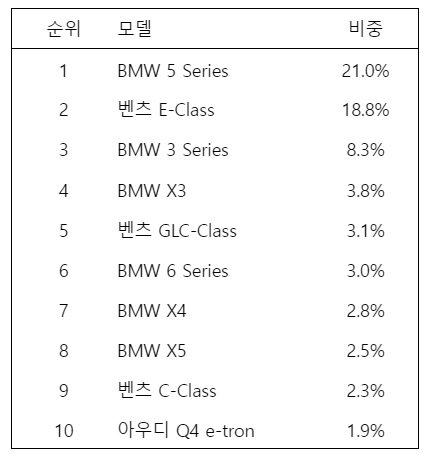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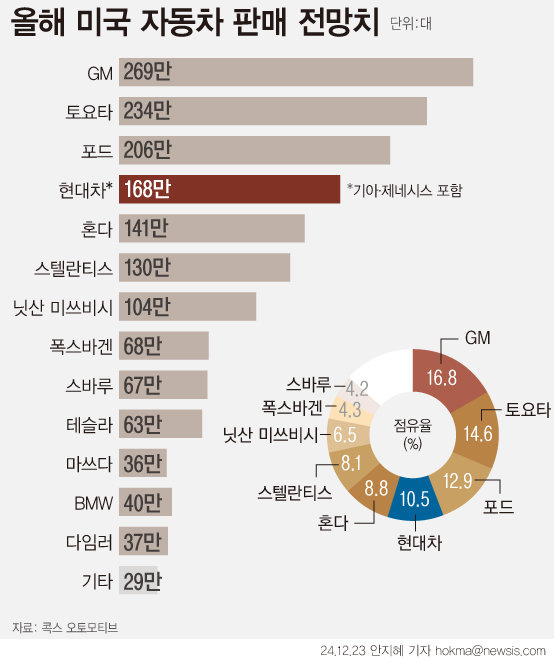


![술자리 많은 연말, 간 피로 풀어주는 시금치[정세연의 음식처방] 술자리 많은 연말, 간 피로 풀어주는 시금치[정세연의 음식처방]](https://dimg.donga.com/wps/ECONOMY/FEED/BIZN_HEALTH/130699949.6.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