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공인하는 모발이식 전문가 하지만 웬만해선 수술 안 권해요”
조건희기자
입력 2017-10-23 03:00 수정 2017-10-23 03:00
황성주 세계모발이식학회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모발이식학회장으로 취임한 ’털박사’ 황성주 원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한국인 최초로 세계모발이식학회장이 된 황성주 털털한피부과 원장(47)은 20일 인터뷰 자리에서 대뜸 기자(32)의 앞머리부터 들춰봤다. ‘M자’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있는 이마가 드러났다. 하지만 뜻밖에도 황 원장은 “모발이식을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모발이식 후에도 탈모가 진행되면 이마에 심은 머리카락만 외로이 남는 ‘더듬이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모발이식학회장으로 취임한 ’털박사’ 황성주 원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한국인 최초로 세계모발이식학회장이 된 황성주 털털한피부과 원장(47)은 20일 인터뷰 자리에서 대뜸 기자(32)의 앞머리부터 들춰봤다. ‘M자’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있는 이마가 드러났다. 하지만 뜻밖에도 황 원장은 “모발이식을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모발이식 후에도 탈모가 진행되면 이마에 심은 머리카락만 외로이 남는 ‘더듬이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황 원장은 자타 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발이식 전문가다. 그의 진료실엔 세계모발이식학회가 2006년 전 세계 모발이식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의사에게 주는 ‘백금모낭상’ 상패가 있다. 2011년엔 한국인 중 처음으로 아시아모발이식학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환자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이식 후에도 다른 부위의 탈모가 계속 진행돼 2차, 3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 원장은 “내 가족이어도 권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본 뒤 결정한다”고 말했다.
1994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 경북대병원 모발이식센터에서 임상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모발은 심은 부위의 영향을 받아 자라나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수여부영향설’을 입증했다. 모발을 머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식하면 원래 자리에 있을 때만큼 잘 자라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모낭을 어디로 옮겨 심든 원래 성질을 유지한다는 통설을 뒤집은 것으로, 2003년 미국의 모발이식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야기 도중 황 원장은 윗옷을 올렸다. 당시 스스로 인체실험의 피험자를 자처해 등에 옮겨 심었던 모발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의 등 한복판에는 15∼20가닥의 털이 10cm 길이로 자라 있었다.
최근 세계 모발이식 학계의 ‘대세’는 ‘모공 단위 이식술’이다. 기존엔 피부를 한꺼번에 들어내 이식하는 ‘피판술’이 많았지만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양도 부자연스러웠다. 모낭을 2, 3개씩 1개의 모공 단위로 나눠 이식하는 모공 단위 이식술은 흉터가 점처럼 남아 머리를 짧게 깎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황 원장은 어릴 적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중고교를 졸업했다. 2012년에 문득 ‘주위의 도움 덕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 100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10대인 두 딸도 용돈을 모아 후원금으로 낸다고 했다.
황 원장은 모발이식을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도 탈모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언젠가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불필요하게 여러 번 수술 받는 일을 피하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한국인 최초로 세계모발이식학회장으로 취임한 ’털박사’ 황성주 원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인 최초로 세계모발이식학회장으로 취임한 ’털박사’ 황성주 원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황 원장은 자타 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발이식 전문가다. 그의 진료실엔 세계모발이식학회가 2006년 전 세계 모발이식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의사에게 주는 ‘백금모낭상’ 상패가 있다. 2011년엔 한국인 중 처음으로 아시아모발이식학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환자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이식 후에도 다른 부위의 탈모가 계속 진행돼 2차, 3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 원장은 “내 가족이어도 권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본 뒤 결정한다”고 말했다.
1994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 경북대병원 모발이식센터에서 임상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모발은 심은 부위의 영향을 받아 자라나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수여부영향설’을 입증했다. 모발을 머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식하면 원래 자리에 있을 때만큼 잘 자라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모낭을 어디로 옮겨 심든 원래 성질을 유지한다는 통설을 뒤집은 것으로, 2003년 미국의 모발이식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야기 도중 황 원장은 윗옷을 올렸다. 당시 스스로 인체실험의 피험자를 자처해 등에 옮겨 심었던 모발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의 등 한복판에는 15∼20가닥의 털이 10cm 길이로 자라 있었다.
최근 세계 모발이식 학계의 ‘대세’는 ‘모공 단위 이식술’이다. 기존엔 피부를 한꺼번에 들어내 이식하는 ‘피판술’이 많았지만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양도 부자연스러웠다. 모낭을 2, 3개씩 1개의 모공 단위로 나눠 이식하는 모공 단위 이식술은 흉터가 점처럼 남아 머리를 짧게 깎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황 원장은 어릴 적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한적십자사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중고교를 졸업했다. 2012년에 문득 ‘주위의 도움 덕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 100명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10대인 두 딸도 용돈을 모아 후원금으로 낸다고 했다.
황 원장은 모발이식을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도 탈모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언젠가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불필요하게 여러 번 수술 받는 일을 피하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비즈N 탑기사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지점토 씹는 맛” 투뿔 한우 육사시미 ‘충격’…“뿔 두개 달린 소 아니냐”
- ‘강북 햄버거 가게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너무 생소해서? 한강 ‘한국어 호명’ 막판 무산된 까닭
- “수업 대신 탄핵 집회” 학생 메일에…“용기 내어 전진하길” 교수 답장
 “두 달 새 2억 하락”…서울 대장 아파트값도 ‘주춤’
“두 달 새 2억 하락”…서울 대장 아파트값도 ‘주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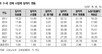 서울시 일자리, 13개 사라지고 17개 새로 생겼다…취업자 평균 42.5세
서울시 일자리, 13개 사라지고 17개 새로 생겼다…취업자 평균 42.5세 “외국인도 내년부터 네이버지도서 국내 식당-공연 예약 OK”
“외국인도 내년부터 네이버지도서 국내 식당-공연 예약 OK” 작년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서울 ‘2937만원’ 8년째 1위
작년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서울 ‘2937만원’ 8년째 1위 작년 北 경제성장률 4년만에 반등했지만…남북 GDP 격차 60배
작년 北 경제성장률 4년만에 반등했지만…남북 GDP 격차 60배-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 쇼크… 부진한 2분기 전망치에 반도체 주가 줄줄이 하락
- 분당-평촌-산본에 7700채… 1기 신도시 이주주택 공급
- 올해 ‘올레드 노트북’ 보급률 증가…中 수요 늘었다
- “토종 OTT 콘텐츠 펀드 1조 조성… 글로벌 진출-AI혁신 돕겠다”
- “올 연말에도 불경기 계속” 유통가, 희망퇴직·권고사직 잇따라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 머리 아픈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국세청 공인 꿀팁은?[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30422667.2.thumb.png)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30691665.4.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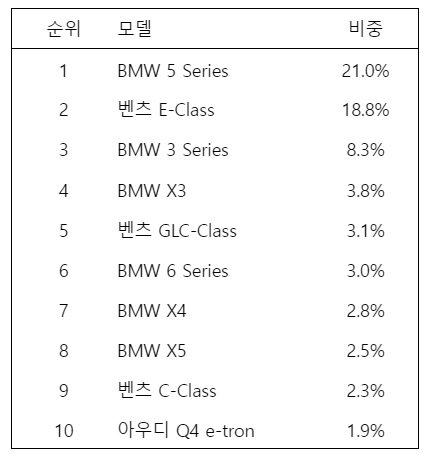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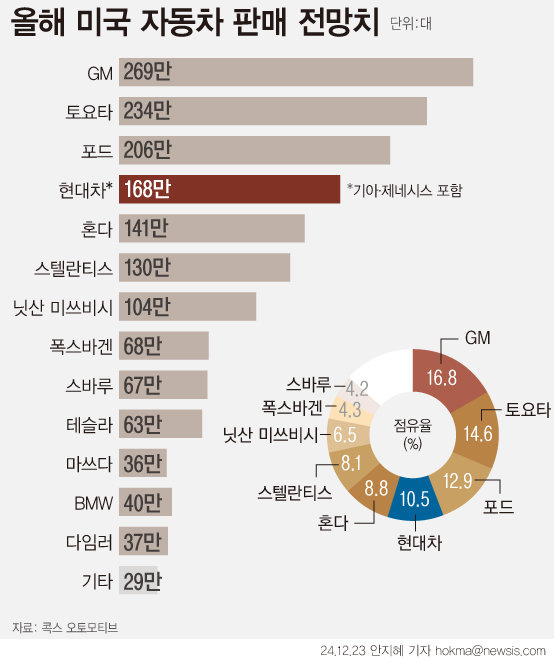


![술자리 많은 연말, 간 피로 풀어주는 시금치[정세연의 음식처방] 술자리 많은 연말, 간 피로 풀어주는 시금치[정세연의 음식처방]](https://dimg.donga.com/wps/ECONOMY/FEED/BIZN_HEALTH/130699949.6.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