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금성’서 글로벌 기업 ‘LG’로…1등 이끈 승부사 구본무 회장
김재희기자 , 서동일기자
입력 2018-05-20 12:40 수정 2018-05-20 12:43

구본무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승부사였다. 온화하고 쾌활한 성품 이면에 ‘인화의 LG’를 ‘1등 LG’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구 회장은 1995년 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명을 ‘럭키금성’에서 ‘LG’로 바꿨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였다. 이후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과감하고 꾸준한 투자로 전자와 화학 사업을 글로벌 LG의 두 축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다.
구 회장은 1992년 영국에 출장 갔다가 2차전지를 접한 뒤 투자를 결정했다. 20여 년간 세계 1위에 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연구개발(R&D)을 밀어붙였다. 2005년 20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내며 상황이 악화되자 임원들은 사업을 접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끈질기게 하다 보면 꼭 성공할 날이 온다”며 “전지 사업 R&D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독려했다. 현재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중대형 분야 세계 1위, 자동차 배터리 분야 세계 4위를 달리고 있다. LG화학에서 분리시킨 LG생활건강은 지난해 화장품 1위 자리에 올랐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빅딜’을 추진하며 반도체 사업을 현대그룹에 넘기려 하자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사업만큼은 넘길 수 없다”고 버텼다. 사업을 지켜낸 구 회장은 네덜란드 필립스로부터 16억 달러를 유치해 LG필립스LCD(현재 LG디스플레이)라는 사명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구 회장의 결단으로 탄생한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선두에 올랐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LCD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구 회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빠르게 옮겨 갔다. 구 회장은 2012년 10월 열린 업적보고회에서 “글로벌 시장선도 기업은 경기침체기에도 수익성이 탄탄하다”며 OLED TV를 시장선도 최우선 제품으로 지목했다. LG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은 LG전자는 2013년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인 ‘CES’에서 OLED TV를 선보인 이후, 최초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며 OLED 진영을 선도하고 있다.
1990년대 말 데이콤 인수전에서도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당시 통신사업은 ‘21세기 황금알’로 불리며 국내 굴지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데이콤 최대주주였던 삼성은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서며 LG를 위협했다. 삼성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데이콤을 인수하며 LG는 정보통신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그룹이 됐다. 2010년에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통신3사를 합병해 LG유플러스를 출범시켰다.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은 2006년 주파수를 반납하며 3G를 포기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LG유플러스는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을 선점하며 정면승부를 택했다. 2011년 LG유플러스는 3개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LTE 상용화에 성공했고, 2012년 3월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했다. 당시 구 회장은 “단기 경영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네트워크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투자해라”고 지시했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의 기초도 구 회장이 닦았다. LG전자는 2013년 LG CNS 자회사인 ‘V-ENS’를 인수해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C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당시 구 회장은 이우종 V-ENS 대표를 VC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VC사업본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부사장이 아닌 사장 직책을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LG와 LG전자는 LG 계열사 인수합병(M&A) 금액 중 가장 큰 1조4440억 원에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업체 ZKW를 인수하는 등 전장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구 회장에게 뼈아픈 기억도 있다. 빅딜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을 접은 일이다. LG는 2007년 60주년 사사를 편찬하며 반도체 빅딜 당시 상황에 대해 ‘인위적 반도체 빅딜은 한계 사업 정리, 핵심 역량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평가는 후일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3년 불거진 ‘LG카드 대란’도 아쉬움을 남겼다. 가전,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LG전자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의 지속되는 적자 역시 쉽사리 풀지 못하는 숙제였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비즈N 탑기사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가성비’ 편의점 PB우유마저 오른다…12월부터 10% 안팎 인상 확정
‘가성비’ 편의점 PB우유마저 오른다…12월부터 10% 안팎 인상 확정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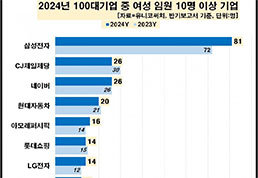



![[HBR]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라 [HBR]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30444223.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