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솔천 그리며 오르다 땅끝 아름다움에 멈춘 곳
글·사진 해남=김동욱 기자
입력 2020-03-21 03:00 수정 2020-03-21 03:00
해남 미황사·도솔암
 기암절벽 위에 자리 잡은 도솔암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속세와 거리를 두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어디 한적한 곳이라도 떠나볼까?”
기암절벽 위에 자리 잡은 도솔암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속세와 거리를 두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어디 한적한 곳이라도 떠나볼까?”
햇살이 점점 따사로워지기 시작한다. 어디로라도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진다. 그렇다. 봄이 오고 있다. 땅끝마을로 유명한 전남 해남군은 호젓하게 걷기 좋은 곳이 많다. 남쪽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에 자리 잡은 도솔암, 달마산 기암괴석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미황사도 그런 곳이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해발 489m)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이어지면서 거대한 수석 같은 느낌을 준다.전국에는 수많은 ‘도솔암’이 있다. 그중 해남 도솔암은 풍광이 빼어난 암자로 손꼽힌다. 실제 도솔암에 가면 사진을 합성해 놓은 듯한 풍경에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어떻게 산 정상 절벽 위에 암자를 얹어 놓았지”라고 말이다. 도솔암은 그야말로 하늘 위에 떠 있는 암자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해발 489m)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이어지면서 거대한 수석 같은 느낌을 준다.전국에는 수많은 ‘도솔암’이 있다. 그중 해남 도솔암은 풍광이 빼어난 암자로 손꼽힌다. 실제 도솔암에 가면 사진을 합성해 놓은 듯한 풍경에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어떻게 산 정상 절벽 위에 암자를 얹어 놓았지”라고 말이다. 도솔암은 그야말로 하늘 위에 떠 있는 암자다.
달마산(해발 489m)이 남쪽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이유는 12km의 능선을 따라 기암괴석과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기 때문이다. 도솔암은 달마산 아래에 있는 미황사에서 능선을 따라 2시간 남짓 걸으면 닿을 수 있다. 산행이 부담된다면 자동차로 갈 수 있다. 능선 부근까지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800m만 걸으면 된다. 길은 평탄한 편이다. 호사스러운 산책이다. 달마산의 빼어난 절경을 한껏 즐길 수 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달마산의 기암괴석 사이로 푸른 서해 바다와 녹색의 논과 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풍경에 취해 있을 즈음 두 개의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암자 하나가 빼꼼히 얼굴을 내민다.

도솔암의 위치는 참 절묘하다. 그 위치에 있으면 완벽하겠다는 상상을 100% 현실로 만족시켜 준다. 두 개의 바위가 커다란 손처럼 암자를 떠받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바다 쪽, 암자 정면으로 수많은 작은 돌이 쌓인 축대가 있다.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인가 하는 묘한 기분에 휩싸인다. 계단 끝에 올라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달마산의 기암괴석과 서해 바다가 풍경화처럼 걸려 있다.
사실 10명이 서면 가득 찰 만큼 자그마한 앞마당과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도솔암의 전부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분위기에 계속 머물고만 싶어진다. 구름이라도 끼인 날이면 도솔암은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 보인다.
도솔암의 역사는 1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신라시대 승려인 의조 화상이 미황사 창건 전 수행하던 암자가 도솔암이었다. 수행에 정진하면서 낙조를 즐겼다고 한다. 실제로 도솔암에서 보는 낙조는 해남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붉게 서쪽 하늘이 물들 때 도솔암과 그 주변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도솔암 자체는 작은 전각과 한 그루의 나무, 작은 마당이 전부다.
도솔암 자체는 작은 전각과 한 그루의 나무, 작은 마당이 전부다.
지금의 도솔암은 최근 재건된 것이다. 정유재란(1597∼1598) 때 명량해전에서 패한 왜구들이 달마산으로 도망치다 도솔암을 불태웠다. 이후 400년 가까이 주춧돌과 기왓장만 남은 채 방치됐다. 많은 사람들이 도솔암을 복원하려 했지만 험한 지형 때문에 포기했다. 2002년 오대산 월정사의 법조 스님이 사흘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솔암의 꿈을 꿨다고 한다. 이후 도솔암을 찾아 32일 만에 단청까지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1800장의 기와를 밑에서부터 옮겨온 끝에 이룬 결실이었다.
도솔암 50m 아래에는 용이 살았다는 용샘이 있다. 천년을 살던 용이 커다란 용틀임을 하면서 승천하자 용이 살았던 바위 속에 샘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한다. 바위산 정상부에 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다.
수수함 속에 화려함 감춘 미황사
 미황사의 대웅보전은 해풍에 씻겨버린 단청의 흔적으로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에 창건됐다. 우리나라 육지의 절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절이다. 절로 들어가는 길이 숲 사이로 나 있을 뿐 절 아래쪽에는 그 흔한 편의시설도 없어 한적한 분위기이다. 한창 번성하던 때에는 스님들도 많았다. 주변에 열두 암자를 거느렸다. 하지만 정유재란 때 대부분의 전각이 불에 타 1598년 다시 지었다. 지금은 대웅보전(보물 제947호)과 응진당(보물 제1183호), 요사채 등 건물 몇 채만이 남아 조촐하다. 숲에 있는 넓은 부도밭과 사적비가 번성했던 옛날을 말해줄 뿐이다.
미황사의 대웅보전은 해풍에 씻겨버린 단청의 흔적으로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년)에 창건됐다. 우리나라 육지의 절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절이다. 절로 들어가는 길이 숲 사이로 나 있을 뿐 절 아래쪽에는 그 흔한 편의시설도 없어 한적한 분위기이다. 한창 번성하던 때에는 스님들도 많았다. 주변에 열두 암자를 거느렸다. 하지만 정유재란 때 대부분의 전각이 불에 타 1598년 다시 지었다. 지금은 대웅보전(보물 제947호)과 응진당(보물 제1183호), 요사채 등 건물 몇 채만이 남아 조촐하다. 숲에 있는 넓은 부도밭과 사적비가 번성했던 옛날을 말해줄 뿐이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미황사는 쇠락한 사찰이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1989년 여러 스님들이 와 전각을 복원하고 증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미황사로 올라가는 길은 동백꽃으로 가득하다. 푸르른 잎들과 발그레한 꽃들이 환영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사천왕문을 지나 자하루 아래를 통과하면 대웅보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웅보전 뒤로 달마산의 기암괴석과 절벽이 호위하듯 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미황사 뒤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달마산이 보인다.미황사 대웅보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웅전과 모습이 다르다. 화려한 단청이 없다. 화장기 없이 수수한 모습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나뭇결이 그대로 다 보인다. 1754년 조선 영조 30년에 마지막으로 수리했다. 그때까진 단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는 일부에 흔적만 남아 있다. 단청은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측면과 함께 나무를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미황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남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미황사 대웅보전은 완도 보길도에서 자란 느티나무를 가져와 지었다. 단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나무 자체가 단단하고 뒤틀림도 적고 잘 썩지 않는다고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해인사 장경판전, 진주향교 등이 느티나무 기둥을 사용한 대표적 건축물들이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소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했다.
미황사 뒤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달마산이 보인다.미황사 대웅보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웅전과 모습이 다르다. 화려한 단청이 없다. 화장기 없이 수수한 모습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나뭇결이 그대로 다 보인다. 1754년 조선 영조 30년에 마지막으로 수리했다. 그때까진 단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현재는 일부에 흔적만 남아 있다. 단청은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적인 측면과 함께 나무를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미황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남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미황사 대웅보전은 완도 보길도에서 자란 느티나무를 가져와 지었다. 단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나무 자체가 단단하고 뒤틀림도 적고 잘 썩지 않는다고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해인사 장경판전, 진주향교 등이 느티나무 기둥을 사용한 대표적 건축물들이다.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소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했다.
단청은 없지만 대신 민낯 그대로 드러난 기둥의 나뭇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약 400년 세월 동안 나뭇결이 빚어낸 추상화 같은 선들의 미학은 대웅보전의 특색이다. 그 결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손끝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마저 든다.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거북, 게 등 다양한 바다생물이 새겨져 있다.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거북, 게 등 다양한 바다생물이 새겨져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둥 아래의 주춧돌이다. 보통 사찰의 주춧돌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미황사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거북, 게 등 바다 생물이 새겨져 있다. 이는 서역에서 경전과 불상을 가득 싣고 온 배에서 미황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배를 상징하는 대웅보전 주춧돌에 바다 생물을 새겼다는 것이다. 대웅보전은 올해 해체·보수 작업이 예정돼 있다. 3, 4년이 걸리는 만큼 대웅보전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면 발걸음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웅보전을 뒤로하고 앞마당 쪽을 바라보면 서해 바다가 눈에 담긴다. 뒤로는 달마산, 앞으로는 바다, 어찌 보면 미황사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은 당연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미황사를 충분히 봤다면 부도전으로 발걸음을 향해도 좋다. 약 700m의 울창한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은 한적하면서도 평화로운 기운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솔암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해남에서도 최고 중 하나다. 해가 넘어갈 때 노을에 비친 달마산과 도솔암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도솔암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해남에서도 최고 중 하나다. 해가 넘어갈 때 노을에 비친 달마산과 도솔암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썰물 때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증도.
썰물 때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증도.
서해 바다를 옆에 끼고 한적함을 느끼고 싶다면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증도와 땅끝 기념탑까지 가는 산책로도 좋다. 썰물 때 송호리 해변에서 증도까지 가는 길이 열린다. 땅끝 기념탑은 노을이 질 때 길게 바다에 비친 석양과 어울려 인상적이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란항에서 어부들이 갓 딴 김을 정리하고 있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란항에서 어부들이 갓 딴 김을 정리하고 있다. 땅끝 기념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땅끝 기념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글·사진 해남=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기암절벽 위에 자리 잡은 도솔암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속세와 거리를 두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기암절벽 위에 자리 잡은 도솔암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 속세와 거리를 두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햇살이 점점 따사로워지기 시작한다. 어디로라도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진다. 그렇다. 봄이 오고 있다. 땅끝마을로 유명한 전남 해남군은 호젓하게 걷기 좋은 곳이 많다. 남쪽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에 자리 잡은 도솔암, 달마산 기암괴석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미황사도 그런 곳이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도솔암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해발 489m)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이어지면서 거대한 수석 같은 느낌을 준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해발 489m)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이어지면서 거대한 수석 같은 느낌을 준다.달마산(해발 489m)이 남쪽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이유는 12km의 능선을 따라 기암괴석과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기 때문이다. 도솔암은 달마산 아래에 있는 미황사에서 능선을 따라 2시간 남짓 걸으면 닿을 수 있다. 산행이 부담된다면 자동차로 갈 수 있다. 능선 부근까지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800m만 걸으면 된다. 길은 평탄한 편이다. 호사스러운 산책이다. 달마산의 빼어난 절경을 한껏 즐길 수 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달마산의 기암괴석 사이로 푸른 서해 바다와 녹색의 논과 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풍경에 취해 있을 즈음 두 개의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암자 하나가 빼꼼히 얼굴을 내민다.

도솔암의 위치는 참 절묘하다. 그 위치에 있으면 완벽하겠다는 상상을 100% 현실로 만족시켜 준다. 두 개의 바위가 커다란 손처럼 암자를 떠받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바다 쪽, 암자 정면으로 수많은 작은 돌이 쌓인 축대가 있다.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인가 하는 묘한 기분에 휩싸인다. 계단 끝에 올라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달마산의 기암괴석과 서해 바다가 풍경화처럼 걸려 있다.
사실 10명이 서면 가득 찰 만큼 자그마한 앞마당과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도솔암의 전부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분위기에 계속 머물고만 싶어진다. 구름이라도 끼인 날이면 도솔암은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 보인다.
도솔암의 역사는 1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신라시대 승려인 의조 화상이 미황사 창건 전 수행하던 암자가 도솔암이었다. 수행에 정진하면서 낙조를 즐겼다고 한다. 실제로 도솔암에서 보는 낙조는 해남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붉게 서쪽 하늘이 물들 때 도솔암과 그 주변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도솔암 자체는 작은 전각과 한 그루의 나무, 작은 마당이 전부다.
도솔암 자체는 작은 전각과 한 그루의 나무, 작은 마당이 전부다.지금의 도솔암은 최근 재건된 것이다. 정유재란(1597∼1598) 때 명량해전에서 패한 왜구들이 달마산으로 도망치다 도솔암을 불태웠다. 이후 400년 가까이 주춧돌과 기왓장만 남은 채 방치됐다. 많은 사람들이 도솔암을 복원하려 했지만 험한 지형 때문에 포기했다. 2002년 오대산 월정사의 법조 스님이 사흘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솔암의 꿈을 꿨다고 한다. 이후 도솔암을 찾아 32일 만에 단청까지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1800장의 기와를 밑에서부터 옮겨온 끝에 이룬 결실이었다.
도솔암 50m 아래에는 용이 살았다는 용샘이 있다. 천년을 살던 용이 커다란 용틀임을 하면서 승천하자 용이 살았던 바위 속에 샘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한다. 바위산 정상부에 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다.
수수함 속에 화려함 감춘 미황사
 미황사의 대웅보전은 해풍에 씻겨버린 단청의 흔적으로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
미황사의 대웅보전은 해풍에 씻겨버린 단청의 흔적으로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30년 전까지만 해도 미황사는 쇠락한 사찰이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1989년 여러 스님들이 와 전각을 복원하고 증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미황사로 올라가는 길은 동백꽃으로 가득하다. 푸르른 잎들과 발그레한 꽃들이 환영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사천왕문을 지나 자하루 아래를 통과하면 대웅보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웅보전 뒤로 달마산의 기암괴석과 절벽이 호위하듯 서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미황사 뒤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달마산이 보인다.
미황사 뒤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달마산이 보인다.단청은 없지만 대신 민낯 그대로 드러난 기둥의 나뭇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약 400년 세월 동안 나뭇결이 빚어낸 추상화 같은 선들의 미학은 대웅보전의 특색이다. 그 결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손끝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마저 든다.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거북, 게 등 다양한 바다생물이 새겨져 있다.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거북, 게 등 다양한 바다생물이 새겨져 있다.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둥 아래의 주춧돌이다. 보통 사찰의 주춧돌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미황사 대웅보전 주춧돌에는 거북, 게 등 바다 생물이 새겨져 있다. 이는 서역에서 경전과 불상을 가득 싣고 온 배에서 미황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배를 상징하는 대웅보전 주춧돌에 바다 생물을 새겼다는 것이다. 대웅보전은 올해 해체·보수 작업이 예정돼 있다. 3, 4년이 걸리는 만큼 대웅보전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면 발걸음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웅보전을 뒤로하고 앞마당 쪽을 바라보면 서해 바다가 눈에 담긴다. 뒤로는 달마산, 앞으로는 바다, 어찌 보면 미황사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은 당연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미황사를 충분히 봤다면 부도전으로 발걸음을 향해도 좋다. 약 700m의 울창한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은 한적하면서도 평화로운 기운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솔암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해남에서도 최고 중 하나다. 해가 넘어갈 때 노을에 비친 달마산과 도솔암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도솔암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해남에서도 최고 중 하나다. 해가 넘어갈 때 노을에 비친 달마산과 도솔암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썰물 때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증도.
썰물 때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증도.서해 바다를 옆에 끼고 한적함을 느끼고 싶다면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증도와 땅끝 기념탑까지 가는 산책로도 좋다. 썰물 때 송호리 해변에서 증도까지 가는 길이 열린다. 땅끝 기념탑은 노을이 질 때 길게 바다에 비친 석양과 어울려 인상적이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란항에서 어부들이 갓 딴 김을 정리하고 있다.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란항에서 어부들이 갓 딴 김을 정리하고 있다. 땅끝 기념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땅끝 기념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글·사진 해남=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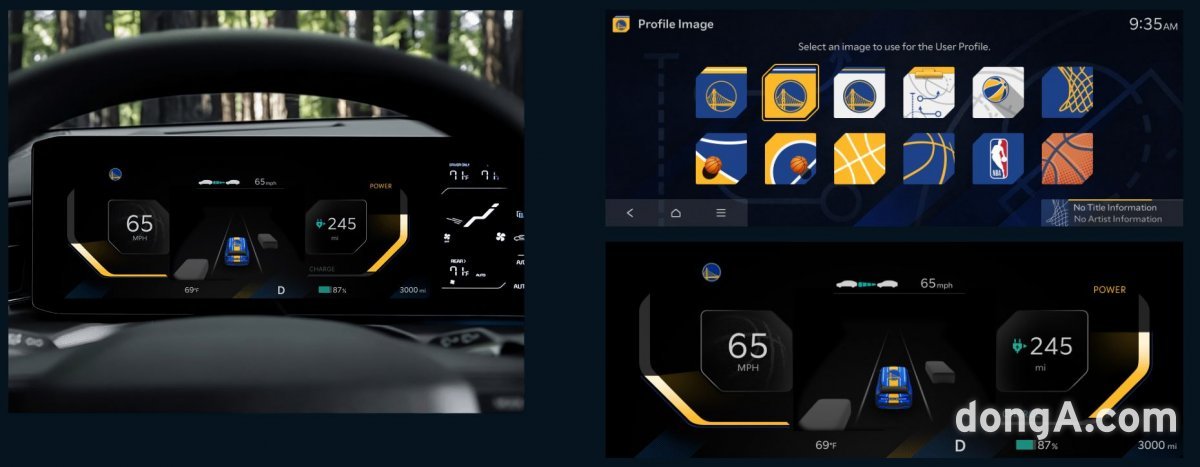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