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말8중 폭염”…‘오보청’ 된 기상청, 이유 있는 속사정
뉴스1
입력 2020-08-06 06:38 수정 2020-08-06 13:52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효된 5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한강이 흙탕물로 변해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효된 5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한강이 흙탕물로 변해 있다. 2020.8.5/뉴스1 © News1 #트럭운전사 A씨는 최근 휴대전화 기상청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고 다른 날씨 앱 두세 개로 대체했다. A씨는 “직업 특성상 기상 예보가 중요한데 기상청의 예보가 틀려도 너무 틀린다”며 “차라리 여러 앱을 두고 비교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잦은 오보로 국민 사이에서는 기상청을 두고 “기우제를 지낸다”는 비아냥까지 나올 만큼 기상청 예보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지구 온난화, 외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 등 기상청의 예보가 현시점에서 무조건 정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상청은 지난 4일 “5일까지 이틀간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500㎜까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닷새간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224㎜에 불과했다.
앞서 기상청은 ‘역대급’ 장마로 기록될 이번 장마를 초반부터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다. 기상청은 지난 5월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기간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상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다. ‘오보청’, ‘구라청’ 등 각종 오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기상청은 시스템적으로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오보’보다는 ‘오차’라고 이해해달라고 항변했다.
최근 오차의 가장 큰 이유로는 먼저 지구온난화를 꼽을 수 있다.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오르면서 변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
기온이 증가하면 수증기의 활동성이 올라가고 하루는 물론 1시간 뒤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또 비구름의 활동성 자체가 높아져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비가 올 확률이 있는 지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퍼붓는 ‘스콜성’ 폭우가 자주 생기는 것도 한반도가 아열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를 하루 전에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비가 오면 그 비가 증발하면서 다시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오차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데이터도 아직 부족하다. 유럽은 수십 년간 독자적 수치 모델을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서야 독자적인 수치 모델을 구축했다.
기상청은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치예보모델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만, 경험과 연구, 데이터의 축적 모두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일각에서 ‘만능키’로 기대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역시 가격이 520억원에 달하지만 애초에 오차가 포함돼 있어 한계가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세계를 지표부터 상층까지를 대략 10㎞ 단위로 잘게 나눠 기상 특성을 입력하고 약 6분 단위로 변화를 계산해내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면서도 “하지만 컴퓨터의 한계로 10㎞보다 더 작게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수치예보모델에 데이터가 쌓이고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 단시간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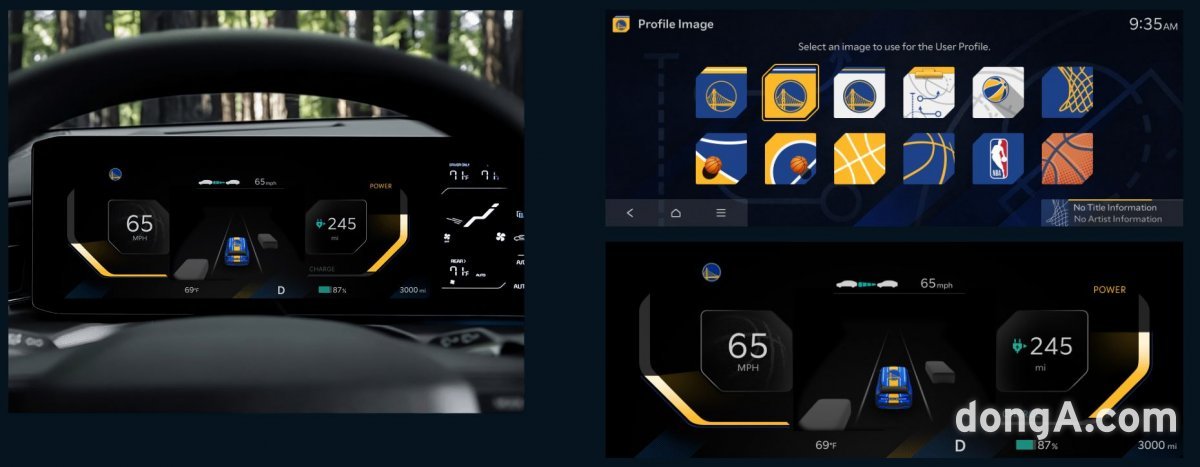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