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6-09 03:00 수정 2021-06-11 11:41
계속하자니 年수백만원 보증료… 중도 포기하자니 과태료 부담

이모 씨(58·여)는 2012년 경기도 원룸 28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평생 모은 월급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다. 당시엔 세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법대로 세금내자’는 생각으로 등록을 결심했다.
현재 은퇴 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그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 제도가 폐지되며 졸지에 ‘28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약 1600만 원(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월 200만 원 남기기도 빠듯한데 건물이 낡아 각종 수리비와 임대보증보험 보증료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답답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세대나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반발이 여전하다.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생계 목적인데 일부만 ‘생계형’으로 구제한다는 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대사업자들은 각종 규제가 신설되며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된다. 매년 보증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고 2000만 원 벌금이나 최고 2년 징역을 피하려면 목돈을 구해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인 강모 씨(58)는 가입 요건을 맞추려고 적금과 보험을 깼다. 그는 “매년 보증료로 300만 원을 더 내면 임대사업은 적자”라며 “당분간 월급으로 메울 수 있지만 은퇴 후가 걱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런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주겠다고 했지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LH의 매입 요건이 까다로워 매입을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임대사업자가 수두룩하다.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매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은 최근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나 임대소득, 공시가격 총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며 “최근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이모 씨(58·여)는 2012년 경기도 원룸 28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평생 모은 월급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다. 당시엔 세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법대로 세금내자’는 생각으로 등록을 결심했다.
현재 은퇴 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그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 제도가 폐지되며 졸지에 ‘28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약 1600만 원(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월 200만 원 남기기도 빠듯한데 건물이 낡아 각종 수리비와 임대보증보험 보증료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답답해했다.
● 보증료 부담에 적자 신세
더불어민주당이 다세대나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반발이 여전하다. 다세대, 다가구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생계 목적인데 일부만 ‘생계형’으로 구제한다는 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대사업자들은 각종 규제가 신설되며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해당된다. 매년 보증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최고 2000만 원 벌금이나 최고 2년 징역을 피하려면 목돈을 구해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세대 임대사업자인 강모 씨(58)는 가입 요건을 맞추려고 적금과 보험을 깼다. 그는 “매년 보증료로 300만 원을 더 내면 임대사업은 적자”라며 “당분간 월급으로 메울 수 있지만 은퇴 후가 걱정”이라고 했다.
● 퇴로 막힌 임대사업자
사업을 중도 포기하기도 힘들다. 의무임대 기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 자진 말소가 아니라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이후 세제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급증한다. 자진 말소를 해도 1년 내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다세대와 다가구 매매가 워낙 뜸하고 수요가 없어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런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주겠다고 했지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LH의 매입 요건이 까다로워 매입을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임대사업자가 수두룩하다.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매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은 최근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나 임대소득, 공시가격 총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며 “최근 불안해진 전월세 시장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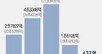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