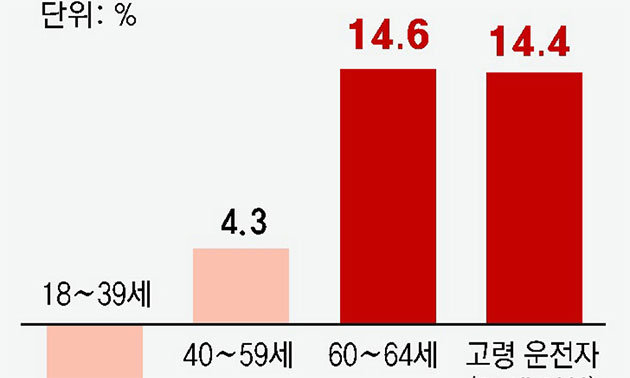아파도 병원 아예 안가고… 택배 오면 “문앞에 두고 가라”
신지환 기자 , 박성민 기자 , 군산=박영민 기자
입력 2020-02-06 03:00 수정 2020-02-06 13: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감염병 공포가 바꾼 일상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주차대에 자전거 여러 대가 놓여 있다(위쪽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며, 시민들은 공유 이동수단 이용을 줄이고 거리에 나서길 피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인적이 끊긴 듯 한산했다. 김재명 base@donga.com·최혁중 기자“이 터치패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이 닿았겠어요.”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주차대에 자전거 여러 대가 놓여 있다(위쪽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며, 시민들은 공유 이동수단 이용을 줄이고 거리에 나서길 피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인적이 끊긴 듯 한산했다. 김재명 base@donga.com·최혁중 기자“이 터치패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이 닿았겠어요.”
5일 오전 10시경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 대학원생 박모 씨(28)는 가게 출입문에 설치한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터치패드를 오른손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조심조심 노크하듯 눌렀다. 터치패드 표면에 다른 사람들의 지문이 많이 묻었다는 생각에 괜스레 움츠러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가 한국 사회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보름이 넘으며, ‘신종 코로나 포비아(공포)’가 일반인의 삶 자체에 스며들었다. 타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무조건 피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길 꺼려하는 이들마저 나타났다.
○ 일상을 바꾼 ‘감염 공포’… 마주치는 게 두려워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직장인들은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다. 사무실을 들어설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던 문화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김영석 씨(41)는 요즘 문에 적힌 ‘당기시오’ 안내만 보면 곤혹스럽다. 신종 코로나 확산 뒤 그는 팔꿈치로만 문을 밀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당기는 문은 어떻게든 손이 닿아 불안하다. 검지 하나로 억지로 열고 들어간다”며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건 엄두도 못 냈다”고 털어놨다.
택배기사와 대면 접촉을 줄이려 ‘현관문 앞에 놔두세요’ 안내문을 붙인 집도 많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연수 씨(23)는 아예 주문 때부터 ‘현관 앞에 두라’는 메시지를 꼭 남긴다. 그는 “택배기사들은 아무래도 사람 접촉이 많지 않으냐. 미안하지만 직접 대면하긴 불편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는 국내 공유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공유 차량을 운영하는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은 이용객이 급감했다. “정기적으로 소독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이용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주말마다 따릉이를 즐겨 이용하던 김민희 씨(25·여)는 지난주부터 사용을 관뒀다. 김 씨는 “다른 사람이 만진 손잡이를 잡는 게 찝찝하다. 당분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포는 일회용품 규제도 뚫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다. 다만 기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다. 장소도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로 한정했다.
○ “병원에서 감염될지도”… 발길 끊는 환자들
병원은 신종 코로나 영향을 온몸으로 맞았다. 5일 서울지역 병원 10여 군데에 문의한 결과, 평균 3분의 1 이상 환자가 빠졌다고 답했다. 중구 B내과의원은 “오전에 평균 50명이 내원하는데 최근 5일간 15명만 왔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형병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정도 줄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8번째 확진자가 선별진료를 받았던 전북 군산의료원엔 예방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바꾸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근심이 크다. 올해 초 심장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는 A 씨는 외래진료 날짜가 다가오자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아동용 마스크조차 낄 수 없는 나이다. 심장질환이라 제때 검사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갈팡질팡한다”고 했다.
어르신들도 병원 가는 걸 망설이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는 조동훈 씨(71)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라 겁이 난다. 처방을 못 받아 며칠째 약을 못 먹었다”고 걱정했다.
신지환 jhshin93@donga.com·박성민 / 군산=박영민 기자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주차대에 자전거 여러 대가 놓여 있다(위쪽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며, 시민들은 공유 이동수단 이용을 줄이고 거리에 나서길 피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인적이 끊긴 듯 한산했다. 김재명 base@donga.com·최혁중 기자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주차대에 자전거 여러 대가 놓여 있다(위쪽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며, 시민들은 공유 이동수단 이용을 줄이고 거리에 나서길 피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인적이 끊긴 듯 한산했다. 김재명 base@donga.com·최혁중 기자5일 오전 10시경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 대학원생 박모 씨(28)는 가게 출입문에 설치한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터치패드를 오른손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조심조심 노크하듯 눌렀다. 터치패드 표면에 다른 사람들의 지문이 많이 묻었다는 생각에 괜스레 움츠러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가 한국 사회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보름이 넘으며, ‘신종 코로나 포비아(공포)’가 일반인의 삶 자체에 스며들었다. 타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무조건 피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길 꺼려하는 이들마저 나타났다.
○ 일상을 바꾼 ‘감염 공포’… 마주치는 게 두려워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직장인들은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다. 사무실을 들어설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던 문화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김영석 씨(41)는 요즘 문에 적힌 ‘당기시오’ 안내만 보면 곤혹스럽다. 신종 코로나 확산 뒤 그는 팔꿈치로만 문을 밀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당기는 문은 어떻게든 손이 닿아 불안하다. 검지 하나로 억지로 열고 들어간다”며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건 엄두도 못 냈다”고 털어놨다.
택배기사와 대면 접촉을 줄이려 ‘현관문 앞에 놔두세요’ 안내문을 붙인 집도 많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연수 씨(23)는 아예 주문 때부터 ‘현관 앞에 두라’는 메시지를 꼭 남긴다. 그는 “택배기사들은 아무래도 사람 접촉이 많지 않으냐. 미안하지만 직접 대면하긴 불편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는 국내 공유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공유 차량을 운영하는 ‘쏘카’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은 이용객이 급감했다. “정기적으로 소독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이용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주말마다 따릉이를 즐겨 이용하던 김민희 씨(25·여)는 지난주부터 사용을 관뒀다. 김 씨는 “다른 사람이 만진 손잡이를 잡는 게 찝찝하다. 당분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포는 일회용품 규제도 뚫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다. 다만 기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다. 장소도 공항·항만·기차역·터미널로 한정했다.
○ “병원에서 감염될지도”… 발길 끊는 환자들
병원은 신종 코로나 영향을 온몸으로 맞았다. 5일 서울지역 병원 10여 군데에 문의한 결과, 평균 3분의 1 이상 환자가 빠졌다고 답했다. 중구 B내과의원은 “오전에 평균 50명이 내원하는데 최근 5일간 15명만 왔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형병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정도 줄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8번째 확진자가 선별진료를 받았던 전북 군산의료원엔 예방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바꾸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근심이 크다. 올해 초 심장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는 A 씨는 외래진료 날짜가 다가오자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아동용 마스크조차 낄 수 없는 나이다. 심장질환이라 제때 검사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갈팡질팡한다”고 했다.
어르신들도 병원 가는 걸 망설이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는 조동훈 씨(71)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라 겁이 난다. 처방을 못 받아 며칠째 약을 못 먹었다”고 걱정했다.
신지환 jhshin93@donga.com·박성민 / 군산=박영민 기자
비즈N 탑기사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60368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