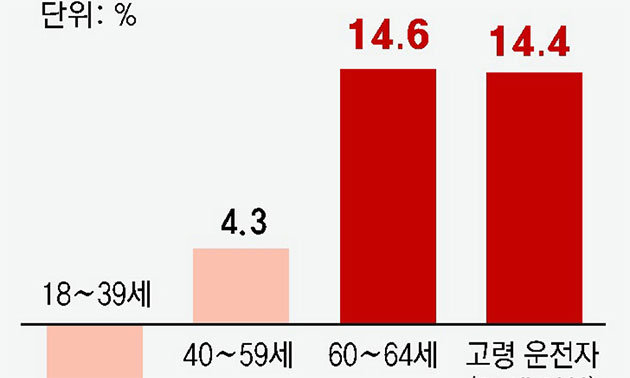‘택시 위기는 정부의 실패’ 달라진 시선…열쇠는 ‘이것’
뉴욕=박용 특파원
입력 2019-11-01 14:52 수정 2019-11-01 14:56
100년 넘은 규제가 변화의 족쇄
모두에 ‘평평한 운동장’이 열쇠
최근 미국에서 ‘택시 위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택시가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회사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데는 택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다.
‘2006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서 택시 머댈리언(면허)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매가 열렸다. 수 백 명이 입찰 가격을 써냈다. 예상보다 높은 호가를 써낸 이도 많았다. 시 당국은 이 경매로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13년 전 시카고 택시면허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당시 시카고 택시 면허를 쓸어간 사람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택시 면허로 재미를 본 이들이 ‘원정 투자’를 온 것이다. 시카고의 택시 면허 절반은 뉴욕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뉴욕에서 재미를 본 것처럼 택시 면허를 헐값에 대거 사들인 뒤에 가난한 이민자 등 택시기사들에게 매각했다. 자본이 없는 택시기사들에게 매입 대금을 거의 전액 대출해주는 ‘고위험 대출’도 등장했다. 대출업자와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일부 도시에서 택시 면허 가격은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고 NYT는 전했다. 당국이 면허 공급을 틀어쥐고 약탈적 대출을 방관하는 사이 시민의 발이 돼야 할 택시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승차공유 회사들이 등장하자 택시 시장이 멀쩡할 리 없었다. 택시 ‘면허 거품’은 급격히 빠졌다. 뒤늦게 거액을 주고 ‘거품 면허’를 산 택시기사들은 재무적 고통으로 신음했다. 신기술의 책임이 있다면 규제와 투기로 왜곡된 시장에서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다.
택시가 처음 등장한 건 100여 년 전이었다. 적절한 운행 대수와 요금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없을 때였다. 불가피하게 정부가 택시 수요를 추정하고 운행대수와 요금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수단을 찾는 시민과 이동수단을 제공할 기사를 실시간 연결해주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생겼다. 그런데도 100년도 넘은 계획경제식 택시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택시 위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뉴욕에서 우버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택시 구경하기 힘든 도심 외곽의 ‘교통 사각지대’ 주민이었다.
택시는 운행대수, 요금 등 낡은 규제의 옷을 입고 거북이걸음을 하는데 후발주자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뜀뛰기를 한다. 적수가 될 리 없다. 택시들도 신기술을 도입했으나 그닥 성공적이진 않았다. 요금이 묶인 상황에서 손님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신기술만 도입하면 돈 되는 손님만 골라 태우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긴다.
뉴욕시는 택시위기가 악화되자 지난해 8월 승차공유 회사 면허를 제한하는 새 규제를 들고 나왔다. 한쪽에선 정부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포장하고,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적반하장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대신 서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부터 마련해줬다면 택시에 승산이 전혀 없을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관록의 택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택시는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까지 잡아 태울 수 있으니 앱에 의존하는 승차공유 회사들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뉴욕 택시 기사들이 진입장벽보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얼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때는 진입장벽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린 건가.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기는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모두에 ‘평평한 운동장’이 열쇠
최근 미국에서 ‘택시 위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택시가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회사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데는 택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다.
‘2006년 가을 미국 시카고에서 택시 머댈리언(면허)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매가 열렸다. 수 백 명이 입찰 가격을 써냈다. 예상보다 높은 호가를 써낸 이도 많았다. 시 당국은 이 경매로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13년 전 시카고 택시면허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당시 시카고 택시 면허를 쓸어간 사람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택시 면허로 재미를 본 이들이 ‘원정 투자’를 온 것이다. 시카고의 택시 면허 절반은 뉴욕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뉴욕에서 재미를 본 것처럼 택시 면허를 헐값에 대거 사들인 뒤에 가난한 이민자 등 택시기사들에게 매각했다. 자본이 없는 택시기사들에게 매입 대금을 거의 전액 대출해주는 ‘고위험 대출’도 등장했다. 대출업자와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일부 도시에서 택시 면허 가격은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고 NYT는 전했다. 당국이 면허 공급을 틀어쥐고 약탈적 대출을 방관하는 사이 시민의 발이 돼야 할 택시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승차공유 회사들이 등장하자 택시 시장이 멀쩡할 리 없었다. 택시 ‘면허 거품’은 급격히 빠졌다. 뒤늦게 거액을 주고 ‘거품 면허’를 산 택시기사들은 재무적 고통으로 신음했다. 신기술의 책임이 있다면 규제와 투기로 왜곡된 시장에서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다.
택시가 처음 등장한 건 100여 년 전이었다. 적절한 운행 대수와 요금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없을 때였다. 불가피하게 정부가 택시 수요를 추정하고 운행대수와 요금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수단을 찾는 시민과 이동수단을 제공할 기사를 실시간 연결해주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생겼다. 그런데도 100년도 넘은 계획경제식 택시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택시 위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뉴욕에서 우버를 가장 반긴 사람들은 택시 구경하기 힘든 도심 외곽의 ‘교통 사각지대’ 주민이었다.
택시는 운행대수, 요금 등 낡은 규제의 옷을 입고 거북이걸음을 하는데 후발주자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뜀뛰기를 한다. 적수가 될 리 없다. 택시들도 신기술을 도입했으나 그닥 성공적이진 않았다. 요금이 묶인 상황에서 손님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신기술만 도입하면 돈 되는 손님만 골라 태우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생긴다.
뉴욕시는 택시위기가 악화되자 지난해 8월 승차공유 회사 면허를 제한하는 새 규제를 들고 나왔다. 한쪽에선 정부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포장하고,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적반하장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대신 서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부터 마련해줬다면 택시에 승산이 전혀 없을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관록의 택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택시는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까지 잡아 태울 수 있으니 앱에 의존하는 승차공유 회사들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뉴욕 택시 기사들이 진입장벽보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얼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때는 진입장벽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린 건가.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기는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비즈N 탑기사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60368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