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치매 완화법’으로 주목… 獨드레스덴 알렉사 요양원 가보니
드레스덴=위은지 기자
입력 2019-08-31 03:00 수정 2019-08-31 03:00
[‘스마트 시니어’ 시대]
옛 물건 가득한 ‘기억의 방’에선 불안증 줄고 대화의 문 열려
6월 말 찾은 독일 동부 드레스덴 요양원 ‘알렉사’. ‘기억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 한쪽 벽장엔 옛 동독의 자랑이던 흰 도자기 그릇과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 등이 장식돼 있었다. 오전 8시경 노인 8명이 이 방으로 ‘출근’했다. 이들은 방 한가운데 사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 빈티지 라디오에서 1960년대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건지 아세요?” 요양원장인 군터 볼프람 씨(51)가 노란색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들고 오자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버터를 바른 빵을 넣고 다녔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나도 저것과 똑같이 생긴 철 도시락통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입을 열자 볼프람 씨는 “맞다. 철 도시락통도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노인 약 250명이 사는 알렉사 요양원은 치료를 위한 ‘기억의 방’ 3곳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방에는 노인들이 청춘 시절이던 1960, 70년대 옛 동독 시절의 물건이 가득하다. 볼프람 씨는 “옛날에 자신들이 많이 썼던 물건을 접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건은 골동품 시장에서 사거나 드레스덴 동독박물관에서 일정 기간 빌린다. “옛날 화로를 구해 갖다놨어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젊은 직원들에게 화로 사용법을 설명해주더군요.”
볼프람 씨가 ‘기억의 방’을 생각해 낸 건 2014년이었다. 그는 “2007년 이 요양원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땐 일상 보조만 해주면 됐지만 갈수록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돌봄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떠올린 건 영화관이었다. 노인들에게 젊은 시절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어 1960, 70년대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특별한 소품’을 구해왔다. 1960년대 초 동독에서 유행하던 오토바이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찾아낸 것. 그는 “1000유로(약 130만 원)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영화관 구석에 전시했는데, 영화보다 오토바이가 더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억을 잃은 듯했던 노인들이 오토바이 앞에 모여서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젊을 때 여자친구랑 함께 탔었지’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볼프람 씨는 “중증 이상 치매노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옛 물건을 더 구해왔고, 노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의 방은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며 요양원을 벗어나려는 노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 직원들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들을 마치 회사에 출근시키듯 아침마다 기억의 방으로 데려온다. 이 방에서 노인들은 과거 이웃과 함께했던 잼 만들기를 하거나, 옛 동독 지폐로 물건을 사는 활동을 한다. 볼프람 씨는 “불안 행동을 보였던 노인의 증상이 완화돼 더 이상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졌다”며 “노인들도 이 방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지속적으로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옛 물건 가득한 ‘기억의 방’에선 불안증 줄고 대화의 문 열려
6월 말 찾은 독일 동부 드레스덴 요양원 ‘알렉사’. ‘기억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 한쪽 벽장엔 옛 동독의 자랑이던 흰 도자기 그릇과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 등이 장식돼 있었다. 오전 8시경 노인 8명이 이 방으로 ‘출근’했다. 이들은 방 한가운데 사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모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 빈티지 라디오에서 1960년대 방송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건지 아세요?” 요양원장인 군터 볼프람 씨(51)가 노란색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들고 오자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버터를 바른 빵을 넣고 다녔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나도 저것과 똑같이 생긴 철 도시락통이 있었는데.” 노인들이 입을 열자 볼프람 씨는 “맞다. 철 도시락통도 있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노인 약 250명이 사는 알렉사 요양원은 치료를 위한 ‘기억의 방’ 3곳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방에는 노인들이 청춘 시절이던 1960, 70년대 옛 동독 시절의 물건이 가득하다. 볼프람 씨는 “옛날에 자신들이 많이 썼던 물건을 접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건은 골동품 시장에서 사거나 드레스덴 동독박물관에서 일정 기간 빌린다. “옛날 화로를 구해 갖다놨어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젊은 직원들에게 화로 사용법을 설명해주더군요.”
볼프람 씨가 ‘기억의 방’을 생각해 낸 건 2014년이었다. 그는 “2007년 이 요양원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땐 일상 보조만 해주면 됐지만 갈수록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돌봄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떠올린 건 영화관이었다. 노인들에게 젊은 시절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싶어 1960, 70년대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특별한 소품’을 구해왔다. 1960년대 초 동독에서 유행하던 오토바이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찾아낸 것. 그는 “1000유로(약 130만 원)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영화관 구석에 전시했는데, 영화보다 오토바이가 더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억을 잃은 듯했던 노인들이 오토바이 앞에 모여서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젊을 때 여자친구랑 함께 탔었지’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볼프람 씨는 “중증 이상 치매노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옛 물건을 더 구해왔고, 노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의 방은 출근해야 한다거나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며 요양원을 벗어나려는 노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 직원들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들을 마치 회사에 출근시키듯 아침마다 기억의 방으로 데려온다. 이 방에서 노인들은 과거 이웃과 함께했던 잼 만들기를 하거나, 옛 동독 지폐로 물건을 사는 활동을 한다. 볼프람 씨는 “불안 행동을 보였던 노인의 증상이 완화돼 더 이상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졌다”며 “노인들도 이 방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지속적으로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억의 방은 현지 언론에서 ‘획기적인 치매 완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함부르크 등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 등 해외에도 비슷한 시설이 생겼다. 하지만 ‘동독 사회주의를 미화한다’는 정치 논란도 일었다. 그는 “정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배제했다”며 “로큰롤처럼 노인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만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레스덴=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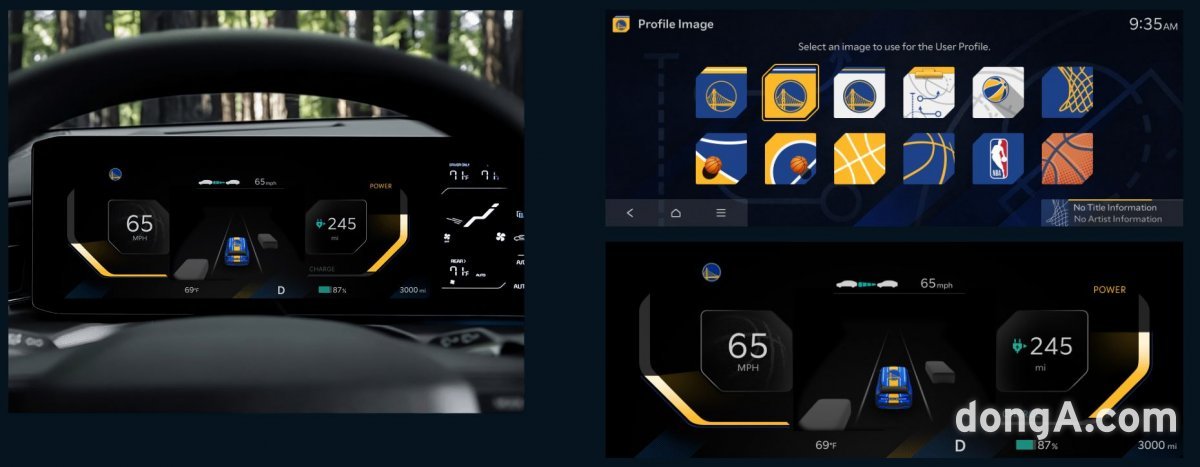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