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피폭당한 진실의 외침
이서현 기자
입력 2019-08-23 03:00 수정 2019-08-23 03:00
美 HBO 5부작 ‘체르노빌’, ‘왓챠플레이’ 통해 국내 첫 공개
 미니시리즈 ‘체르노빌’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재현해 냈다. 시청자들은 실화가 가진 힘만으로 인류 최악의 재앙이 남긴 공포와 마주할 수 있다. HBO 홈페이지“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What is the cost of lies).”
미니시리즈 ‘체르노빌’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재현해 냈다. 시청자들은 실화가 가진 힘만으로 인류 최악의 재앙이 남긴 공포와 마주할 수 있다. HBO 홈페이지“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What is the cost of lies).”
미국 HBO의 5부작 미니시리즈 ‘체르노빌’ 첫 대사는 시리즈 전체를 넘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관통한다. 1986년 4월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이 드라마는 올해 5월 HBO가 방영한 뒤 제71회 에미상 19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4일 스트리밍사이트 ‘왓챠플레이’가 독점 공개했다. 시청자들은 “인류 최악의 재난은 언제나 진실이 거짓에 피폭될 때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무서운 드라마는 처음”이란 반응. 공개 일주일 만에 벌써 1000여 개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고를, 그것도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건조한 방식으로 다룬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러시아 미사일 엔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노출 등은 체르노빌이 인류에게 학습시킨 공포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
작가 크레이그 메이진은 이 작품의 각본을 쓰기 위해 집요한 취재 과정을 거쳤다. 재난에 흔히 등장하는 신파와 눈물을 지우고, 있는 그대로 과거를 보여주는 편을 택했다. 메이진은 수년 동안 관련 서적과 소련의 각종 정부 문서를 수집하는 한편, 핵물리학자들도 인터뷰해 우리 세대가 어떻게 이 사고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파악했다. 극 중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하는 발레리 레가소프(재러드 해리스)와 보리스 셰르비나(스텔란 스카르스고르드) 등은 대부분 실존 인물들. 외모와 옷차림, 무채색의 소련 풍경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
거짓의 대가는 결국 ‘사람’이다.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말에 죽음을 무릅쓰고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 밸브를 잠그겠다며 자원한 인부들, 터널을 파는 광부들이 그렇다. 그 대척점에는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소련 관료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차례 재난을 겪으며 목격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작품의 백미는 첨단 기계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원자로 지붕 위에 남은 흑연 잔해를 치우기 위해 ‘바이오 로봇’, 즉 인간을 투입하는 장면이다. 방사능 피폭 허용치를 정확히 계산해 한 명당 90초로 제한한 작업시간, 단 하나의 흑연 조각이라도 치우기 위해 묵묵히 지붕 위로 오르는 그들의 모습 뒤로 웅장한 음악 대신 숨을 조여 오는 기계음이 깔린다.
강아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 체르노빌에는 ‘우리의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이란 소련 공산당의 공허한 현수막만이 남아 있다. 드라마는 처음과 같은 마지막 대사로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미니시리즈 ‘체르노빌’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재현해 냈다. 시청자들은 실화가 가진 힘만으로 인류 최악의 재앙이 남긴 공포와 마주할 수 있다. HBO 홈페이지
미니시리즈 ‘체르노빌’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정도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재현해 냈다. 시청자들은 실화가 가진 힘만으로 인류 최악의 재앙이 남긴 공포와 마주할 수 있다. HBO 홈페이지미국 HBO의 5부작 미니시리즈 ‘체르노빌’ 첫 대사는 시리즈 전체를 넘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관통한다. 1986년 4월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이 드라마는 올해 5월 HBO가 방영한 뒤 제71회 에미상 19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4일 스트리밍사이트 ‘왓챠플레이’가 독점 공개했다. 시청자들은 “인류 최악의 재난은 언제나 진실이 거짓에 피폭될 때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무서운 드라마는 처음”이란 반응. 공개 일주일 만에 벌써 1000여 개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고를, 그것도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건조한 방식으로 다룬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러시아 미사일 엔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노출 등은 체르노빌이 인류에게 학습시킨 공포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
작가 크레이그 메이진은 이 작품의 각본을 쓰기 위해 집요한 취재 과정을 거쳤다. 재난에 흔히 등장하는 신파와 눈물을 지우고, 있는 그대로 과거를 보여주는 편을 택했다. 메이진은 수년 동안 관련 서적과 소련의 각종 정부 문서를 수집하는 한편, 핵물리학자들도 인터뷰해 우리 세대가 어떻게 이 사고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파악했다. 극 중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하는 발레리 레가소프(재러드 해리스)와 보리스 셰르비나(스텔란 스카르스고르드) 등은 대부분 실존 인물들. 외모와 옷차림, 무채색의 소련 풍경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
거짓의 대가는 결국 ‘사람’이다.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말에 죽음을 무릅쓰고 원자로 안으로 들어가 밸브를 잠그겠다며 자원한 인부들, 터널을 파는 광부들이 그렇다. 그 대척점에는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소련 관료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차례 재난을 겪으며 목격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작품의 백미는 첨단 기계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원자로 지붕 위에 남은 흑연 잔해를 치우기 위해 ‘바이오 로봇’, 즉 인간을 투입하는 장면이다. 방사능 피폭 허용치를 정확히 계산해 한 명당 90초로 제한한 작업시간, 단 하나의 흑연 조각이라도 치우기 위해 묵묵히 지붕 위로 오르는 그들의 모습 뒤로 웅장한 음악 대신 숨을 조여 오는 기계음이 깔린다.
강아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 체르노빌에는 ‘우리의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이란 소련 공산당의 공허한 현수막만이 남아 있다. 드라마는 처음과 같은 마지막 대사로 다시 인류에게 묻는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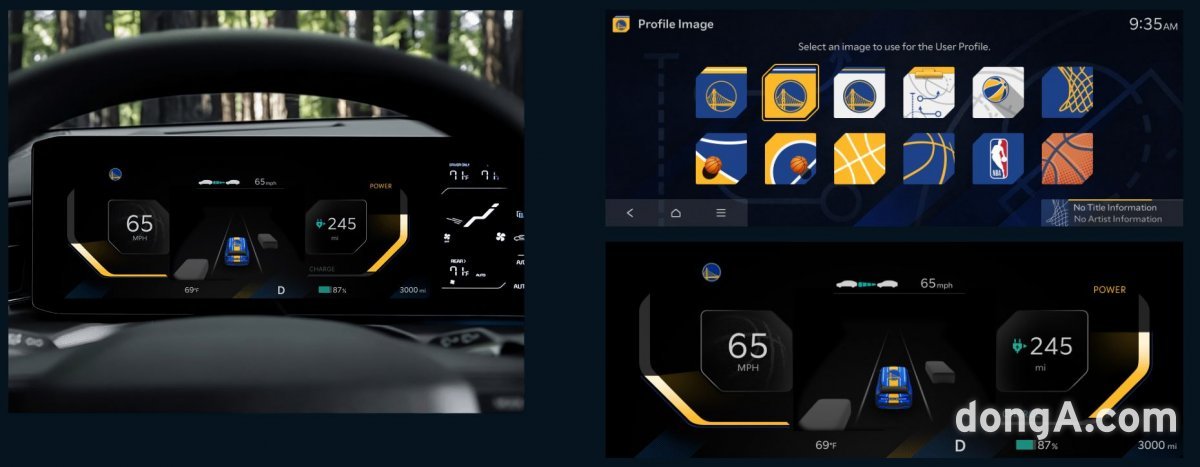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