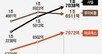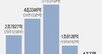양대 노총 건설현장 ‘밥그릇 싸움’… 공사 멈춰 고스란히 업계 피해로
송혜미 기자
입력 2019-04-30 03:00 수정 2019-04-30 03:00
“우리 조합원 더 고용” 맞시위 충돌… 건설경기 침체에 일감 줄자 압박
정부는 “개입 어렵다” 뒷짐만
이달 9일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새벽부터 맞불 시위를 벌였다. 먼저 머리띠를 두른 건 한국노총이다. 시공업체 측이 한국노총보다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 측도 물러서지 않고 시위에 가세하면서 이날 공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더욱이 이날 집회는 단순 시위로 끝나지 않았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나 환경 보호 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공사현장의 법규 위반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는 시공업체 ‘압박 전략’이었다.
건설 일자리를 둘러싼 양대 노총의 ‘밥그릇 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몽니’를 근절해야 할 정부는 양대 노총의 눈치만 살피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집회를 ‘생존권 투쟁’이라고 부른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는 곳이 많아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6개월가량 진행하는 공사가 끝나면 다음 현장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새로 생기는 건설현장을 놓치면 생존권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민노총에) 일자리를 다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생존권 투쟁’은 역설적으로 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시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17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에서는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12시간 동안 대치하며 정면충돌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총의 집회는 서울에서만 26일 12건, 29일 9건에 이른다.
양대 노총 간 밥그릇 싸움의 근본 이유로는 건설경기 침체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1, 2월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3월은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 일자리가 작년보다 약 12만 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자리가 많을 때는 (노조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 않았다”며 “일감이 줄어드니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 문제가 있다며 꼬투리를 잡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현장 점거에 나서면 대책이 없다”며 “이런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도 없고, 일일이 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입 어렵다” 뒷짐만
이달 9일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새벽부터 맞불 시위를 벌였다. 먼저 머리띠를 두른 건 한국노총이다. 시공업체 측이 한국노총보다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 측도 물러서지 않고 시위에 가세하면서 이날 공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더욱이 이날 집회는 단순 시위로 끝나지 않았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은 카메라를 들고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나 환경 보호 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공사현장의 법규 위반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는 시공업체 ‘압박 전략’이었다.
건설 일자리를 둘러싼 양대 노총의 ‘밥그릇 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몽니’를 근절해야 할 정부는 양대 노총의 눈치만 살피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건설현장 집회를 ‘생존권 투쟁’이라고 부른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는 곳이 많아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6개월가량 진행하는 공사가 끝나면 다음 현장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새로 생기는 건설현장을 놓치면 생존권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민노총에) 일자리를 다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생존권 투쟁’은 역설적으로 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시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17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재건축 현장에서는 양대 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12시간 동안 대치하며 정면충돌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총의 집회는 서울에서만 26일 12건, 29일 9건에 이른다.
양대 노총 간 밥그릇 싸움의 근본 이유로는 건설경기 침체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1, 2월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3월은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 일자리가 작년보다 약 12만 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자리가 많을 때는 (노조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 않았다”며 “일감이 줄어드니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가 현장에 문제가 있다며 꼬투리를 잡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현장 점거에 나서면 대책이 없다”며 “이런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도 없고, 일일이 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특정 노총 소속만 고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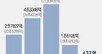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