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악”vs“인간의 이기”…뜨거운 감자 ‘동물 실험’
스포츠동아
입력 2017-06-30 05:45 수정 2017-06-30 05:45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실험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학·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
동물보호단체 “공유 질병 1%대 불과”
실험 대체방안·규제강화엔 한목소리
동물보호단체 “공유 질병 1%대 불과”
실험 대체방안·규제강화엔 한목소리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의학·생물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살아있는 동물에게 새로운 의약품이나 제품 등을 임상 시험하는 동물 실험은 지난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의학은 물론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원전 5세기 개의 눈을 해부해 시신경을 발견한 것이 기록상의 동물 실험 시초로 1881년 화학자 루이스 파스퇴르가 양에 탄저균 백신을 접종해 탄저균과 백신 연구에 성과를 이뤘다. 또 1921년에는 밴팅이라는 의학자가 동물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최초로 발견했다.
동물 실험이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사람들은 동물 실험이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 실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사람을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람이 가진 질병 3만 가지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질병은 350여 가지(1.16%)에 불과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사람의 임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입덧치료제 탈리도마이드 약이 동물 실험에 성공했으나 1950년대 후반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50여 개국에 판매됐을 때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팔과 다리가 짧은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나 판매가 중지된 사례가 있었다. 또 1976년 일본에서 지사제인 클리오퀴놀을 동물 실험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으나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러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 피부 혹은 줄기세포로부터 배양된 작은 생체기관 ‘오르가노이드(Organoid)’를 사용해 화장품이나 약품에 대한 장기 반응을 실험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방안이 아니다. 세포실험의 경우 세포는 세포만의 특성을 유지하는 셀라인(cell line)을 가지고 있어 오차 반응 범위가 작지만 사람과 동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개체차가 높다. 그러므로 다양한 개체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많은 개체 수와 반복적인 동물 실험으로 표준화된 수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실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Replacement),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Reduction),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하는(Refinement) ‘3R 동물실험원칙’을 목적으로 실험동물의 복지·윤리적 지침들을 법률을 규정해 동물실험을 규제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국가에서 관리해 입양될 수 있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번식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담희 객원기자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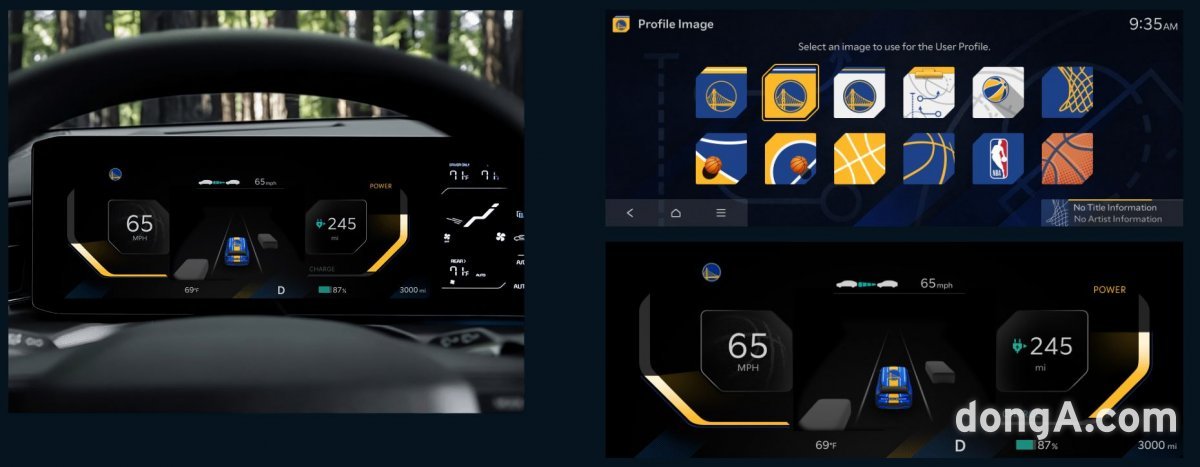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