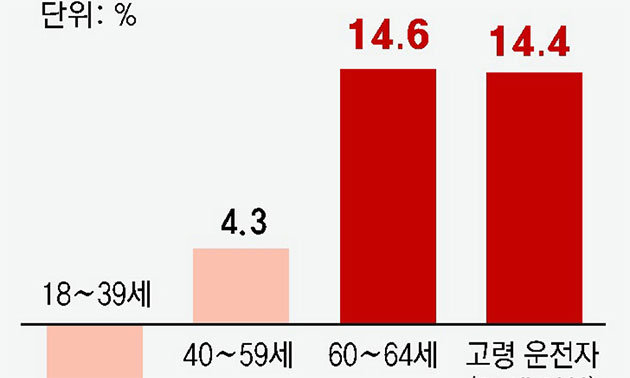루이뷔통-샤넬 등 글로벌 명품들의 ‘서울 사랑’
김현수 기자
입력 2017-06-27 03:00 수정 2017-06-27 03:00
“亞트렌드의 중심” 전시회 잇따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루이뷔통의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회(위쪽 사진)와 샤넬의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단골’ 미술관이 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디뮤지엄에서 각각 무료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각 업체
제공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루이뷔통의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회(위쪽 사진)와 샤넬의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단골’ 미술관이 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디뮤지엄에서 각각 무료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각 업체
제공
“안녕하세요, 저는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21일 서울 용산구 디뮤지엄 입구 앞 스피커에는 샤넬 여사의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인사말이 흘러나왔다. 샤넬 여사는 20세기 여성 패션에 혁신을 가져온 디자이너이자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 샤넬의 ‘영감의 원천’이다. 이날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샤넬이 마련한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의 사전 행사가 열렸다.
마드모아젤 프리베는 영국 런던의 사치갤러리에 이어 서울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브루노 파블로브스키 패션부문 사장, 프레데릭 그랑지에 시계 및 파인 주얼리 사장 등도 방한했다. 프랑스, 영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해외 언론인도 몰려 취재 열기를 더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서울행이 잦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글로벌 전시회를 열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샤넬뿐 아니라 루이뷔통, 카르티에도 있다. 샤넬의 전시회가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고, 루이뷔통의 전시회가 다음 달 27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선을 보인다. 또 카르티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이 8월 1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는 끊임없이 예술과의 접점을 찾으며 브랜드의 스토리를 고객에게 알리는 전시회를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하나의 전시를 글로벌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고객과 만난다. 한 명품업계 관계자는 “개최지를 선정할 때 서울이 늘 주요 후보지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루이뷔통이 이달 초부터 DDP에서 전시를 시작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회는 2015년 프랑스 파리, 지난해 일본 도쿄를 거처 서울에 왔다. 루이뷔통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160여 년의 브랜드 유산을 총망라한 이 전시는 1993년 루이비통 코리아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다.
카르티에가 운영하는 미술재단인 카르티에 현대미술재단의 하이라이트전은 재단의 소장품을 프랑스 밖으로 처음 가져왔다. 지난해 에르메스가 디뮤지엄에서 연 ‘원더랜드, 파리지앵의 산책’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서울에 상륙했다.
서울이 글로벌 명품 업계의 화제의 도시로 떠오른 것은 2010년대 이후다. 아시아에서는 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에 밀렸었다. 하지만 2012년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휩쓸고 서울이 아시아의 트렌드 중심이 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뉴욕타임스 등이 서울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도시로 꼽았고, 주요 휴양지나 관광지에서 크루즈 컬렉션을 열던 샤넬이 2015년 서울을 택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크리스틴 스튜어트, 틸다 스윈턴 등 영화배우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유명인이 서울에 왔다.
세계적인 럭셔리 업체들이 서울에서 잇따라 큰 행사를 여는 데는 한국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활발해 ‘온라인 입소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로 빠르게 행사 소식이 알려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샤넬의 전시 개장 행사에 가수 지드래곤이 공연하자 다음 날 SNS는 온통 전시회와 공연 이야기였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소비자의 명품 선호도가 높고, 관계 지향적이라 어느 곳보다 모바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이슈 확산이 빠르다. 이런 점이 서울에 글로벌 행사가 몰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루이뷔통의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회(위쪽 사진)와 샤넬의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단골’ 미술관이 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디뮤지엄에서 각각 무료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각 업체
제공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루이뷔통의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회(위쪽 사진)와 샤넬의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회.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단골’ 미술관이 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디뮤지엄에서 각각 무료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각 업체
제공“안녕하세요, 저는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21일 서울 용산구 디뮤지엄 입구 앞 스피커에는 샤넬 여사의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인사말이 흘러나왔다. 샤넬 여사는 20세기 여성 패션에 혁신을 가져온 디자이너이자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 샤넬의 ‘영감의 원천’이다. 이날 그 기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샤넬이 마련한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의 사전 행사가 열렸다.
마드모아젤 프리베는 영국 런던의 사치갤러리에 이어 서울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브루노 파블로브스키 패션부문 사장, 프레데릭 그랑지에 시계 및 파인 주얼리 사장 등도 방한했다. 프랑스, 영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해외 언론인도 몰려 취재 열기를 더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서울행이 잦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글로벌 전시회를 열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샤넬뿐 아니라 루이뷔통, 카르티에도 있다. 샤넬의 전시회가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고, 루이뷔통의 전시회가 다음 달 27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선을 보인다. 또 카르티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이 8월 1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는 끊임없이 예술과의 접점을 찾으며 브랜드의 스토리를 고객에게 알리는 전시회를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하나의 전시를 글로벌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고객과 만난다. 한 명품업계 관계자는 “개최지를 선정할 때 서울이 늘 주요 후보지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루이뷔통이 이달 초부터 DDP에서 전시를 시작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회는 2015년 프랑스 파리, 지난해 일본 도쿄를 거처 서울에 왔다. 루이뷔통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160여 년의 브랜드 유산을 총망라한 이 전시는 1993년 루이비통 코리아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다.
카르티에가 운영하는 미술재단인 카르티에 현대미술재단의 하이라이트전은 재단의 소장품을 프랑스 밖으로 처음 가져왔다. 지난해 에르메스가 디뮤지엄에서 연 ‘원더랜드, 파리지앵의 산책’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서울에 상륙했다.
서울이 글로벌 명품 업계의 화제의 도시로 떠오른 것은 2010년대 이후다. 아시아에서는 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에 밀렸었다. 하지만 2012년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휩쓸고 서울이 아시아의 트렌드 중심이 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뉴욕타임스 등이 서울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도시로 꼽았고, 주요 휴양지나 관광지에서 크루즈 컬렉션을 열던 샤넬이 2015년 서울을 택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크리스틴 스튜어트, 틸다 스윈턴 등 영화배우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유명인이 서울에 왔다.
세계적인 럭셔리 업체들이 서울에서 잇따라 큰 행사를 여는 데는 한국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활발해 ‘온라인 입소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로 빠르게 행사 소식이 알려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샤넬의 전시 개장 행사에 가수 지드래곤이 공연하자 다음 날 SNS는 온통 전시회와 공연 이야기였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소비자의 명품 선호도가 높고, 관계 지향적이라 어느 곳보다 모바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이슈 확산이 빠르다. 이런 점이 서울에 글로벌 행사가 몰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비즈N 탑기사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60368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