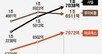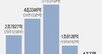[리뷰] “음악에 향수 뿌렸니?” 라디오프랑스필과 손열음
양형모 기자
입력 2017-05-29 17:25 수정 2017-05-29 22:55

정신이 아득해질 듯한 향기였다. 누군가 1톤쯤 되는 향수를 공연장 안에 들이부어 놓은 것 같았다.
5월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코 프랑크 음악감독이 이끄는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다. 이미 수차례 내한공연으로 국내에도 상당한 팬층을 거느린 오케스트라다.

프랑스국립오케스트라, 파리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프랑스필은 과연 프랑스적인 감성과 우아함으로 덧칠된 멋진 소리를 들려주었다.
첫 곡은 얀 시벨리우스의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중 ‘녹턴’. 시벨리우스가 아돌프 파울의 희곡 ‘크리스티안 2세’를 위해 극 부수음악으로 작곡했다.
녹턴으로 가볍게 몸을 푼 라디오프랑스필은 이내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무대 위로 끌어 올렸다. 조지 거슈윈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가 두 번째 레퍼토리였다.
거슈윈의 작품답게 재즈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심지어 2악장은 서정적인 녹턴 풍의 블루스로 구성됐다. 이 작품은 피겨 스케이팅 스타 김연아와 인연이 있다. 2009~2010년 프리 프로그램에서 조지 거슈윈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를 들을 수 있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도 등장했다.
재즈를 바탕으로 뉴욕의 분위기를 위트있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손열음의 연주다. 의외로 손열음의 연주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위트와 웃음이 절제됐다. 굳은 얼굴의 조크다.
손열음은 누가 뭐래도 화려한 기교를 소유한 연주자다. 하지만 기교를 앞세운 다른 연주자들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으니 바로 ‘기교의 온도’다. 기교가 승하면 소리가 차가워지기 쉽다. 하지만 손열음의 소리는 적당한 온기를 품고 있다. 셔츠를 벗어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추 두 개쯤 풀고 싶은 온도다. 손열음은 ‘따뜻한 기교’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의 연주는 오히려 지극히 손열음다운 연주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좀 더 호방하게 웃어도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손열음은 중간 중간 하얀 이를 드러내 보여줄 뿐이었다.
덕분에 거슈윈의 협주곡은 상당히 도시적인 음악으로 들렸다. 세련된 음악적 아이디어로 가득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작품을 잘못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2부는 프랑스 작곡가인 모리스 라벨의 작품 두 개로 꾸며졌다. ‘어미거위 모음곡’과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모두 인기있는 작품들이다.

미코 프랑크의 지휘는 굉장히 특이했다. 음악적 해석 얘기가 아니다. 지휘하는 모습이 시종 눈길을 끌었다. 비교적 단신인 미코 프랑크는 조금 과장하자면 한 번도 포디엄 위에 오르지 않았다. 포디엄 아래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지휘를 하는가 하면 벌떡 일어나 포디엄 주위를 돌아다니며 지휘봉을 휘둘렀다.
악장 코앞에서 지휘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금관을 향해 팔을 크게 휘두른다. 지휘를 하다 자주 몸을 뒤트는 덕에 관객들은 ‘심지어’ 지휘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도 왕왕 생겼다.
어딘지 ‘찌르는 한 방’의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이날 라디오프랑스필은 ‘프랑스에 의한’, ‘프랑스적인’, ‘프랑스다운’ 음악을 관객에게 충분 이상으로 선사해 주었다. 공연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귀와 코에서 프랑스가 떠나지 않았다.
손을 들어 소매에 코를 대고 킁킁거려 보았다. 소매에서 고소한 바게트의 냄새가 났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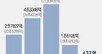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