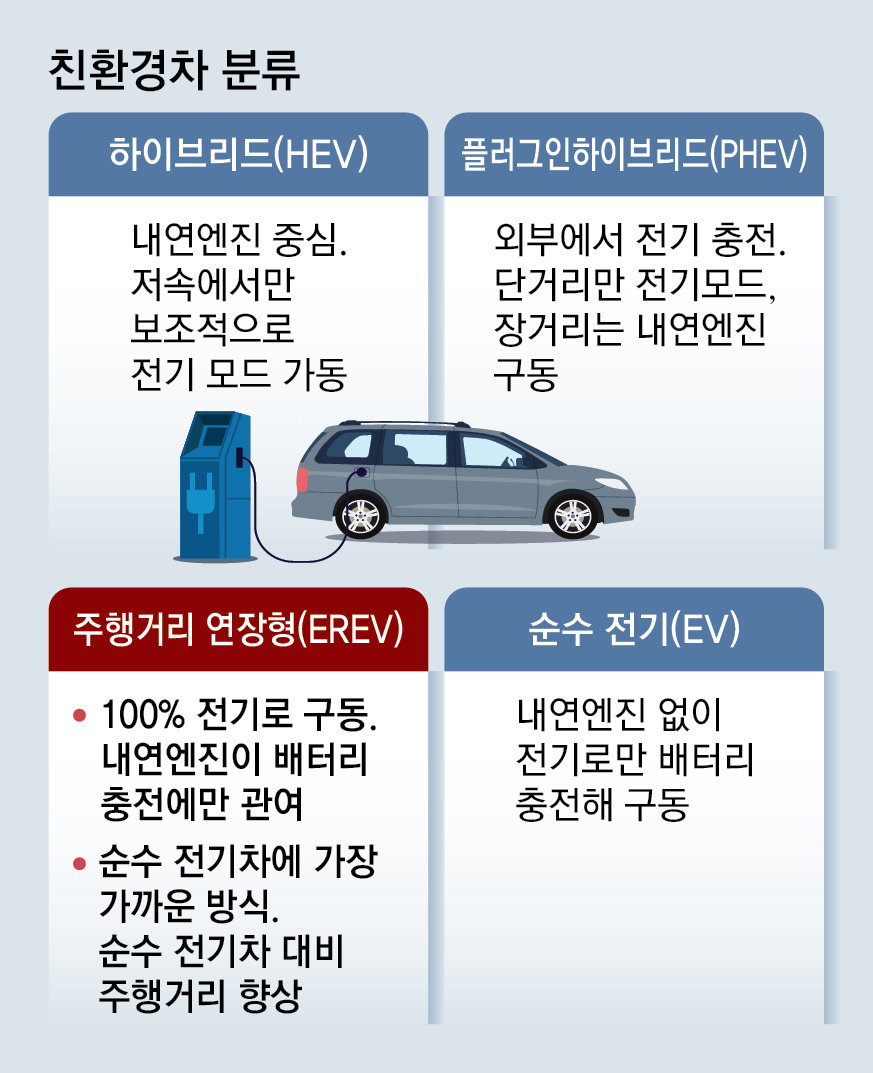[DBR/Special Report]감출수록 깊어지는 ‘마음의 병’… 정신질환 낙인 찍지 말아야
조진서기자
입력 2016-12-19 03:00 수정 2016-12-19 03:00
직원의 정신건강 관리대책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왼쪽)과 김형준 수석은 “회사엔 나오되 제대로 일을 못 하는 ‘프레젠티즘’은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 자살은 금전적,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일까. 의외로 사무직 근로자들의 자살도 많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자살 중 일반 사무직군 비율이 18.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및 판매직(17.4%), 전문직(16.1%)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노무(13.4%), 기계조작 및 조립(13.9%), 농림어업(9.3%) 종사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왼쪽)과 김형준 수석은 “회사엔 나오되 제대로 일을 못 하는 ‘프레젠티즘’은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 자살은 금전적,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일까. 의외로 사무직 근로자들의 자살도 많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자살 중 일반 사무직군 비율이 18.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및 판매직(17.4%), 전문직(16.1%)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노무(13.4%), 기계조작 및 조립(13.9%), 농림어업(9.3%) 종사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꼭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직원의 우울증, 불안장애, 무기력증은 현대 기업의 걱정거리다.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조직 전체 성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챙겨야 할까?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과 김형준 수석이 전하는 조직 내 정신건강 관리법이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14호에 실렸다. 관련 인터뷰를 요약해 소개한다.
―회사원의 정신 질환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원들의 ‘앱센티즘’이다.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프레젠티즘’이다. 회사에는 나오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다. 한국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 사회라서 ‘기분이 우울하니까 오늘은 쉬겠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웬만하면 출근한다. 다만 일을 못 한다. 한국에서는 앱센티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젠티즘’이 더 큰 문제다.”
―정신건강이 약한 사람을 채용할 때부터 알아낼 수는 없는가?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한번에 수천 명씩을 테스트해야 하는데 모두 다 면담을 할 수는 없으니 설문지로 물어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심리적으로 허약해요’라고 말하겠는가. 이런 테스트에는 필연적으로 가짜 음성 진단, 즉 ‘위음성’ 오류가 발생한다. 위음성 오류 수준 자체가 해당 조직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배려해야 하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나 인사팀으로서는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챙겨 주자’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을 잠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영자의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잘라야겠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멘털 프렌들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직원 중 누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해선 안 된다. 외부 전문가에게 진단을 맡기고, 직원들에겐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달라고 권고만 하라. 회사가 직접 직원의 정신건강을 감시하려고 하면 그 순간 다 숨어 버린다. 최근엔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임직원 전체 정신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편이 낫다. 직원들이 덜 방어적으로 나온다. 전반적으로 임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적정한 휴식을 주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왼쪽)과 김형준 수석은 “회사엔 나오되 제대로 일을 못 하는 ‘프레젠티즘’은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왼쪽)과 김형준 수석은 “회사엔 나오되 제대로 일을 못 하는 ‘프레젠티즘’은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꼭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직원의 우울증, 불안장애, 무기력증은 현대 기업의 걱정거리다.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조직 전체 성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챙겨야 할까?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세원 부소장과 김형준 수석이 전하는 조직 내 정신건강 관리법이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14호에 실렸다. 관련 인터뷰를 요약해 소개한다.
―회사원의 정신 질환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원들의 ‘앱센티즘’이다.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프레젠티즘’이다. 회사에는 나오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다. 한국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 사회라서 ‘기분이 우울하니까 오늘은 쉬겠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웬만하면 출근한다. 다만 일을 못 한다. 한국에서는 앱센티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젠티즘’이 더 큰 문제다.”
―정신건강이 약한 사람을 채용할 때부터 알아낼 수는 없는가?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한번에 수천 명씩을 테스트해야 하는데 모두 다 면담을 할 수는 없으니 설문지로 물어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심리적으로 허약해요’라고 말하겠는가. 이런 테스트에는 필연적으로 가짜 음성 진단, 즉 ‘위음성’ 오류가 발생한다. 위음성 오류 수준 자체가 해당 조직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배려해야 하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나 인사팀으로서는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챙겨 주자’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을 잠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영자의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잘라야겠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멘털 프렌들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직원 중 누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해선 안 된다. 외부 전문가에게 진단을 맡기고, 직원들에겐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달라고 권고만 하라. 회사가 직접 직원의 정신건강을 감시하려고 하면 그 순간 다 숨어 버린다. 최근엔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임직원 전체 정신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편이 낫다. 직원들이 덜 방어적으로 나온다. 전반적으로 임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적정한 휴식을 주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조진서 기자 cjs@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햄 ‘빼는 값’ 2000원 더 받는 김밥집…손님 사진 SNS 올리고 조롱까지
 ‘카드부터 신분증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쓴다면 지갑 말고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카드부터 신분증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쓴다면 지갑 말고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다이소, 지난해 매출 3조 돌파…“오프라인 소비 회복·소비 양극화”
다이소, 지난해 매출 3조 돌파…“오프라인 소비 회복·소비 양극화” 아이폰 수리비 싸질까… 애플 “중고부품으로도 수리 가능”
아이폰 수리비 싸질까… 애플 “중고부품으로도 수리 가능” 운전석서 조수석까지, LG 최장 디스플레이… 車업계 ‘러브콜’
운전석서 조수석까지, LG 최장 디스플레이… 車업계 ‘러브콜’- 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 물건너간 美 조기 금리인하… 한은 물가관리 비상
- 상속세-법인세-부가세 인하, 與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 3월 취업자 17만3000명 늘어…증가폭 37개월만에 최소
- 공시가 현실화 폐지-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제동 걸릴듯













![[DBR]가업, 승계만이 정답일까… 사업 영속성 고민해야 [DBR]가업, 승계만이 정답일까… 사업 영속성 고민해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452716.5.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