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기다린 특수학교 지역반발에 신설 흔들
임우선기자
입력 2016-11-09 03:00 수정 2016-11-09 03:00
서울교육청, 2개교 추진 난항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김지원(가명·17) 양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오전 6시에 눈을 뜬다. 김 양이 사는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이지만 그가 다니는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는 20km 떨어진 구로구에 있기 때문이다.
김 양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딸을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모녀는 집에서 15분을 걸어 7시 25분까지 통학버스 정류장에 가야 한다. 통학버스는 김 양을 태운 뒤 강서구를 돌며 다른 학생들을 태운다. 원래는 8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하지만 길이 막히면 한 시간 늦을 때도 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김 양과 친구들에게 차 속에 꼼짝없이 머물러야 하는 2시간은 그야말로 ‘고문’이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울고 소리치고 자신을 때리기 일쑤다. 학교에 도착해 수업이 시작될 때면 녹초가 돼 잠이 든다.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도 다른 방법이 없다.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 일반학교 110개 생길 동안 특수학교는 ‘0’
서울시교육청이 4일 강남·서초지역(옛 언남초등학교 부지)에 공립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고 행정 예고를 했다. 8월 강서지역에 특수학교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두 번째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 동부지역에도 부지를 확보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의 특수학교가 태부족인 탓에 김 양 같은 학생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1만2929명에 달한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29곳에 불과한 탓에 이 중 4496명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거나 일반교실에서 통합수업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중 1700여 명이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리가 없다”며 “7명이 정원인 특수학교 교실에 10명, 11명씩 배정해도 도저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애학생 학부모 이모 씨는 “거리가 얼마나 멀든, 과밀 학급이든 아니든 지금으로서는 특수학교를 배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습권이나 교육의 질 같은 건 아예 따질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2002년 이후 14년 동안 서울에 단 한 개의 특수학교도 신설되지 않았으니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셈이다. 반면 이 기간에 일반학교는 110개나 신설됐다. 유독 특수학교만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신설이 무산된 것이다. ‘집값 떨어진다’ ‘동네 이미지 망친다’ ‘왜 하필 우리 동네냐’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 지역주민 반발에 두 번 우는 장애학생
시교육청이 최근 특수학교 건립을 속속 발표하면서 갈등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행정 예고한 뒤 해당 지역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대표가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 주민 사이에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연판장이 돌기도 했다.
주민들은 “강서구엔 이미 특수학교가 있고 오히려 양천구는 한 곳도 없는데 왜 또 강서구에 짓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있지만 강서구 장애학생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양천구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학생 어머니 김모 씨는 “아무리 특정 지역에 학교가 있어도 학생이 많으면 또 짓는 게 상식인데 비장애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남은 폐교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매일 아침 집 근처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조차 꿈꿀 수 없는 게 한국 장애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김지원(가명·17) 양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오전 6시에 눈을 뜬다. 김 양이 사는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이지만 그가 다니는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는 20km 떨어진 구로구에 있기 때문이다.
김 양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딸을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모녀는 집에서 15분을 걸어 7시 25분까지 통학버스 정류장에 가야 한다. 통학버스는 김 양을 태운 뒤 강서구를 돌며 다른 학생들을 태운다. 원래는 8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하지만 길이 막히면 한 시간 늦을 때도 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김 양과 친구들에게 차 속에 꼼짝없이 머물러야 하는 2시간은 그야말로 ‘고문’이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울고 소리치고 자신을 때리기 일쑤다. 학교에 도착해 수업이 시작될 때면 녹초가 돼 잠이 든다.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도 다른 방법이 없다.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 일반학교 110개 생길 동안 특수학교는 ‘0’
서울시교육청이 4일 강남·서초지역(옛 언남초등학교 부지)에 공립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고 행정 예고를 했다. 8월 강서지역에 특수학교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두 번째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 동부지역에도 부지를 확보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의 특수학교가 태부족인 탓에 김 양 같은 학생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1만2929명에 달한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29곳에 불과한 탓에 이 중 4496명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거나 일반교실에서 통합수업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중 1700여 명이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리가 없다”며 “7명이 정원인 특수학교 교실에 10명, 11명씩 배정해도 도저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애학생 학부모 이모 씨는 “거리가 얼마나 멀든, 과밀 학급이든 아니든 지금으로서는 특수학교를 배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습권이나 교육의 질 같은 건 아예 따질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2002년 이후 14년 동안 서울에 단 한 개의 특수학교도 신설되지 않았으니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셈이다. 반면 이 기간에 일반학교는 110개나 신설됐다. 유독 특수학교만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신설이 무산된 것이다. ‘집값 떨어진다’ ‘동네 이미지 망친다’ ‘왜 하필 우리 동네냐’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 지역주민 반발에 두 번 우는 장애학생
시교육청이 최근 특수학교 건립을 속속 발표하면서 갈등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이 강서구의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행정 예고한 뒤 해당 지역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대표가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 주민 사이에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연판장이 돌기도 했다.
주민들은 “강서구엔 이미 특수학교가 있고 오히려 양천구는 한 곳도 없는데 왜 또 강서구에 짓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있지만 강서구 장애학생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양천구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학생 어머니 김모 씨는 “아무리 특정 지역에 학교가 있어도 학생이 많으면 또 짓는 게 상식인데 비장애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남은 폐교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매일 아침 집 근처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조차 꿈꿀 수 없는 게 한국 장애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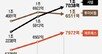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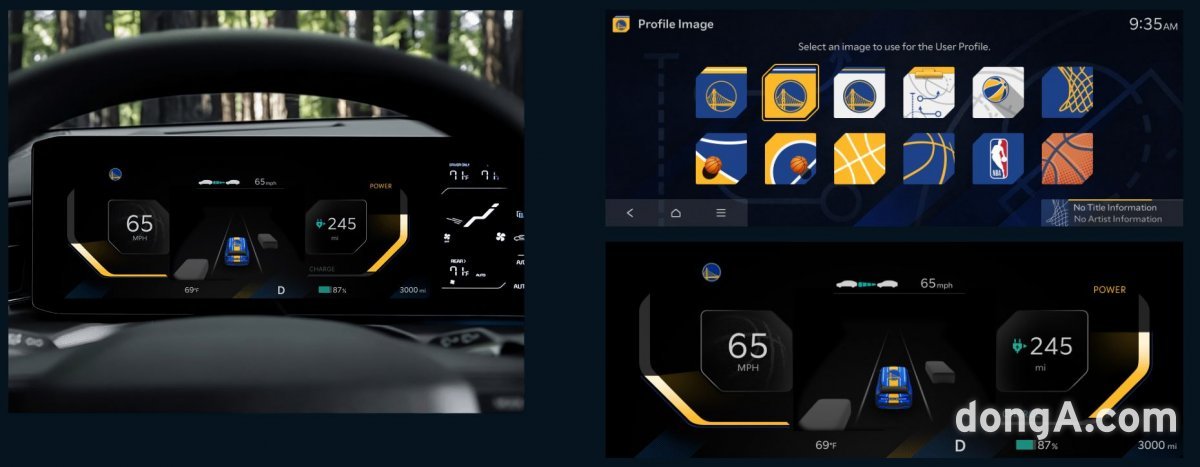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