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다 자식세대가 더 못 사는 세대…해결 방법은?
고기정 기자
입력 2015-05-10 15:06 수정 2015-05-10 15:14
차두리의 국가대표 은퇴식이 짠했던 건 그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차범근에 대한 소회 때문이었다. “너무 축구를 잘하는 아버지를 둬 좀 밉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처에 못 가 속상함도 있었다.” 차두리에 환호한 건 ‘노력하는 범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어라 노력해도 천재 아버지를 넘을 수 없었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 이 시대엔 부모 세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차두리가 너무 많아서다.
한국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소득과 기회의 배분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1990년대까지도 그랬다. 당시 양질의 일자리는 530여만 개인 반면 대졸 노동력은 500만 명이 채 안 됐다. ‘삼성 고시’ 같은 건 없었다. 대학 학과사무실에서 추천서를 받아 취직하던 때였다.
성장이 정체된 2010년, 양질의 일자리는 580여만 개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는데 대졸 노동력은 960만 명이 넘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학력 워킹푸어’로 전락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안 잡히는 대졸자가 300만 명 이상인 건 이런 구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장만으로 계층 상승은커녕 ‘계층 사수’도 어렵다면 부모가 자본을 물려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부모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 한국의 저축률은 4%대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중산층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데다 계층상승 비용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아무나 자식들을 로스쿨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성장은 자식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살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시대를 맞은 건 처음이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건 청년들에게 부모보다 더 큰 성장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파이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다 같이 더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의해 조금 더 못사는 미래의 불편함을 서로 분담하자는 묵계를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결과가 잘못된 건 세대 간에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기 때문이다.
부모보다 자식세대가 더 못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두 세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자식 학원비와 대학 졸업장 따는 데 다 써버리는 건 세대와 사회의 물적 진보가 보장됐던 저성장 이전의 방식이다. 자식세대의 짐을 덜어주면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사양 산업이나 레드오션에 있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하듯 말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게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일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한국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기도 했지만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소득과 기회의 배분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1990년대까지도 그랬다. 당시 양질의 일자리는 530여만 개인 반면 대졸 노동력은 500만 명이 채 안 됐다. ‘삼성 고시’ 같은 건 없었다. 대학 학과사무실에서 추천서를 받아 취직하던 때였다.
성장이 정체된 2010년, 양질의 일자리는 580여만 개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는데 대졸 노동력은 960만 명이 넘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학력 워킹푸어’로 전락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안 잡히는 대졸자가 300만 명 이상인 건 이런 구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장만으로 계층 상승은커녕 ‘계층 사수’도 어렵다면 부모가 자본을 물려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부모는 그럴만한 돈이 없다. 한국의 저축률은 4%대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중산층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데다 계층상승 비용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 아무나 자식들을 로스쿨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성장은 자식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살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한국이 이런 시대를 맞은 건 처음이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건 청년들에게 부모보다 더 큰 성장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파이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다 같이 더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의해 조금 더 못사는 미래의 불편함을 서로 분담하자는 묵계를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결과가 잘못된 건 세대 간에 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기 때문이다.
부모보다 자식세대가 더 못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두 세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자식 학원비와 대학 졸업장 따는 데 다 써버리는 건 세대와 사회의 물적 진보가 보장됐던 저성장 이전의 방식이다. 자식세대의 짐을 덜어주면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사양 산업이나 레드오션에 있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하듯 말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게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일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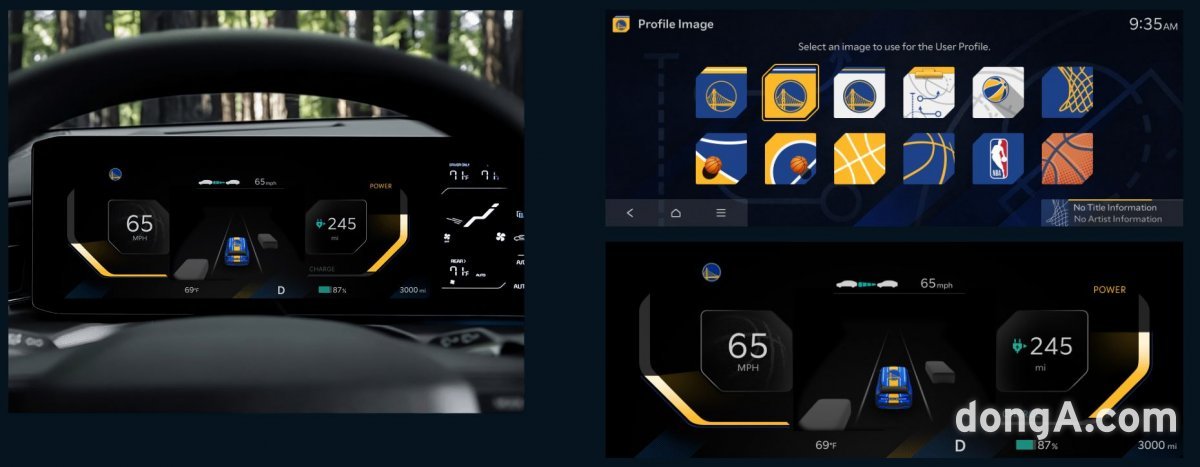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