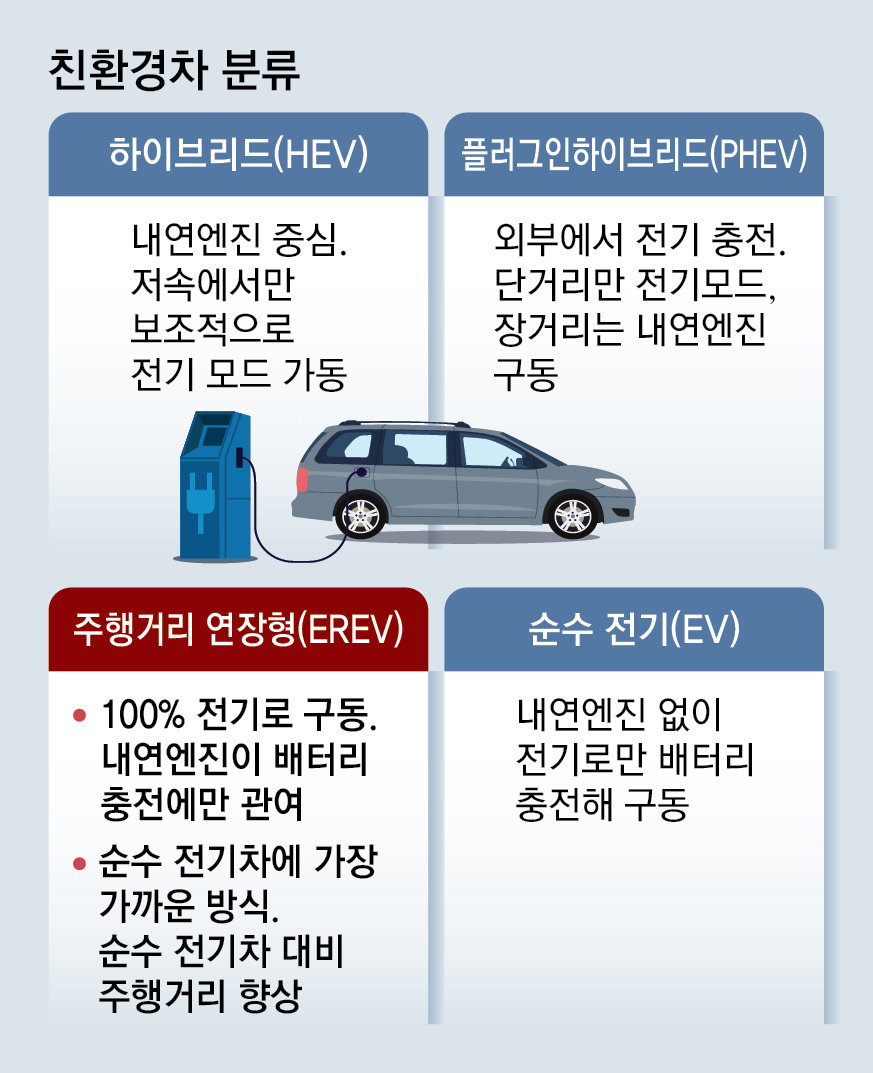[조경란의 사물 이야기]에어캡
조경란 소설가
입력 2017-01-11 03:00 수정 2017-01-11 03:00

도쿄에 사는 중학생 조카가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새해 초를 같이 보냈다. 초등학교 사촌들과 놀고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빠져 있던 조카의 바람과 달리 시간은 금세 지나가버렸다. 떠나는 날 아침 일찍 큰이모인 내가 나서서 짐을 꾸려주었다. 조카가 가져온 것은 교과서와 참고서로 채워 돌덩이같이 무거웠던 백팩과 가족들 선물을 담아온 기내용 트렁크 하나. 그런데 동생 집으로 보내야 할 것들은 많았다. 만두와 떡을 비롯한 냉동식품들, 라면, 마늘 등등.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트렁크 바닥에 신문을 깔고 먼저 조카의 수학 영어 국어 등의 교과서를 차곡차곡 담았다. 모아두었던 에어캡 중에서 새것 같은 것으로 골라 그 책들을 몇 겹씩 꼼꼼히 두르고 쌌다. 내일모레 또 시험이라는데 냉동식품들 때문에 교과서가 젖으면 곤란하니까. 빻아서 얼려둔 마늘도 에어캡으로 한 번 더 둘렀다.
먼 데로 떠날 짐을 꾸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소포를 보낼 때마다 유용하게 쓰이는 에어캡.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 ‘뽁뽁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한 에어캡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엔지니어와 스위스의 발명가라고 한다. 플라스틱 입체 벽지로 개발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완충작용을 하는 포장재로 쓰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 말. 그 발명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버블랩 북(The bubble wrap book)’의 리뷰를 아마존에서 찾아보니 에어캡의 몇 가지 장점 중에 이런 점도 눈에 띈다.
‘스트레스 세러피.’
기포가 들어간 폴리에틸렌 필름을 손으로 누를 때 터지는 소리와 촉감! 에어캡으로 싸준 교과서를 들고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간 조카와 여기 사는 조카들도 어렸을 적부터 에어캡만 보면 달려들어서 뽁뽁 터뜨리며 놀고는 했다.
한파가 찾아왔다. 에어캡의 또 다른 용도를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아버지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이면 거실 창문이나 외관으로 난 유리에 뽁뽁이를 붙여두곤 한다. 에어캡을 처음 발명했을 때 외면당했던 이유처럼 비록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실내온도가 평균 2도쯤 올라간다고 하니. 안팎으로 이 겨울은 얼마나 길고 길 것인가.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따뜻한 1월이 될 수 있기를.
조경란 소설가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햄 ‘빼는 값’ 2000원 더 받는 김밥집…손님 사진 SNS 올리고 조롱까지
 ‘카드부터 신분증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쓴다면 지갑 말고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카드부터 신분증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쓴다면 지갑 말고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다이소, 지난해 매출 3조 돌파…“오프라인 소비 회복·소비 양극화”
다이소, 지난해 매출 3조 돌파…“오프라인 소비 회복·소비 양극화” 아이폰 수리비 싸질까… 애플 “중고부품으로도 수리 가능”
아이폰 수리비 싸질까… 애플 “중고부품으로도 수리 가능” 운전석서 조수석까지, LG 최장 디스플레이… 車업계 ‘러브콜’
운전석서 조수석까지, LG 최장 디스플레이… 車업계 ‘러브콜’- 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 물건너간 美 조기 금리인하… 한은 물가관리 비상
- 상속세-법인세-부가세 인하, 與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 3월 취업자 17만3000명 늘어…증가폭 37개월만에 최소
- 공시가 현실화 폐지-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제동 걸릴듯










![[DBR]가업, 승계만이 정답일까… 사업 영속성 고민해야 [DBR]가업, 승계만이 정답일까… 사업 영속성 고민해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452716.5.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