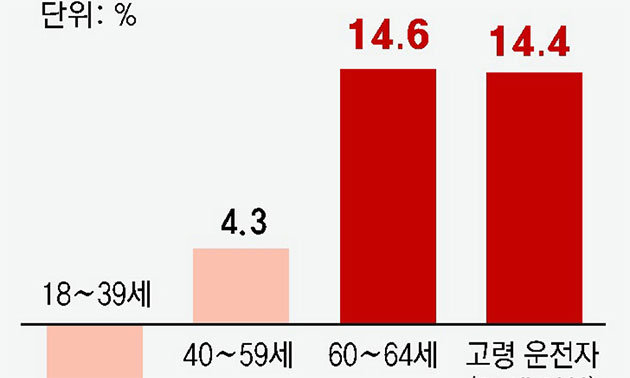뮤지컬배우 최재림과 예고생의 꽤 전문적인 대화, “입시나 오디션에서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③
양형모 기자
입력 2019-10-16 14:41 수정 2019-10-16 15:03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뮤지컬 배우이자 1일 멘토로 나선 최재림 배우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는 고등학생 정준형 군의 대화는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정준형) 이미지에 어울리는 소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어서인지 선생님들께서 약간 얇은 소리를 추구하는 편이시거든요. 저도 그런 소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캐릭터 이미지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다른 게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재림) 가능하다면. 뮤지컬은 한 음악장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있고, 전자음악도 있고, 어쿠스틱음악도 있고. 음악도 락, 알앤비, 컨트리, 재즈, 세미클래식 등 여러 가지죠. 그 장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게 많은 거지. 근데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 잘 하는 거. 혹은 ‘락은 정말 내가 제일 잘해’ 하면 거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얇은 소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몸이 성장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 고등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다 헤비하게 불러요. 성악스타일로. 그게 그 또래 학생들 안에서 출중해 보일 수는 있어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낼까 … 부러움? 혹은 대단하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열여덟, 열아홉에 작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스무 살, 서른 살 넘어서 작품을 하거나 프로 데뷔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는 좀 … 나이에 맞지 않는 소리거든요. 40대의 소리를, 어른의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면 몸이 거기에 맞춰져 버려요. 나의 소리는 더 예쁘고 더 청아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원래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맞는 소리가 가벼운 소리예요. 그 소리를 계속 잘 내면서 힘이 붙는 거죠. 줄기 가운데를 뻥 뚫는다고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얇은 소리만 추구할 것은 아니고 내 소리가 나는 자체, 평소 목소리, 좀 멀리 말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 자체를 제일 잘 낼 수 있는 발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변하니까. 몸도 변하고. 몸이 변하면 힘도 변하고. 소리를 내는 방법도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내 목소리를 최대한 잘 … 해야 하는 거죠.”
“(정) 입시나 오디션을 볼 때 응시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최) 아까 한 얘기와 비슷한데, 맞지 않는 캐릭터를 갖고 오는 거죠. 무조건 어려운 노래. 무조건 대표곡.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거. ‘멋있는?’ 이라고 하면 좀 말이 웃기지만 ‘레미제라블 장발장 준비해야지’, ‘자베르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오페라 아리아가 부르고 싶으면 테너 아리아 부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건 당연하고 잘 부를 수도 못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불러도 나한테 어울리는지는 꼭 생각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준형 군이 레미제라블의 떼나르디에를 골랐다고 해봐요. 그런데 과연 딱 봤을 때 떼나르디에로 보이냐는 거지. 만약 똑같은 실력, 체형, 얼굴을 가진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친구는 떼나르디에인데 저 친구는 넥스트 투 노멀의 게이브처럼 그 나이에 맞는 캐릭터를 갖고 왔다고 한다면 당연이 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불렀다고 쳤을 때. 왜냐하면 이쪽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정)저는 입시곡으로 콩쿠르에서 불렀던 헤어스프레이 씨위드의 ‘런 앤 텔 댓’을 선택했습니다. 또래 애들에 비해 체격이 좀 왜소하기도 하고, 몸 쓰는 것도 좋아하고. 고등학생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왜소한 애가 재빠르게 움직이면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웃음). 과연 잘 선택한 걸까요?”
“(최) 좋아요. 본인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소하다라기 보다는 키가 작은 거겠죠? (키가 작은) 친구들 장점은 민첩하다는 거예요. 키 큰 애들은 시원하고. 가진 게 커서. 그런데 키 큰 애들은 춤을 잘 추기가 어려워요. 핸들링이 안돼. 그 실력이 있으면 좋은 거죠. 큰 신체를 잘 쓰는 거니까. 체형이 작으면 대부분 자기 몸 핸들링을 잘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걸 골라야죠. 씨위드를 할 때 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춤을 못 춰서(웃음). 그걸 감춰야 하는데 … 난 너무 커서 안 감춰지더라고요. 팔을 한번 뻗어도 펄럭거리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정) 요즘 많이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입시준비를 계속 하다보니 뭔가 중요한 것을 까먹는 것 같아서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진학에 대한 압박이 생겼다고 해야 할지 … 그러면서 촉박해지고, 긴급해지고,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의심도 들고 ….”
“(최)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배우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매번 오디션을 봐야 하고,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공부해야 하고. 이 작품이 과연 도전해볼 만한 것인지. 끝나지 않는 고민인 거죠. 목표를 두고 가다보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신 이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냐, 아니면 나의 목표는 여기(멀찌감치) 있고 이것들은 관문들인 거냐. 배우 되는 게 목표라면, 뮤지컬 작품 오디션에 합격하면 배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니잖아요. 과정인 거죠. ‘난 어떤 배우가 될 것인가’. 그게 목표가 되어야겠죠. 배우가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닌 관문입니다. 대학? 관문이죠.”
“(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거기까지 수월하기 가기 위해선 한국에서는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군대? 관문이죠.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 준비하려면 마인드 콘트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 하루 종일 입시준비를 하다보면 허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걸 하고 있지(웃음)? 사실 나도 그래요. 요즘 아이다 때문에 하루 2시간 3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하고 있지’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다메스로 섰을 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거죠. 운동하기 싫지. 죽겠는데. 맛이 없는 거 먹기 싫지 하하하!”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최)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장사, 경영과는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개인에 대한 혹독한 잣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당연히 두세 시간 연습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게 더 재밌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연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끝인가? 내일도 있는데. 대학 떨어지면 어때. 이 대학 못가면 뮤지컬 배우가 못되나? 또 다른 대학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배우가 되기 위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되어서 재수 삼수 하는 거 …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디션 지원서 낼 때 ‘서울대 뮤지컬과(물론 이런 곳은 없지만)를 나왔어? 이 친구 잘 하겠구만’ 이러지는 않거든요. 수행능력을 보는 거지 대학 어디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을 어떻게 좋은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콘트롤을 하면 좀 덜 괴롭지 않을까요? 일주일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면 하루 정도는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어요. 매일 연습한다고 매일 발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래도 매일 하면 안 늘어요. 정말 좋게 매일 하지 않으면. 나도 운동 한번씩은 쉬어요. 한번 정도는 버려야 해요. 버리고 연습을 나가는 거죠. 잘 하려고 집중하는 연습도 있지만 ‘오늘은 즐길 거야’, ‘이 노래를 혼자 재밌고 즐겁게 부를 거야’, ‘이 춤을 그렇게 출 거야’.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최) 사실 그게 보이거든. ‘이 아이가 지금 잘 하려고 …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이 아이가 즐기고 있구나’. 테크닉적으로 잘 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기계야. 정말 배운 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하죠. 그러면 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개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거칠 수도 있고, 덜 다듬어졌을 수도 있는데 … 이 순간 자체를 ‘팍’ 즐기는 학생이 있어요. 어느 순간, 1초라도 딱 보이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2분 30초? 99%? 다 필요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그 1%를 기억하니까.”
“(정) 평소 존경하던 배우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고민하던 것들,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나아가야겠다’하고 마음을 이 순간 확실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예체능이란 걸 한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있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배우라고 해도 365일 매일 공연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얻는 성취감, 만족감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 그거에 매료가 되고,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죠. 나는 누가 배우가 되건 안 되건, 또 돼서도 성공하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는 관문들 … 난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형 군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진학을 하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혹은 변호사, 프로그래머 …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말 그대로 그 친구들이 목표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시간, 그 안에서 좌절하고 성공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 희로애락의 과정들. 뭐가 되든 이 사람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
사진제공 | 신시컴퍼니“(최) 준형 군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내가 갖고 있는 열정, 에너지 … 이런 것들을 순간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작은 결과들로 인해 물들지 않도록 잘 닦아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난 이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걸 즐기고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말이죠. ‘물론 내 개인적인 훈련시간은 고되지만, 그래서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는 게 자랑스러워’라고. 준형 군이 자신과 자신이 하는 노력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늘 만나서 나도 반갑고 즐거웠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인터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사진 촬영을 위해 연습실 안으로 이동했다. 무대에서만 보던 프로 뮤지컬 배우들이 실제로 연습하는 ‘비밀의 공간’에 들어선 정준형 군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두 사람의 다정한 포즈를 보고 있자니 문득 ‘이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하게 될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 궁금해졌다. 그때쯤 다시 두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비즈N 탑기사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60368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