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떠넘겨진 '어설픈 냥줍'의 책임
노트펫
입력 2019-09-16 15:08 수정 2019-09-16 15:09




[노트펫] 고양이를 길에서 데려와 키우는 것을 뜻하는 '냥줍' 이야기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그런 '냥줍'은 진정 평생 함께할 주인을 만났을 때나 가능하다.
평범한 집사가 얼마 전 겪은 아기 길고양이 구조기는 선한 마음에서 '냥줍'하려다 정반대로 목숨까지 빼앗거나, 다른 사람이 뒤처리를 해야 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1일 평상시처럼 반려견 샤넬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산책로로 통하는 건물의 비상계단에 우체국 택배상자가 버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누가 사람이 자주 오가는 통로에 이런걸 뒀는지' 짜증이 날 찰라 박스 안에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샤넬이는 박스에서 소리가 나니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A씨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입에서 욕이 바로 튀어 나왔다.
8년 전 길고양이를 구조했을 당시의 악몽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는 길고양이 정이. 얼결에 구조한 뒤 동물보호소에 보내면 사실상 방치되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였다.
그럼에도 맡기가 어려워 고심 끝에 보내려 했으나 A씨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입양에 동의하면서 소중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 그 때의 경험은 두 번 다시는 함부로 구조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일이 다시금 반복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박스 안에는 손바닥만한 고양이, 그 고양이가 먹을 수 없는 참치캔과 종이컵 물, 그리고 박스에 깔아진 헌 옷가지. 아마 어미에게서 어떤 이유로 낙오된 고양이를 선한 의도로 박스에 곱게 헌 옷까지 깔아 넣어뒀을 터였다.
A씨는 눈을 질끈 감고 일단 지나쳤다. 그래도 나름 정성스럽게 챙겨주신거니 다시 돌아와서 데려가겠거니, 끝까지 책임지겠거니,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다.
다음날 아침, 밤새 잠을 설치고 제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침운동 겸 그 장소를 다시 찾은 A씨. 박스는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데려간 줄 알았지만 그건 헛된 기대일 뿐이었다. 박스 안에는 탈진해서 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다.
모른척할 수도 없고 쉽게 구조할 수도 없는 딜레마.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를 구조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하지만 A씨는 측은지심에 일단 구조하는 쪽을 택했다.
박스에 쪽지를 남기고 데려와서 하루 동안 돌봤지만 갓난 고양이인지라 멘붕의 연속이었다. 길고양이를 주워왔다고 부모님과 다툼까지 벌여야 했다. 부모님 역시 그 예전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
1~2시간에 한 번 분유를 먹이고 배변유도를 하며 밤에는 한순간 저혈당이 와서 무지개다리라도 건널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시로 깨어 호흡을 체크했다. '내가 또 이 바보짓을 왜 하고 있을까'하는 후회가 깊은 밤이었다.
자기를 거둔 걸 아는지 어느새 옆에 와서 애교짓도 하고 골골송도 부르는 고양이를 보면서 마음이 더 무겁기도 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날이 밝자 동물구조단체와 지자체 동물구조담당에 연락을 취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길고양이 구조는 8년 전 그때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스스로 사료를 씹지 못하는 젖먹이는 입소와 동시에 안락사되니 살리려거든 당신이 책임져라'
가족들이 이 아기 고양이를 참고 봐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주일. 1주일 안에 임시보호처나 입양자를 구하지 못할 땐 운명을 뻔히 알지만 보호소에 보내리라 작심했다.
보름 여가 지난 현재 고양이는 이 세상에 없다.
A씨는 보호소는 최후의 대안이라는 생각 아래 고양이를 맡아줄 곳을 이곳저곳 수소문해 봤다. 하지만 연락한 곳들마다 아기 고양이가 넘쳐난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면식도 없이 연락한 쉼터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 쉼터 운영자분이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것.
이 고양이를 돌보는 몫은 A씨에게서 쉼터로 이전됐다. 수유를 하고, 배변 유도를 하고, 먼저 들어와 있던 고양이들을 돌보는 수고는 절대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쉼터 운영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오프라인은 물론 SNS로도 입양처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숨 놨다는 생각에 까미라는 이름도 붙여줬다.
하지만 쉼터가 들어간 지 열흘째였던 지난 11일 까미는 돌연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태풍이 오면서 험해진 날씨를 까미는 이겨내지 못했다.
누군가 시작한 냥줍을 완결시키기 위해 나섰던 두 사람의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달린 열흘 간의 노력이 허망하고도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결말을 맺은 것이다.
A씨는 "'냥줍'은 분명 선한 마음에서 행한 것이고 잘하는 행동이 맞다"며 "하지만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이는 또 다른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씁쓸해 했다.
구조보다는 구조 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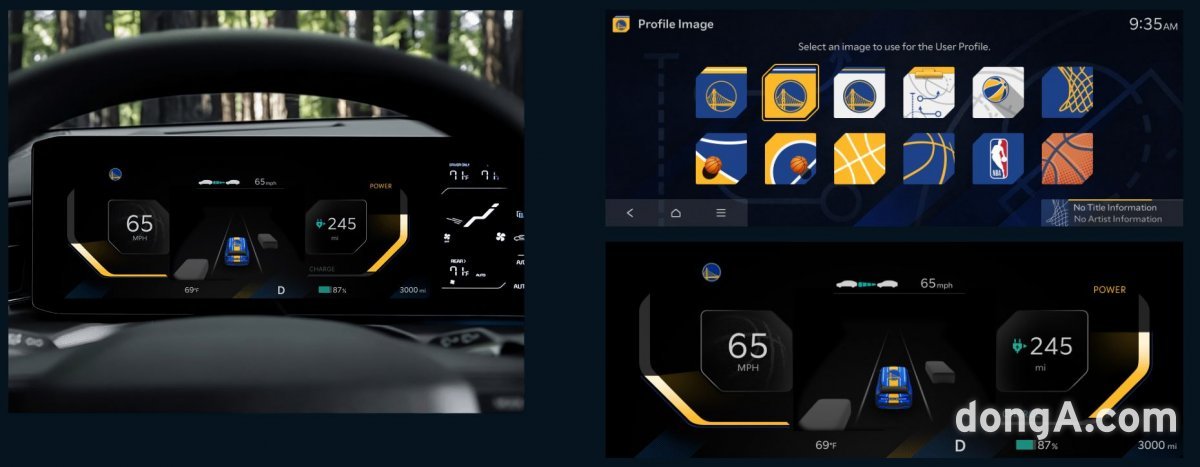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