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조금씩 뒤처졌던 고진영, 친구 넘어서고 끝내 울었다
고봉준 기자
입력 2019-07-30 05:30 수정 2019-07-30 05:30
 고진영(왼쪽)은 29일(한국시간)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늘 자신을 앞섰던 동갑내기 절친 김효주와 챔피언조에서 함께 플레이한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우정은 진하다. 사진은 3월 HSBC 여자 월드 챔피언십 도중 찍은 둘의 셀카. 사진출처|고진영 인스타그램 캡처
고진영(왼쪽)은 29일(한국시간)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늘 자신을 앞섰던 동갑내기 절친 김효주와 챔피언조에서 함께 플레이한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우정은 진하다. 사진은 3월 HSBC 여자 월드 챔피언십 도중 찍은 둘의 셀카. 사진출처|고진영 인스타그램 캡처에비앙에서 격돌한 고진영과 김효주
1995년생 동갑내기로 프로 무대에서 활약
한 발씩 늦었던 고진영, 극적인 역전 우승
늘 한 발을 앞서가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다. 골프 입문부터 프로 데뷔, 첫 우승, 해외 진출까지.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친구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때론 시기 어린 질투심도 들었지만, 타고난 실력을 따라잡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또 기다렸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여전히 먼발치로만 느껴지던 친구를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다시 만났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챔피언조. 이번에도 친구는 앞서나갔다. 그러나 ‘뒤처지지 않고 싶다’는 간절함이 통했을까. 빗속 혈투 끝에 마침내 오랜 동반자이자 라이벌을 넘어서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그려냈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23야드)에서 끝난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 달러·약 48억3000만 원)에서 15언더파 269타로 정상을 밟았다. 올 시즌 3승이자 단일 시즌 메이저 2관왕이라는 대업을 이뤘다.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김효주(24·롯데)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 2006년, 제주도에서의 첫 만남
고진영과 김효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운명의 장난처럼, 너무나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단지 시간의 차만 있었을 뿐이었다. 김효주가 한 발을 앞서가면 고진영이 이를 뒤따르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다.
첫 만남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에서 열린 유소년 대회에서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를 시작한 나는 그때가 처음 출전한 정규대회였다. 반면 6살부터 클럽을 잡은 (김)효주는 이미 ‘천재 소녀’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 대회에서 나는 92타를 쳤는데 효주는 78타를 쳤다. 친구가 참 대단해 보였다.”
이후 둘은 차근차근 성장했다. 앞서간 쪽은 김효주였다. 유소년과 청소년 무대를 차례로 평정하며 한국여자골프의 기대주로 거듭났다.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동기들보다 한 해 먼저 프로로 뛰어들었다. 반면 고진영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속도를 맞춰갔다.
 고진영이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끝난 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친구 김효주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역전 우승을 일궈낸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고진영이 29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끝난 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친구 김효주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역전 우승을 일궈낸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19년, 에비앙에서의 우승 맞대결
미국 진출도 김효주가 빨랐다.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2014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았고, 이듬해 미국으로 떠났다. 2016년 대상 수상과 함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했던 고진영은 2017년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 후 이듬해부터 LPGA 투어 도전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간차는 있었지만 서로 비슷한 길을 걸어온 고진영과 김효주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였다. 이번에도 최종라운드 중반까지는 김효주가 고진영보다 앞섰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는 보지 않았다. 오로지 내 스윙에만 집중했다”는 고진영은 강했다. 김효주가 14번 홀(파3)에서 트리플 보기로 무너진 반면, 침착하게 4타를 줄여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늘 자신보다 앞서가던 친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순간이었다.
경기를 마치고 김효주와 포옹을 나눈 고진영은 환한 미소로 기쁨을 대신했다. 그러나 에비앙 챔피언십의 전통인 스카이다이빙 세리머니로 태극기가 활짝 펼쳐지자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고진영은 “3라운드가 끝난 뒤 기사를 찾아봤는데 내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 왠지 모르게 속상했다. 그래서 오늘 내 기사가 많이 나오도록 열심히 쳤다”고 수줍게 웃었다. 이어 “우승 직후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태극기 활강과 함께 애국가가 들리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낯선 땅에서 태극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 자체가 감격이었다”고 눈물의 의미를 밝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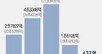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