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재동]지도자의 확신과 분노, 정책 망치는 최악의 레시피
유재동 경제부 차장
입력 2019-03-13 03:00 수정 2019-03-13 03:00
 유재동 경제부 차장
유재동 경제부 차장갈수록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한 홍보 동영상에는 본인이 직접 상점을 찾아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 시장이 “이렇게 편한 걸 왜 사람들이 안 쓰지?”라며 의아해하자 상인이 “조금씩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안심시켰다. 그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돌았다. “몇 달만 하면 대세가 되겠네.”
그러나 제로페이의 사용 실적은 아직 몇 달째 제로에 가깝다. 그동안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온 시내 광고판을 도배한 결과치고는 너무 참담하다. 현실이 기대와 달리 흐르고 주변의 걱정이 커질수록 박 시장의 자기 확신은 오히려 더 굳어지는 듯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행동경제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다. 한번 큰 비용이 투입된 것은 무조건 밀고 가는 ‘매몰비용의 오류’,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믿는 ‘소망적 사고’ 등이다.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제로페이의 성공에 대한 그의 믿음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고 많은 이들이 걱정한다.
지도자의 과잉 확신은 주변을 얼어붙게 만든다. 특히 그 확신이 도덕적 이상주의와 결합되면 나서서 말리는 게 더 어려워진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사석(私席)에서도 이에 대해 입을 다문 지 오래다.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감히 어떻게 입 밖에 내겠냐는 눈빛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어보면 결국 “관(官)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민간이 주도해온 영역에 공공부문이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면 사업의 효율성과 영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이 점을 콕 집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한들 박 시장은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제로페이가 애초 꼼꼼한 계산과 분석보다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본인의 강한 신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장사나 영업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사업에 이런 적신호가 켜졌을 때 몇 번이고 후퇴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다르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로페이에 동참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는 것”, “카드회사들은 가맹점주분들의 땀과 눈물을 짜내 큰 이익을 보고도 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평생 시민운동을 해온 그에게는 ‘선의(善意)에 대한 믿음’ ‘갑(甲)에 대한 분노’ 같은 정서적 가치가 정교한 현실 감각보다 우선이다.
이 폭탄은 점점 눈덩이가 되고 있다. 올해 제로페이 홍보에 쓰일 세금만 100억 원에 이른다. 통반장부터 지자체장, 여당 대표까지 발 벗고 나섰다. 정부도 사용 실적만 올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다. 각종 입장료와 주차비, 공연비 할인도 내걸었다. 이러다간 자영업자를 구한다는 명분 하나를 위해 헛돈이 쓰이고 애먼 월급쟁이가 희생하고 멀쩡한 카드사들은 절벽에 내몰릴 조짐이다. 국가적 낭비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제로페이도 아직 기회는 있다. 소비자 편의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순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참 지난(至難)하고 실적에 대한 조급함에 각종 무리수가 동반될 것이다. 박 시장 스스로 지나친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찬찬히 돌아봐야 한다. 이 상황은 정말 좋지 않은 결말로 치달을 수 있다.
유재동 경제부 차장 jarrett@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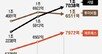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