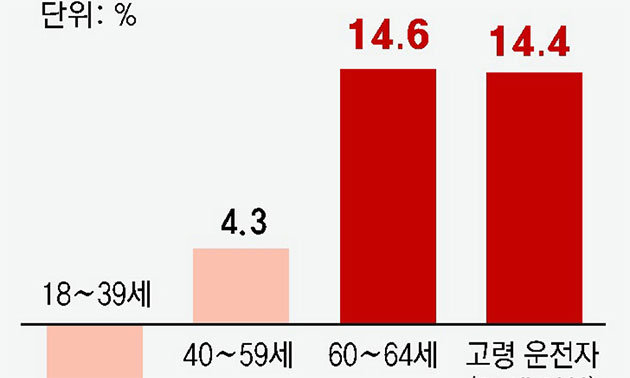[변종국 기자의 슬기로운 아빠생활]<12> 아빠들에게 ‘은밀한 악마’가 찾아온다
변종국기자
입력 2019-03-11 14:00 수정 2019-03-11 23:27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육아를 하면서 스스로 “참 너도 나쁜 아빠다” “너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아빠만은 아니야…” 싶을 때가 종종 있다. 힘든 육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 각종 잔머리와 잔꾀, 속임수 등 이른바 ‘꼼수’를 종종 쓰기 때문이다.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구나싶은 생각마저 든다. 직장 생활로 체력 및 정신적 피로도가 과다 축적됐을 때 아빠들에게 은밀한 ‘악마’가 찾아온다. 그렇게 찾아온 악마는 아빠들의 뇌를 곧 장악한다. 아빠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악마’에게 정신과 육체를 내준다. 아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묘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데…
#사례1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는 길. 내 새끼가 보고 싶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뛰어 나오는 아이. 한나절 쌓인 스트레스가 녹아내린다. 아이가 보고 싶은 건 확실하다.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다면 더 좋을 것만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아내에게 카톡을 날려본다. “애들 자?”
아이가 보고 싶지만, 아이가 자고 있으면 더 좋을 것만 같은 이 기분. “잠들려고 해” 라는 아내의 답장.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빨라지지 않고 왜 점점 느려지는 걸까? 애가 혹시나 잠들려다 깨면 안 되기 때문이지. 분명 다시 말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 오늘 못 보면 아쉬울 것 같지만, 아빠들에겐 ‘내일’이 있다.
#사례2
힘들게 아이를 재운 아내. 집 현관문을 열자 ‘쉿!’ 이라는 제스처를 취한다. 애를 깨우면 안 되니까.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 방문을 슬그머니 연다. 아이가 곤히 자고 있다. 너무 예쁘다. 좀 전 까지 아이가 잠들었으면 했던 악마가 갑자기 천사로 돌변한다. “그래 뽀뽀라도 해주자, 이불이라도 덮어주자” 마음먹는다. 다가간다. 우리 아기 잘 자라 뽀뽀~. 아기가 깨버렸다. 망했다.
#사례3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 아프면 보통 잠에 일찍 드는데 아닌 경우도 있나보다. 의사 선생님도 “잘 먹고 푹 자야 빨리 나아요”라고 말한다. 나는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애는 잠을 그렇게 안자요”라고 물었다. 의사가 말했다. “그럼 잠을 좀 잘 자도록 수면기능이 있는 약 성분을 넣어 드릴까요?”
그새 악마가 찾아왔다. “애가 일찍 잠든다고오오오오? 오호홍홍 으흐흐? 의학적으론 문제가 없겠지 당연히!” 이내 천사도 찾아왔다. “수면 기능이라면 수면제? 워워 그럴 순 없지. 어떻게 애한테 수면제를 먹여?” 천사가 이겼다. “아니에요. 선생님 (수면기능은) 괜찮을 것 같아요. 허허” 그렇게 진찰을 받고 약을 사들도 온 그 날 밤. 아이는 역시나 잠에 들려 하지 않는다. 아픈 애가 맞나 싶을 정도다. 의사 선생님의 ‘수면제’ 이야기가 떠오른다.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며 교육을 하던 내가, 막상 의사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는 구나 싶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아이가 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 한두 권만 가져오면 좋으련만. 노벨상을 타실 작정이신지 책을 5, 6권 가져온다. 누워서 책을 읽어주면 팔이 아프고, 엎드려서 읽어주면 허리가 아프다. 앉아서 읽으면 아이가 잠을 안 잔다. 아무튼 가져온 책을 다 읽어 줘야 잘 기세다. 하지만 아이(만 3세)는 글자를 모른다. 두 세 페이지를 몰래 넘긴다. 한 두 문장을 건너뛰어 읽는다. 하지만 아이도 바보가 아니다. 한 두 번은 통하는데, 뭔가 내용이 달라졌다 싶으면 곧 바로 알아챈다. 몰래 두 페이지를 넘겨서 읽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읽으라며 책장을 앞으로 넘기더라. 식겁했다. 아예 1, 2권의 책을 베게 밑에 숨겨봤다. 한 두 번은 통한다. 하지만 걸린다. 걸리기만 하면 다행이지, 엉엉 울기도 한다. 조심하자. “여보, 우리 아이는 책과 친해지게 하자, 책을 많이 보게 하자”고 다짐했던 내가 아니던가?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이게 다 악마 때문이다.
#사례5
어차피 집에는 가야 한다. 워라밸 때문에 회식은 1차만 하고 끝난 다는 걸 와이프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 어차피 육아 전장으로 투입될 운명이라면. 최후의 만찬이라도 즐기자. A씨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긴다. 당을 충전하기 위해 달콤한 음료를 시킨다.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본다. 나만의 달콤한 휴식. 한 시간이 흘렀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지 않았던가? 동네라도 한 바퀴 돌다 가는 아빠. 지하철을 타도되는 걸 버스로 돌아 돌아오는 아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야구 잠시 보고 들어가는 아빠. OLLEH! 꼼수가 아니다. 육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취재원(물론 나도 포함)들로부터 고해성사를 들었다.
“회식자리에서 2차 정말 가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
“솔직히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있지. 하느님도 애 낳으면 집에 늦게 갈려고 할 때 있을 껄?”
“주말이나 연휴에 근무할 사람 손들라고 할 때, 자진해서 손들까 고민 했다.”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음)
“사탕 초콜릿 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애들 달래려 사탕 초콜릿 자주 찔러 줬다. 그것도 엄마 몰래.”
“애들이 외출해서 떼쓰고 울고불고 할 때, 진정시키려고 유튜브 틀어준다. 영상 너무 보면 안 좋은데 싶지만. 어쩌겠어. 직빵인데.”
등등. 하지만. 다시. 한번. 계속. 거듭. 말하지만. 아빠들은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비즈N 탑기사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60368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