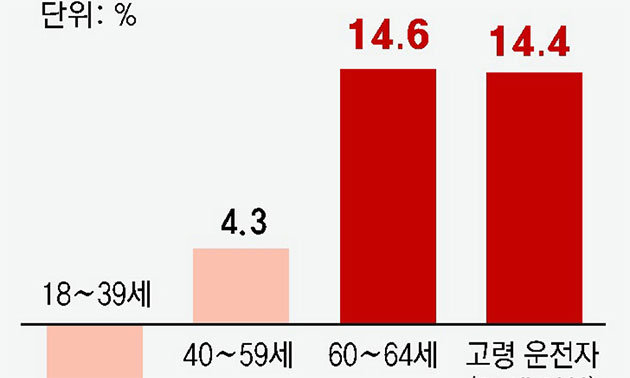[사설]방만경영 여전한데 공공기관 지정을 또 피해가려는 금감원
동아일보
입력 2019-01-25 00:00 수정 2019-01-25 00:00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에도 채용비리, 방만경영, 부실공시 등이 문제가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가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그 대신에 경영공시 강화, 비효율적 조직구조 개편, 채용비리 개선 등의 조건을 붙였다.
반민반관(半民半官)의 금감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면서, 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의 일반적 지도·감독 외에는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른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부터 인사, 기관장 해임권이 포함된 경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포괄적 감시·통제를 받는 것과 딴판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과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장 인선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이를 피해 갔다. 금융위도 금감원에 대한 독점적 지휘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인지 이런 논리를 거들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감원은 권한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나. 금감원 1980명 직원 중 3급 이상 간부급 비중은 43%, 평균 연봉은 1억375만 원이다. 감사원과 금융위가 ‘간부급 비율을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로 낮춰 방만 조직을 손보라’고 했지만 ‘향후 10년에 걸쳐 35%로 줄이겠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이러니 금융개혁에 앞장선다면서 스스로의 방만경영에는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사에 대한 갑질, 부당한 유착 관계, 부실감독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기관’이기보다 군림하려는 태도도 여전하다. 금감원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강제하는 게 맞다.
반민반관(半民半官)의 금감원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면서, 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의 일반적 지도·감독 외에는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다른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부터 인사, 기관장 해임권이 포함된 경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포괄적 감시·통제를 받는 것과 딴판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막강한 권한과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장 인선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이를 피해 갔다. 금융위도 금감원에 대한 독점적 지휘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인지 이런 논리를 거들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감원은 권한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나. 금감원 1980명 직원 중 3급 이상 간부급 비중은 43%, 평균 연봉은 1억375만 원이다. 감사원과 금융위가 ‘간부급 비율을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로 낮춰 방만 조직을 손보라’고 했지만 ‘향후 10년에 걸쳐 35%로 줄이겠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이러니 금융개혁에 앞장선다면서 스스로의 방만경영에는 눈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사에 대한 갑질, 부당한 유착 관계, 부실감독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기관’이기보다 군림하려는 태도도 여전하다. 금감원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강제하는 게 맞다.
비즈N 탑기사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124603682.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