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수정]‘1984’의 텔레스크린과 2018년의 AI-스파이
신수정 산업2부 차장
입력 2018-04-18 03:00 수정 2018-04-18 03:00
 신수정 산업2부 차장
신수정 산업2부 차장조지 오웰이 1949년 출간한 ‘1984’의 한 구절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와 ‘빅 브러더’로 대표되는 감시사회를 비판했다. ‘1984’가 나온 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는 ‘텔레스크린’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무장한 각종 기계와 소프트웨어의 감시를 받고 있다.
최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커버스토리로 AI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AI-spy(인공지능 스파이)’를 다뤘다. AI 기술 발달로 이젠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스타트업 휴머나이즈(Humanyze)가 개발한 ‘스마트 ID 배지(ID Badge)’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체크한다. ‘슬랙(Slack)’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는 직원들이 과제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 시간을 측정한다. ‘베리아토(Veriato)’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두드리는 컴퓨터 자판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한다.
기업들은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직장 내 모든 활동을 지켜보는 ‘AI 스파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긴장도와 피로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AI 기술이 가져올 직장 내 변화의 바람은 조만간 한국에서도 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 내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AI 기술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최근 많은 한국 기업은 디지털 변혁이 가져올 미래 비즈니스와 관련해 사내 연구팀을 가동하고 외부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전략을 짜고 있다.
‘미래의 일터’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균형’과 ‘적응’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기업들은 ‘AI 스파이’를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간의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AI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토머스 대븐포트와 줄리아 커비는 ‘AI 시대 인간과 일’이라는 책에서 “AI를 우리의 일자리에 침입한 경쟁자나 감시자로 보기보다는 다음 시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곳이 칠레의 구리 채굴회사 ‘코델코’다. 이곳은 2010년 지하 700m 깊이의 갱도에 갇힌 광부 33명을 두 달에 걸쳐 한 명씩 구출해 세계의 이목을 끈 곳이다. 코델코는 사고가 난 그해 다양한 형태의 로봇과 자동채굴 기계를 도입하는 ‘코델코 디지털’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갱도로 내려가는 대신 로봇과 자율주행 트럭을 조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AI가 촉발한 기술 덕분이다. 인간을 향하는 기술을 앞세운 ‘미래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신수정 산업2부 차장 crystal@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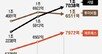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