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제2의 이석채’ 막으려면
전성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17-06-05 03:00 수정 2017-06-05 03:00
 전성철 사회부 차장
전성철 사회부 차장KT 수사 개시와 기소 결정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 대부분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미 검찰을 떠났다.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쪽은 6개월간 KT를 탈탈 털어가며 이 전 회장을 망신 주고도 무죄를 받은 검찰이다. 하지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 전 회장 몫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취임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부터, 지난달 물러난 김수남 전 총장까지 역대 검찰 총수들은 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 같은 수사를 강조했다. 수사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는 안 되며, 신사(紳士)다운 수사로 수사 결과에 승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처럼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외과 수술식 수사’라는 해답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외과 수술 비유는 검찰의 수술(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도려낼 환부(죄)가 있는 환자, 즉 죄인이라는 전제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 수사를 하며 불필요하게 원한 살 일은 하지 말라는 충고일 뿐, 수사가 꼭 필요한지 또는 기소를 안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정밀한 진찰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수술대에 오르는 일 자체가 환자에게는 위험이고 고통이다. 검찰 개혁은 환자만 보면 메스부터 들고 보는 식의 과도한 수사를 어떻게 막을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 단추는 검찰의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돼야 한다. 현 체제는 언제라도 ‘제2의 이석채’를 낳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별수사부가 4곳, 첨단범죄수사부가 2곳, 그리고 강력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라는 부서까지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처럼 규모가 큰 경제 사건을 다루는 조사부도 두 곳이 있다. 이 10개 부서가 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다. 거악(巨惡)으로 불리는 유력 정치인이나 대기업을 수사해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인지부서 수가 많다 보니 각 부서가 한 해에 처리하는 큰 사건은 많아야 1, 2건이다. 통상 임기가 1년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인지부서 부장검사의 인사 주기를 최소 3, 4년으로 늘리면 큰 사건도 소신 있게 불기소 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중요 사건에서 철저한 수사를 한다며 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는 최근 관행도 문제다.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의 수사가 올바른지 감독하는 게 임무다.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검찰 내부에서 잘못을 걸러낼 기회는 사라진다. 또 정권 임기 내에 본인 경력의 성패가 정해지지 않는 젊은 검사가 수사 책임자여야 정치로부터의 독립성도 커진다. 인사로 수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에 맞춰지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그릇된 수사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일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
전성철 사회부 차장 dawn@donga.com
비즈N 탑기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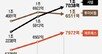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