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칭기스칸 시대 꿈꾼다면 유라시아 철도 지배력 확보해야
하임숙기자
입력 2015-07-19 16:04 수정 2015-07-19 16:39
작은 유목민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은 아홉 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후 부족민들 사이에 버려진 그는 어머니 둘과 여섯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이 됐다. 거친 초원에서 가족까지 건사해야했던 소년이 겪었을 고초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성장해 자신의 부족을 되찾았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의 나라인 적이 없던 대초원의 부족들을 통합해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는 이후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이 됐다. 소년은 ‘초원의 푸른 늑대’ 칭기스칸, 그가 만든 대제국은 몽골제국이다.
몽골제국의 영토는 3320만 ㎢로 남한 면적의 330배가 넘었다.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시절 대영제국(3670만 ㎢)을 제외하고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나라였다. 하지만 단지 넓은 땅을 다스렸다는 이유로 칭기스칸이 지난 1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1995년 12월 미 워싱턴포스트지)로 꼽히진 않았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은 유라시아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기원전부터 꿈틀댔던 실크로드 무역을 꽃피웠다. 이 과정에서 동서양의 문명을 연결함으로써 ‘잠자던 유럽’을 깨워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다. 지배계급인 기사들이 각자의 장원을 나눠 갖고 자급자족하던 가난한 대륙 유럽은 이 때를 계기로 동양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제지술, 인쇄술 덕에 기록문화도 꽃 피기 시작했다. 화약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꿨고, 중세시대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침반을 기반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몽골제국이 없었더라면 대영제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달 14일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가 발대식을 갖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었던 칭키스칸을 다시 떠올렸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독일 베를린까지 총 1만4400km를 19박20일 일정으로 달리는 행사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외교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련한 행사로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249명이 탑승했다.
“유라시아 철도가 뭐기에 이렇게 요란한 행사를 벌이고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나온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세계가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마당에…,”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일견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육로로 연결하는 건 칭기스칸 시대만큼이나 지금도 중요하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에서 철도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교통수단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향후 유라시아 대륙 경제발전의 열쇠를 쥘 가능성이 높다.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에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해 개발 잠재력이 높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개발계획) 정책 중 하나인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적지 않다.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배로 물품을 운송하려면 2개월가량 걸리지만 철도로는 20일이면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이미 현대상선 등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현지법인을 설치해 자동차부품 등을 유럽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당장의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다. 2013년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54km)가 개통되면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길이 열렸다. 통일이 되면, 아니 그 전에라도 남북합의만 이뤄지면 부산에서 강원 고성군의 동해선철도를 통해 유럽대륙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분단 이후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됐던 한반도가 대륙 경제권에 묶이게 된다.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국가와 41개 철도회사가 참여하는 이 기구는 유라시아대륙의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정하고 선로 배분권, 수익배분 구조 등을 결정한다.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할 때, 각종 기반시설을 깔 때 자칫 우리 땅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동아일보가 올해 4월 말 ‘2015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국제 콘퍼런스’를 연데 이어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울란바토르 등을 취재해 ‘기회의 땅 유리시아 대륙을 가다’ 시리즈 기사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다.
13세기의 몽골제국 때문에 ‘팍스 몽골리카(몽골의 평화·몽골의 지배아래 유라시아 일대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라는 말이 나왔다. 작은 부족 출신의 칭기스칸이 꿨던 꿈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꾸지 말란 법도 없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몽골제국의 영토는 3320만 ㎢로 남한 면적의 330배가 넘었다.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시절 대영제국(3670만 ㎢)을 제외하고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나라였다. 하지만 단지 넓은 땅을 다스렸다는 이유로 칭기스칸이 지난 1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1995년 12월 미 워싱턴포스트지)로 꼽히진 않았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은 유라시아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기원전부터 꿈틀댔던 실크로드 무역을 꽃피웠다. 이 과정에서 동서양의 문명을 연결함으로써 ‘잠자던 유럽’을 깨워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다. 지배계급인 기사들이 각자의 장원을 나눠 갖고 자급자족하던 가난한 대륙 유럽은 이 때를 계기로 동양의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였다. 제지술, 인쇄술 덕에 기록문화도 꽃 피기 시작했다. 화약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꿨고, 중세시대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침반을 기반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몽골제국이 없었더라면 대영제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달 14일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가 발대식을 갖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었던 칭키스칸을 다시 떠올렸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독일 베를린까지 총 1만4400km를 19박20일 일정으로 달리는 행사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외교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련한 행사로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249명이 탑승했다.
“유라시아 철도가 뭐기에 이렇게 요란한 행사를 벌이고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나온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세계가 이미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마당에…,”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일견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육로로 연결하는 건 칭기스칸 시대만큼이나 지금도 중요하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에서 철도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교통수단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향후 유라시아 대륙 경제발전의 열쇠를 쥘 가능성이 높다.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에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해 개발 잠재력이 높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개발계획) 정책 중 하나인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적지 않다.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배로 물품을 운송하려면 2개월가량 걸리지만 철도로는 20일이면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이미 현대상선 등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현지법인을 설치해 자동차부품 등을 유럽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당장의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다. 2013년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나진~하산 철도(54km)가 개통되면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길이 열렸다. 통일이 되면, 아니 그 전에라도 남북합의만 이뤄지면 부산에서 강원 고성군의 동해선철도를 통해 유럽대륙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분단 이후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됐던 한반도가 대륙 경제권에 묶이게 된다.
우리나라가 기를 쓰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국가와 41개 철도회사가 참여하는 이 기구는 유라시아대륙의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정하고 선로 배분권, 수익배분 구조 등을 결정한다.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할 때, 각종 기반시설을 깔 때 자칫 우리 땅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동아일보가 올해 4월 말 ‘2015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국제 콘퍼런스’를 연데 이어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울란바토르 등을 취재해 ‘기회의 땅 유리시아 대륙을 가다’ 시리즈 기사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다.
13세기의 몽골제국 때문에 ‘팍스 몽골리카(몽골의 평화·몽골의 지배아래 유라시아 일대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라는 말이 나왔다. 작은 부족 출신의 칭기스칸이 꿨던 꿈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꾸지 말란 법도 없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비즈N 탑기사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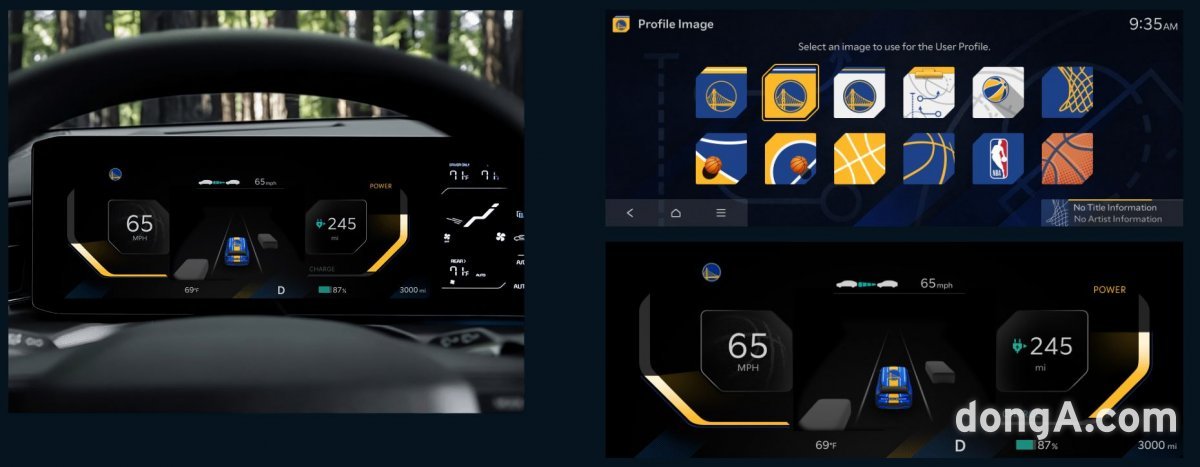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102/54/90/1/wps/ECONOMY/FEED/BIZN_REALESTATE/124551365.2.thumb.jpg)



